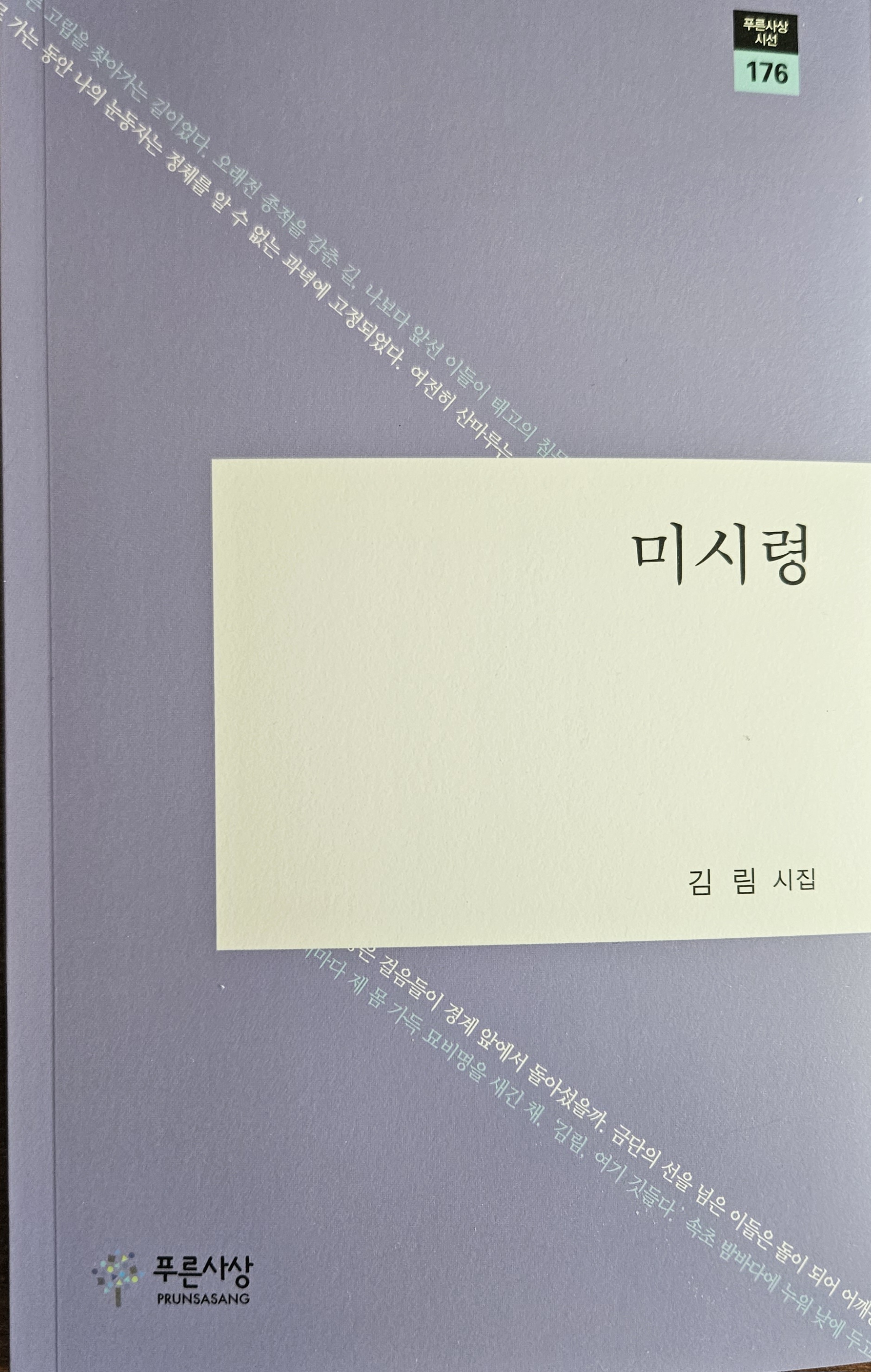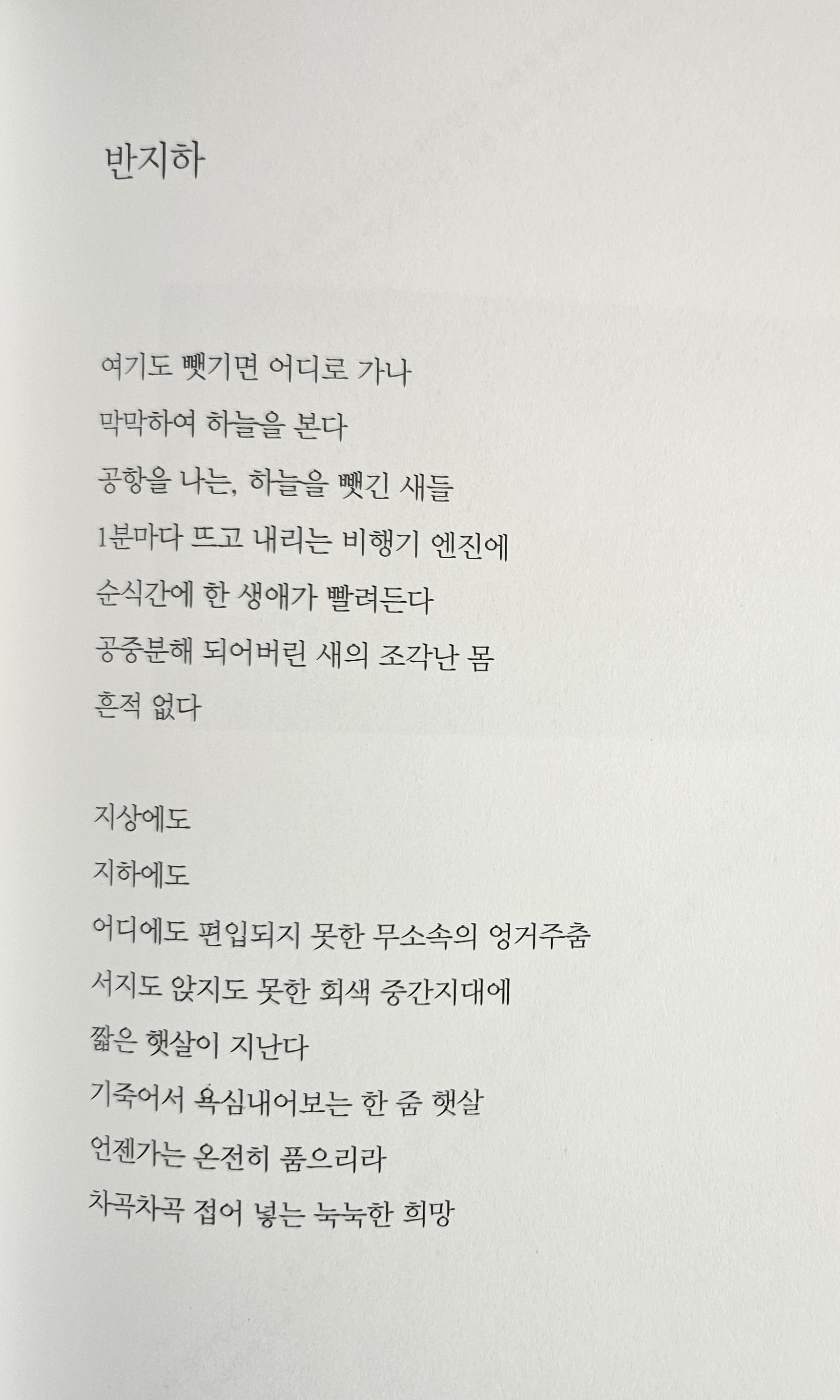콩밭 너머
김 림
콩밭 매러 간 서방님
오십 년째
그 세월 끌어안은
새댁머리엔
어느새
무성한 거리
콩밭엔 그저
눈길만 보낼 일이지
그도 아니면 마음만
아예
신 벗고 콩밭 매러 가신 날
오십 년째
울타리 너머
잡초밭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쟁놀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햇볕 아래
빛나는 사금파리 무기로
전쟁놀이가 한창이다
금단의 선을 범하면
명쾌하게 내려지는 사망선고
"야, 너 죽었어."
죽었다는 말이 이리도 명랑한 말이었나
머리를 긁적이며 죽은 아이가 웃는다
지나간 것들은 동글동글
모서리가 닳아져 있게 마련
조막만 한 손바닥이 지구를 훑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홍어무침
열여섯 살 겨울 성탄절 전야
주소도 없이
한두 번 엄마 손에 이끌려 갔던 외삼촌 집에
엄마의 부음을 전하러 간다
구로동 소방서 어디께쯤
야속한 기억은 비슷한 골목길을 펼쳐놓았다
미로 같은 골목에서 찾아낸 초록 대문 뒤
숨은 그림처럼 굳었던 외삼촌
열여섯 조카가 전하는 부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흔넷 누이의 죽음 앞에
슬픔으로 밥상이 차려졌다
그래도
산 자는 밥을 먹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버지의 등
딱 한 번 업혔던
아버지의 등을 기억한다
언젠가 삼일빌딩 꼭대기층에서 보았던 그 높이
열 살배기 눈높이엔 너무 아득하여 울었다
장난스레 흔들리던 등
떨어지지 않으려 잔뜩 그러쥔 손바닥엔
진땀 같은 눈물이 배었다
견고하게 직조된 무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밧줄이었다
툭.
밧줄이 끊어진 날
예고도 없이 끊겨버린 필름 속에서
어둠과 침묵이 교차 상영되었다
쿵!
떨어지는 자막들
읽혀지지 않는 비가 내렸다
지지직 잡음이 타들어가는
오래된 흑백영화 속에서 타고 내려간
시큼한 땀냄새 셔츠가 미끄러웠다
손을 놓치며 그때 보았다
까마득히 높아져버린
다시는
오를 수 없이
자꾸 자꾸 멀어지던 아버지의 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시령
가파른 고립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오래전 종적을 감춘 길, 나보다 앞선 이들이 태고의 침묵 속으로 가는 동안 나의 눈동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과녘에 고정되었다 여전히 산마루는 완강히 금을 그은 채 다가오지 말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걸음들이 경계 앞에서 돌아섰을까 금단의 선을 넘은 이들은 돌이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저마다 제 몸 가득 묘비명을 새긴 채,
'김림, 여기 깃들다'
속초 밤바다에 누워 낮에 두고 온 미시령을 꺼내본다 한 치의 접근도 허락지 않던 도도한 자태, 연신 차 앞 유리를 훔쳤다 밀어낼수록 더욱 두꺼워지던 안개, 멀미가 일었다 바다를 배회하다 극한에서 일어서는 유빙, 미시령은 혹독한 추위 앞에서야 제 높이를 회복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랜 인연 덕에 시인의 시를 간간이 접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발표한 시들을 떠올리며 시인과 어울릴 문장들을 생각했다. 여러 시를 한꺼번에 만난 이번 시집을 읽으며 비로소 또렷해졌다. 김림은 시적 대상에 대한 시선이 온화한 시인이다. 고통 받는 이를 어루만져주는 시인이다.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시인이다 교묘히 진화하는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인이다. 평소 차분한 성향 탓일까? 세상의 통증을 끌어안고 조용히 아파하는 시인이다. 사랑의 본질을 일깨운 첫 시집 '꽃은 말고 뿌리를 다오'이 그러했고 두 번째 시집 미시령도 그러하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 몸 어느 한 곳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온통 신경이 모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사회 곳곳에 생긴 상처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 김림은 우리에게 묻는다. 통증을 함께 치유할 생각이 없는가? 김림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는다. 어서 대답하라는 듯 집요하게 묻는다.
-손병걸 시인 한국작가회의 인천지회장
김림 시인의 시세계는 나무의 존재학 혹은 나무의 사회학이다. 시인은 바다의 길 끝에 선 어머니의 수렁에서 풀려난 아버지의 생애를 몸을 비운 나무 같다고 여긴다. 목백일홍을 꺼지지 않은 불꽃을 지닌 존재로, 은행나무를 풍성한 수다를 떠는 존재로 바라본다. 헐벗은 채 홀로 선 나무로부터 가난 증명서를 떼기도 한다. 어른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아픈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가로수에게 고개 숙인다. 나무가 지나온 길을 따라 역사를 품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다. '생전에 빚진 이라면/오직 나무 한 그루'라는 마음으로 미시령에 오르자 거친 혈맥을 내보이며 환영하는 나무들, 시인은 그 앞에서 어깨의 높이를 회복한다.
-맹문재 문학평론가 안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