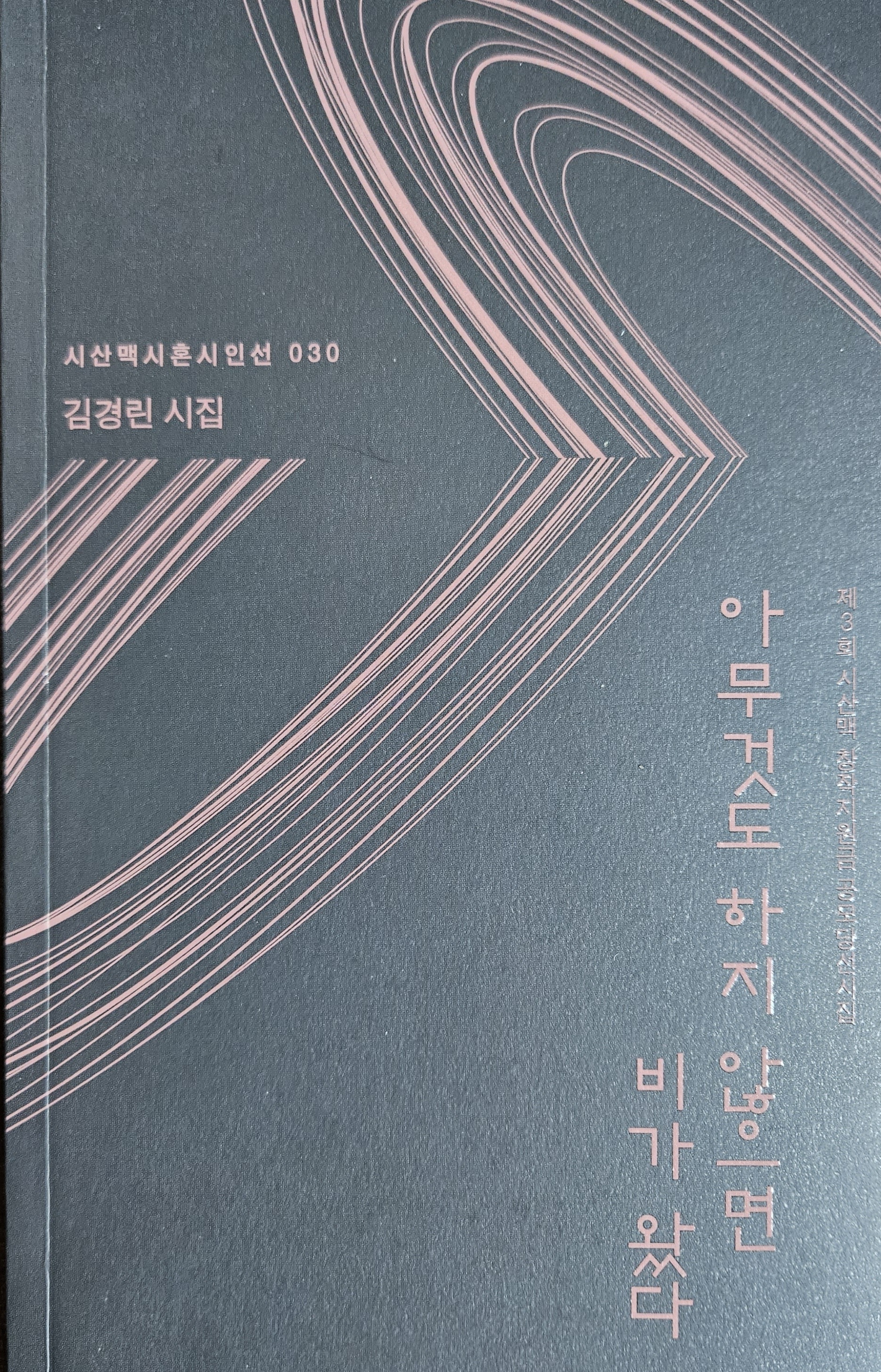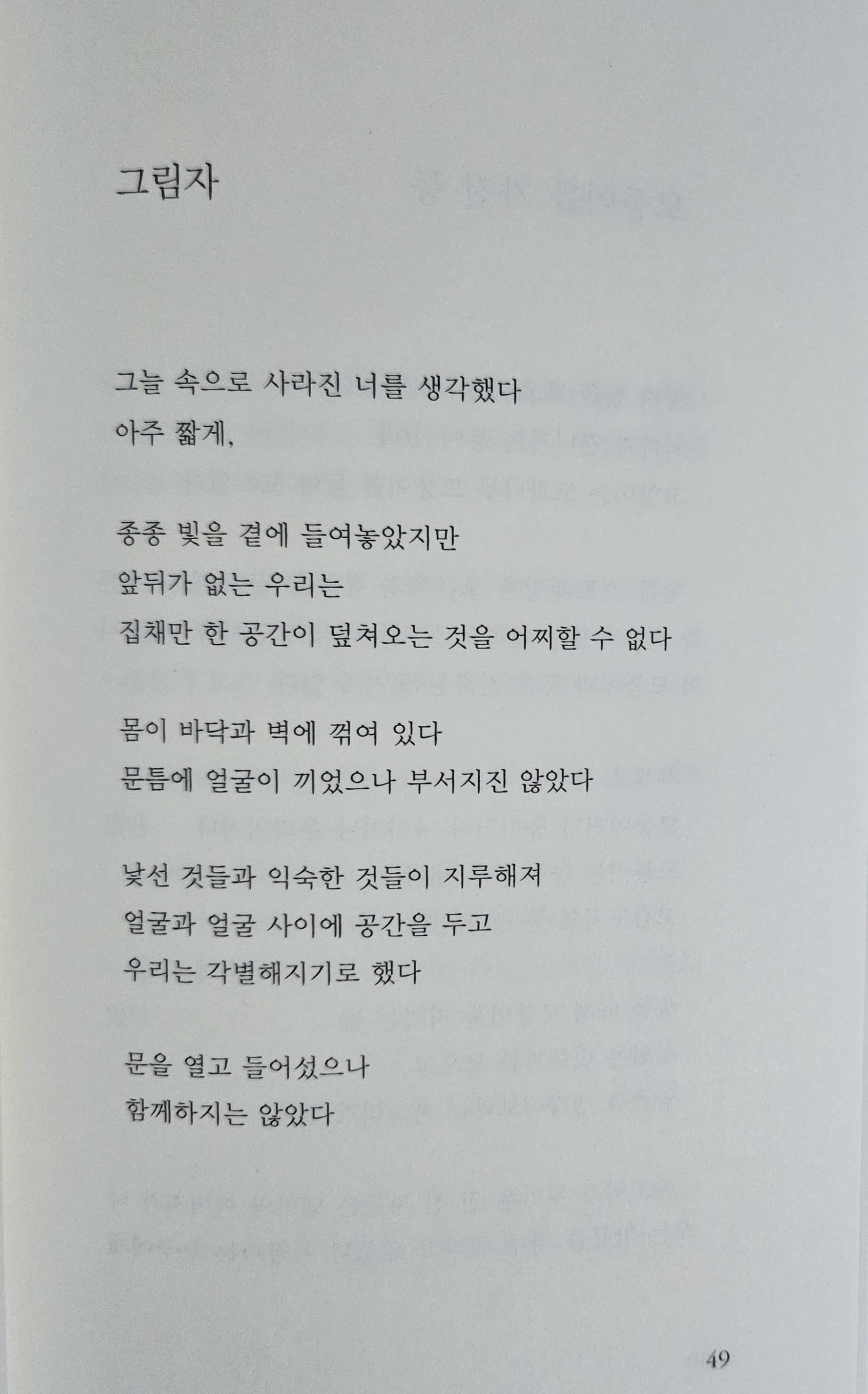풍경의 탄생
김경린
바다를 옮기는 손이 너무 크다
맥주캔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흐르는 동작을 기억하는 손
고양이 한 마리가 세워놓은 절벽 쪽으로 사라진다
파도는 아직 도착 전이고
등대를 활짝 열어 젖힌 저녁
다리 없는 의자는 계단이 된다
절벽 위에 선 관찰자의 입장으로
숲이 된 바다는 나무를 수장시키고
물감이 흩어놓은 억새는 불빛을 키운다
점, 점, 점, 섬이 되는 섬
하늘 없는 구름처럼
손을 펼치면 질서없이 놓여 있는 파도가
뜯긴 봉지 속 그래커의 모습으로
부서진다 바다가
손안 가득 푸른 물감으로 쏟아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거룩한 혀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이가 빠진 자리에 나무를 심은 아이는
잠든 이빠리를 깨우고
주인 없는 무덤을 굴리며 간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빨리 지퍼를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안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가족과 집과 마을은 오래된 빵 같았다
내가 모르는 단 하나의 계절은 반복해서 흘러갔고
발랄과 명랑만이 쑥쑥 자라났다
열한 번째 지퍼가 열렸다
숨소리도 그림자도 없는데 이곳은 축축하다
두 손을 합장한 혀가 있다
완성되지 않은 가족과 집이 한 덩어리가 되어 굴러 떨어졌다
새 떼가 숲에서 숲으로 날아간다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서로의 입을 단속하는 남자와 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들은 계속되었다
남자가 고래고래 질러대는 소리만 투명하게 들려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켜지지 않는 알약
삼킨 감기약 한 알이 입안에 남아 있다
별것도 아닌 것들로 텔리비전은 시끄럽다
알약을 삼키는 동안
식구들은 종류가 다른 알약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세탁기는 덜컹거리며 돌아간다
애써 삼킨 약처럼 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낙엽
적도가 나를 안은 걸까
내가 적도를 끌어안은 걸까 아프다는 것은
어느 극점이 내 속으로 밀려오는 것
폐품공장 안으로 저녁을 불러들이는 시간
책상 위에서 없어진 물건을 내 머릿속에서 찾는 딸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다니던 아이는
우두커니 텔리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입안이 쓰다
갑자기 집 안이 들판처럼 까마득해진다 깜빡이며 희미해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 쓴 알약을 삼킨 것처럼
나는 자꾸 달달한 머쉬멜로우가 먹고 싶어진다
세탁기는 끊임없이 덜컹거리고
빗물은 여전히
집 안의 구멍을 향하여 흘러내린다
목구멍에는 삼켜진 알약이 걸려 있는 듯 자꾸 마른 침만 삼켜진다
빨래가 다 돌았다 세타기를 열고 한 덩어리의 가족을 끌어 올린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엉켜 있다 팔이 엉키고 가슴이 엉키고 갈비뼈까지 엉켜 있다 엉켜 있는 줄도 모르고
엉켜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횡단보도
늘 박하향이 났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박하 잎을 물고 누워 있는
박하 냄새가 코끝에서 진동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손을 흔들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맹세하듯이 지나갔다
모두는 얼굴이 없었고 그런 그들이 좋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가 악을 쓰고 울었다
손을 뻗어 잡아주었다
얼떨결에 뻗어나간 손
우리는 얼굴이 없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엄마! 라고 부르면 벌떡 일어날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었다
입이 없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에도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문득,
여기가 어딜까 궁금해졌다
벗어나려 해도 늘 같은 자리인 이곳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파
라일락 나무 밑에서 낡은 소파가 쉬고 있다
내장이 보일 때까지 활짝 웃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도 품고 싶은 시간
라일락 나무는 구름을 베어내고
꽃잎인 듯 떨어져 내리는 검푸른 저녁을 기른다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소파
길목마다 라일락 잎 떨어진다
이 모든 것이 한낮의 일상이라며 푸드덕 새들을 날려 보낸다
바람이 떠나자 파르르 떨며 고양이 울음을 흉내 낸다
어둠의 연못 속으로 던져지는 그림자들
우체부의 행적이 우체통 입에 반쯤 걸려 있다
그의 행적을 토해내는 중인지 삼키는 중인지
궁금해지는 밤이다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자아가 어떻게 자기 세계를 이루어가는지 함께 천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시작을 가능하게 한 인과이자 동기로서 근원성에 대한 탐구, 시적 자아가 타자와 자신의 변별자질이 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생성해가는 고유성에 대한 추구, 시의 면모 양상과 지향을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미래성에 대한 전망이 시집의 의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김경란의 시는 자기 세계의 축조를 위해 온몸으로 통과의례에 육박해 왔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자장가를 대신하는 빗소리에 의지해 거꾸로 흐르는 시간과 깨어진 거울의 방을 걵너온 어린 나무 도형은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연둣빛 언덕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전개도를 조형하며 그렇게 다음 장으로 향해 갈 것이다.
-신수진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