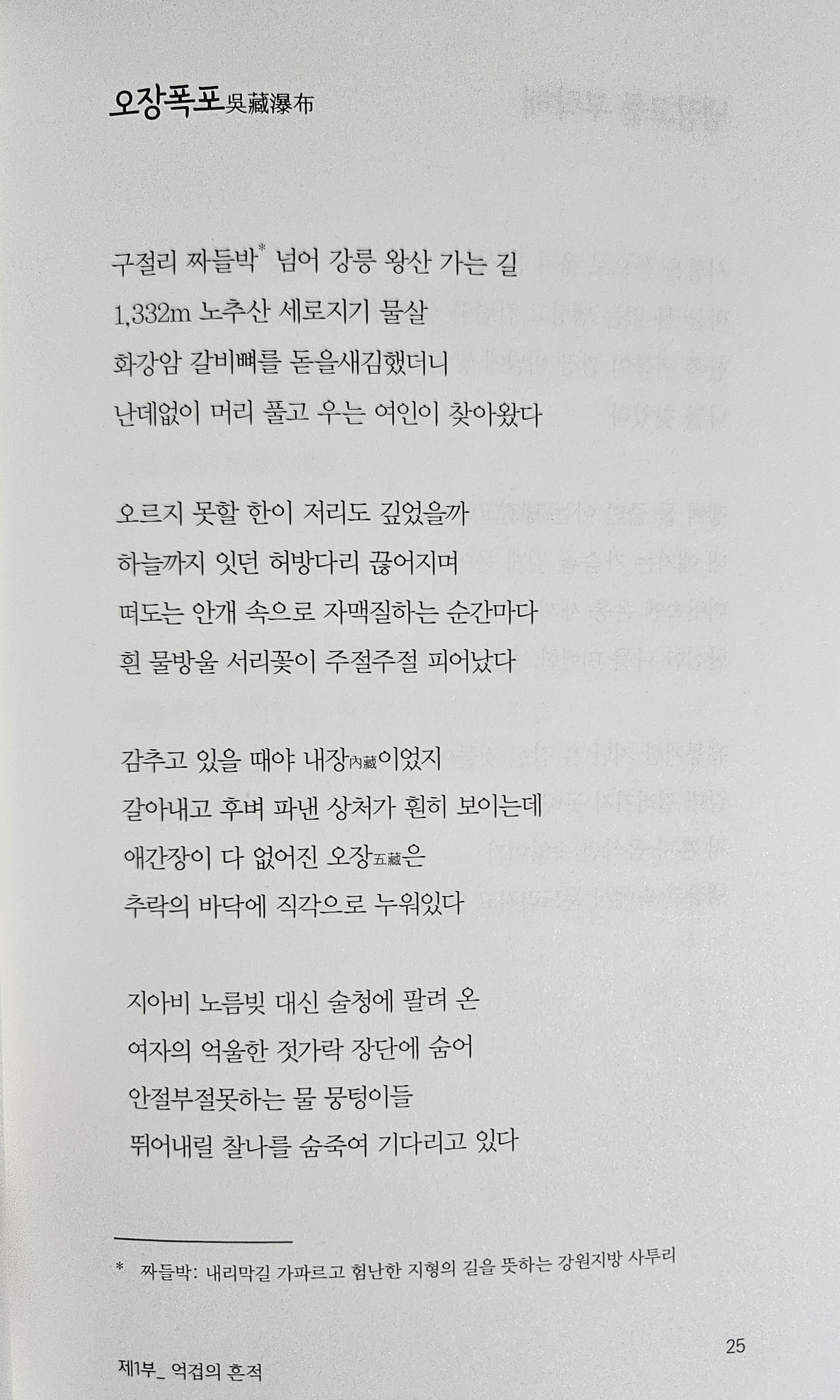게거품
이정표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산더미 게들을
치마폭에 쓸어 담는 꿈을 꾸셨다고 했다
생의 난간에서 헛발을 디뎠을 때
거품 물고 눈 뒤집는 건
게 꿈꾸고 태어난 계집의 항변
족보엔 없어도 유래는 분명하다
휘젓고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한움큼씩 잡히는 모래알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란 건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선몽으로 알려 주었다
산다는 건 구멍 난 배 위에 홀로 남아
차오르는 불안을 쉼 없이 퍼내는 극한 작업
튀어나온 눈으로는 앞을 보고 있지만
뒤틀린 걸음은 자꾸 옆을 향해 나아가고
집게발로도 잘라내지 못한 삶의 역풍逆風은
몸 뒤집고 버둥거리다 허연 거품만 쏟아낸다
나는 도망간 희망을 쫒는 한 마리 암게
앙다문 입술에 거품 머금고
사막이 된 시간을 엉금엉금 찾아 나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된장
항아리 속 장의 부재는
다시 메주를 쑤지 못하는 어머니보다
더욱 큰 소멸의 천재지변으로 돌아왔다
콩 심기를 포기했던 어느 해부터
친정집 장광에는 퀴퀴한 정적이 모여들었고
더는, 파낼 게 없는 묵은장들은 씨까지 말라버렸다
가져올 정이 더 이상 없는 어머니의 집에서는
아픈 허리와 아픈 다리의 주인이 된 안부가
생존 기척을 대신해 근근이 신음만 전해올 뿐
장으로 통했던 모든 길이 봉쇄되고
그 많은, 장독들은 제 빛을 찾지 못해
죽음보다 깊은 혼돈에 갇혀 버렸다
장 담그던 바지런한 지문은
시간이 문지른 사포질에
닳아 없어져 버렸고
그 맛을 지키던 미련한 여자는
골병이 누운 안방에서 혼자 시들고 있다
자궁 없이 포태抱胎를 꿈꾼
나는 빈궁마마
혀끝의 간사함만 쫓아다닌
원조 된장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된장찌개
한반도의 역사가 상 위에 올랐다
콩 포기 심을 때 시작된 고조선이
찌개가 된 지금까지
무서리 피하고 도리깨로 얻어맞으며
메주가 되었듯
지나간 시간 눈물 없이는 말하지 못하겠다
발효와 숙성을 거친 장구한 이야기가
뚝배기에 들어가 받침대에 누웠다
감자 호박 풋고추들이 장 속에 들어가야
맛을 내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름만 따로 불러내어
된장찌개라 부르지 않는다
펄펄 끓어오른 국물 속으로 숟가락을 디밀어 보면
아련히 떠오르는 건더기들의 슬픔
뜨겁게 속을 지져대는 장맛을 보려
봄부터 겨울 단지 안에서 오천 년을 묵게 두었다
우리는 이 땅에 된장으로 태어난 이상
민족중흥의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손님이 오셨다
오고 가며 슬그머니 알아 둔
우리 동네 칼국숫집
먼저 나온 겉절이를 집적대는 사이
칼국수 두 그릇이 나왔다
물오른 처녀처럼 뽀얗고 통통한 면발 위에
애호박과 김 가루가 누워있었고
걸쭉한 육수 속 입 벌린 바지락은
한참을 건져 먹어야 할 푸짐한 양이다
먼젓번 왔을 때보다 오백 원이 비쌌다
바지락값이 오른 게지
'아, 아니요, 밀가루, 값이, 감당이, 안 돼서요'
칼국수 집 주인에게 붙들려 전쟁과 곡물에 관한
시장 경제 인플레이션 강의를 들었다
만성 무릎관절 환자들이 널배 타고
뻘밭을 헤맨 값은 오백 원 축에도 들지 못했구나
‘에라이 이런 노무 시상’
몸이 재산인 사람들의 세상은
늘 ‘에라이이런노무시상’ 이다
밀가루보다 싼 바지락의 탄식이 들리지 않아
칼국숫집 솥 가마 육수 속에서
온몸을 재껴가며 울었을
갯조개는 생각지도 않았다
청춘을 무릎과 바꾼 여인들의 갯벌에는
언제쯤 바지락 없이도 잘 편안한 세상이 올까
오백 원보다는 더 비싼 인정이 도래하길 바라지만
골목길이 이리도 섬칫하다면
그런 날은 아직 한 참 더 기다려야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집의 초입을 장식하는 첫 번째 수록 작품은 대개 해당 시집의 안내자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시인이 해당 시집에서 밀어붙이는 핵심 상징이나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와는 전혀 다르게 담담하고, 무심한 듯한 작품을 서두에 실어 힘을 뺀 채 시집 안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집에 실리는 첫 번째 시는 시인의 기질이나 스타일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이정표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정선역 가는 길'은 첫 번째 시로 '게거품'을 내세우면서 이번 시집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선보이는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기질이나 스타일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홍섭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