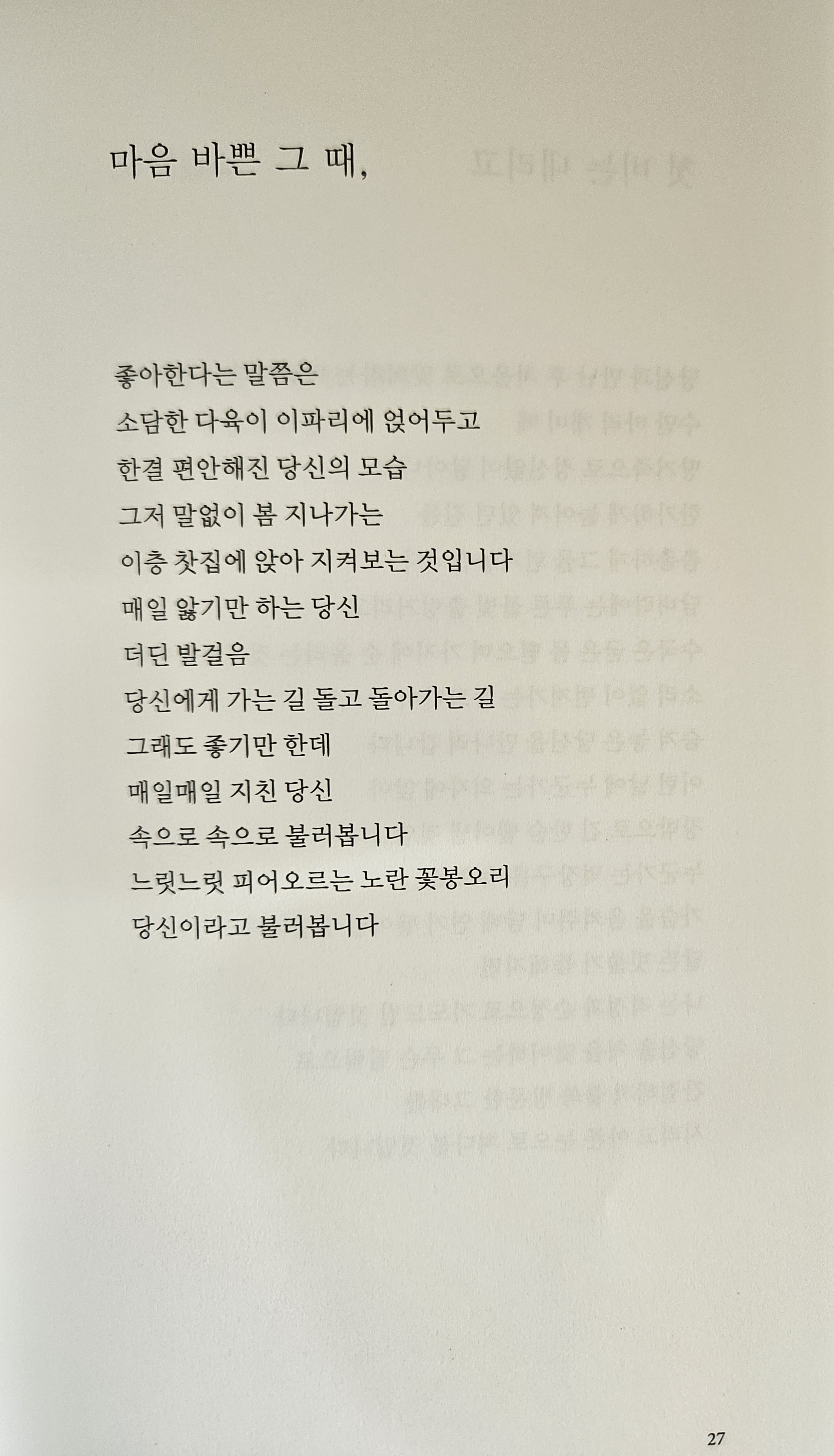올무
김영석
산은
훤히 자작나무 아랫도리 드러내놓았다
숲은 빛을 가리지 않는다
어둠 속에 숨어서 사냥감을 찾아내는
비린내 나는 포식자의 노란 눈빛
어느 순간부터 노려보고 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쫑긋거리는 떡갈나무
위장진흙 잔뜩 바르고 엄폐하고 있다
서슴없이 빛 먹어 치우고 도토리 퍼트리고 있다
겹겹이 축축한 촉수를 거미줄처럼 늘어뜨린 채
한 놈 걸리면 꽁꽁 묶어
여울에다 가둬 놓고 체액 빨아먹는
시냇물 낙엽 더미에 숨겨 놓은 소리
음흉한 바위 소리죽여 울고
음습한 동굴 속에서
아홉 바퀴 뒷너미하는 흰여우 꼬리
아무리 잘났다해도 너는
맛있는 사냥감에 지나지 않아
조심해
먹잇감 되기 싫으면
숲으로 난 이 길로 들어오지 말아
은사시나무 화살 날릴지 몰라
이제 산은 빛 가려 받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복어꽃
아야진항 비린내 나는 횟집이 좋다
복어꽃 먹기에는
소주가 좋지
아니 맑은 청주가 좋지
복사꽃 꽃잎 같은 복어꽃
하늘하늘하여 손대기 싫지만
꽃잎 하나 입에 넣으면
향기가 칼날이 되어
조각조각 혀를 자른다
아름다운 꽃에는 칼날이 있다는데
복어꽃에는 독이 있단다
혀도 마비시키고 뇌도 마비시키는
복어꽃이란다
향기도 독이 되는
복어꽃잎 한 마리
독에 취하는지 술에 취하는지
온 가슴 속에서 헤엄친다
바다 내음 가득도 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견고한 저녁
업무용 트럭에서 내려 사무실 계단에 걸터앉는다
전차선을 반으로 갈라놓은 낡은 햇살
지친 무릎 고갱이 토닥이는 아주 늦은 오후가
붉은 포도주 슬쩍 건넨다
바람이 잔뜩 파도 물고 와 작업화
진흙을 털어낸다
시계는 디지털로 미적분을 풀고 이쯤이면
피곤이 견갑골 인대를 하나씩 문지른다
등허리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이제 한결 가벼워져 한 손에 든 참외 봉지 같은데
어설픈 웃음 쓸데없이 떠올린다
투망 던져진 하늘은 길게 낮게 산으로 쏟아지고
정리해야 할 잔무는 스렁스렁 자판 틈으로 스며들고
퇴근 직전, 일상의 시간을 내려놓으면
견고한 저녁이 허기진 빗속으로 스며들어
차분하게 밤을 밀고 들어온다
넋놓고 있어도 힘겨웠던 하루
샤워실 흐리멍덩한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슥 손으로 문지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음촌 판각 8년차'에 나오는 불경 구절을 판각하는 사람처럼 시인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한다. 지독한 욕망은 지독한 욕망을 낳을 뿐이다. 이 욕망을 품은 채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옥타비오 파스는 절벽에서 치명적 도약을 하는 하는 존재를 시인의 운명과 연결했다.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자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눈을 얻을 수 있다. 김영석 시를 따르자면 누군가는 산사에서 대장경 팔만 자를 판각하며 시인의 길을 걷고, 또 누군가는 지독한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시인의 길에 이르려고 한다.
김영석은 지금 시인으로서 그 길을 걷고 있다.
-오홍진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