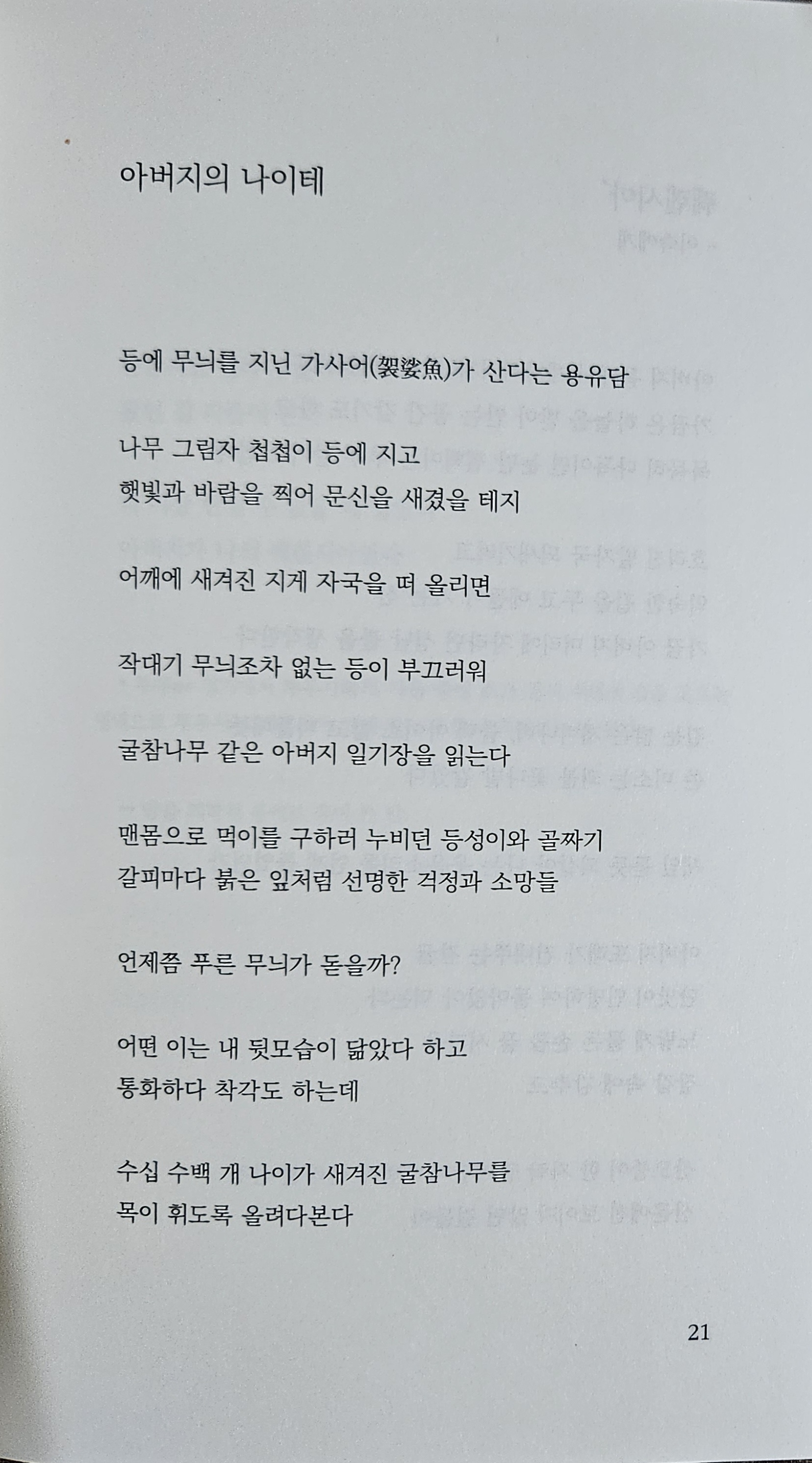연날리기
김효운
온몸이 날개인 것들이 있다
가는 뼈대를 세워주고
골다공증 예비하듯 밥을 먹인다
먹인 밥 또 먹인다
바람을 타기엔 질긴 것이 좋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씌우는 소망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처럼 짧게,
숨통 틔우듯 가슴 복판을 뻥, 틔우고
아끼는 것일수록 목줄을 매야 한다니
무명실을 얼레에 감고
바람 부는 벌판으로 나간다
내게서 태어난 솔개 한 마리
먼 하늘로 향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울음터
울고 싶은 날이 늘어날수록 숨어들기도 잦아져
문고리 잠그는 방법이 익숙해졌다
혼자인 것들이 선호하는 후미진 축대 밑이거나
강아지 발자국이 굴러다니는 골목길
뒷목 서늘한 언니를 닮은 냉이꽃 한숨처럼 피어
아버지 떠난 앙상한 집을 고이던 계단 위로
몸을 던지는 보랏빛 라일락, 안부를 묻고 돌아서서
흐려진 안경을 닦고
먼 골목 입구 내다보는 가로등
모퉁이 돌아 들어오며 흔드는 반가운 손
오월 후박나무 이파리, 저 혼자 돋아 넓어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격자 문살에 햇살을 걸다
풀 먹은 창호지에서 가야금 소리가 난다
씨줄 날줄의 격자 사이 햇살과 그늘이 나누어 쌓은
시간의 더께 모두 벗겨 내고 울음을 말리는 날
지나는 바람에 펄펼 끓던 여름도 팽팽해진다
문고리 언저리에 코스모스 꽃잎 덧대
미리 깁는 당신
꽃 대신 먹물 머금은 손바닥 도장이 들어앉는
손가락 사이에 초승달을 걸고 당신은 격자 문살
긴긴 리듬을 뜨겁게 타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소대나무*처럼
아픈 아이를 키우는 동안
돌을 지고 강을 건너는 일이라는데
걸음마를 배우다 웅덩이에 빠진 아이
내민 손도 뿌리치고 더 깊이 가라앉는다
자폐증이라고 기록하는 손을 허공인 듯 바라본다
물 건너는 개처럼 허우적대는 날들과
땡볕에 아스팔트를 건너는 지렁이처럼 오갈 든 날이 번갈아 이어졌다
업힌 돌은 강물보다 크게 울고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어머니 헤아리며
지금 뿌리 뻗는 중이라고
싹이 나고, 잎이 돋아 우거질 것이라고
언젠가 울창한 숲속에 한 그루 나무로 설 것이란 믿음
대나무보다 꼿꼿하다, 저 어미!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4년 동안 3센치밖에 자라지 않고 뿌리만 뻗다가 5년 째부터 6주만에 15미터 이상 자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붉은 밤
그녀의 얼굴이 어지러이 떠오른다
그녀의 불운이 옮지 못하도록
나는 줄곧 외면해 왔으나 동지冬至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길고 긴 밤에
그녀 얼굴 위에 도무지로 깔린 얼음을
녹여주고 싶다
우리 그만 동지同志가 되자
붉은 팥이 흐물흐물 풀어지고
홧병처럼 불쑥불쑥 옹심이 떠 오르면
입천장이 데이도록 팥죽을 밀어 넣고
좁고 동그란 목구멍을 후끈 달구고 싶다
붉고 뜨거운 팥물이 흘러 들어가고
얼음 단번에 녹을 것만 걑다
머리털과 눈썹에 내린 수심도 털어 주고
동지는 목이 아주 길어
얼음을 꺼내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동지同志니까
가자, 꽃 꺾으러 가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효운은 자연의 시간을 언어로 감지하는 시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며 감응하지 못하게 된 자연의 리듬을 우리 삶의 지평으로 옮겨 놓았다. 자연의 지속은 밤의 시간처럼 우리 앞에 여전히 비가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풍요를 연 쉼과 회복을 허락한 시간이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오랜 비움의 형식이지만 이 가치를 감지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 시인은 이러한 삶을 발굴하고 발견하여 우리 앞에 서정적 필치로 그려낸다.
-김학중 시인
"격자 문살에 햇살을 걸"고 가야금 소리를 듣는다니!
물 좋은 고등어 속살처럼 뽀얗고 금방 뽑은 김장 무처럼 싱싱하다. 김효운 시인의 이번 시집에는 이처럼 웃음을 깨물고 눈물을 훔쳐내고 싶은 이미지들이그득하다. 그는 "바람을 타기엔 질긴 것이 좋다"고 뼈 시린 한 마디를 던질 줄도 알고 "아버지가 나의 퀘렌시아였다"고 때늦은 그리움을 받들 줄도 안다.
혹자는 그의 시를 늙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아무려면 어떠랴. 늙었으면 이제 숙성될 일만 남은 것 아닌가.그가 지금 "상한 것들을 모두 들어낸 나무 아래/텅 빈 허기를 내려놓고 싶다"고 고백한다. 시도 시인도 천천히 익어가는 중이다.
-박미라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