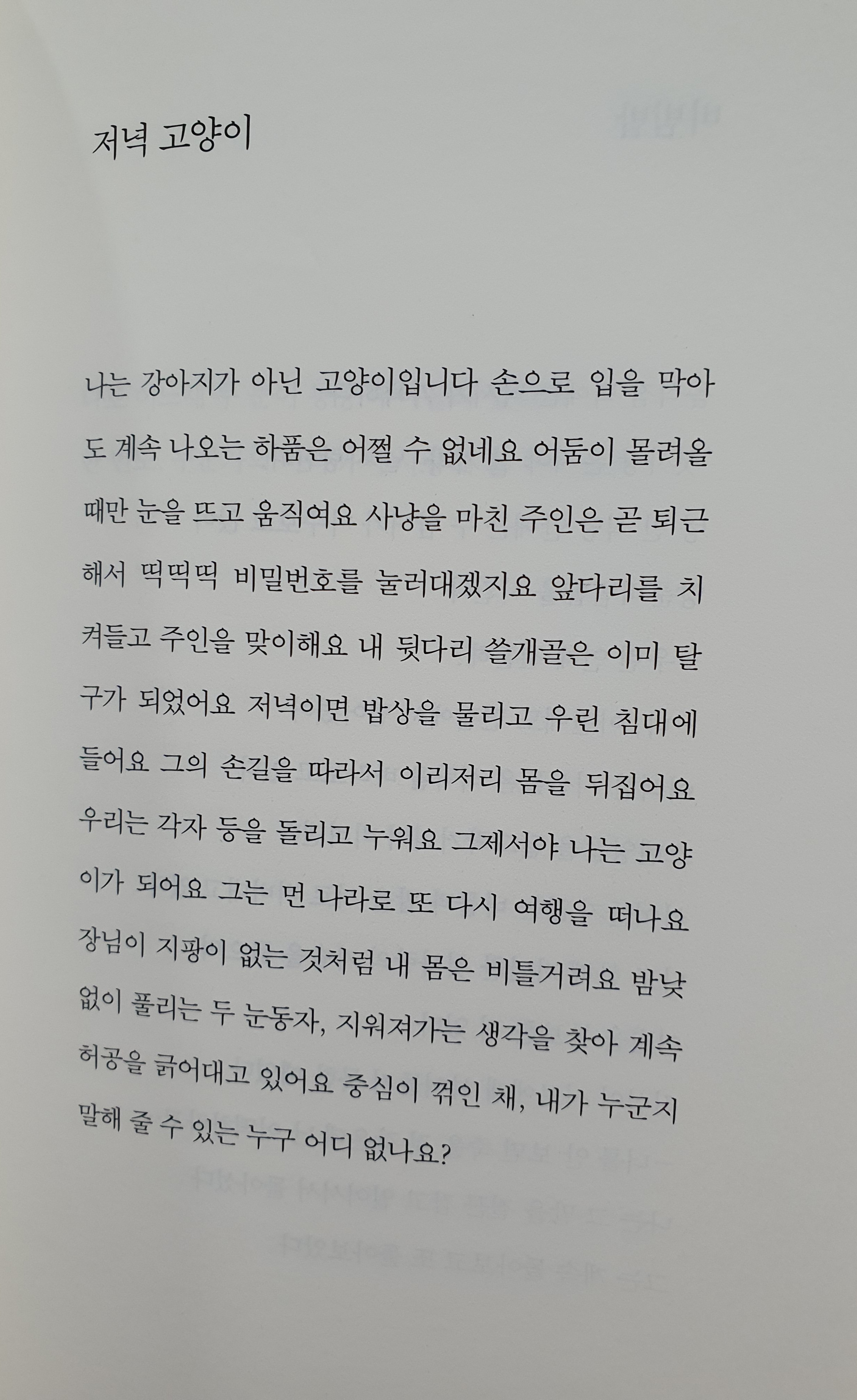미늘
박순
당신에게 갇혀서
길을 걷다 보니 길을 잃었다
당신을 뒤쫓는 당신의 거울
당신을 피해
도망치듯 뛰어가 숨었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며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새는
젖은 날개를 포개며 잠을 청하고 있다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꽃망울들
굶주린 산짐승의 서늘한 눈빛이 빛나는 시간
어둠의 소리들이 모여들고 있다
뇌는 이미 암전이다
두 눈은 깜박거리지 못한다
숨을 토해내고 있는 불규칙한 시간들
목을 더 움츠려, 목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기억 속의 문장들이
내 길을 가로막는다
물방울처럼 부호로 튀어 오르고 있다
발버둥치며 울었던 시간은 또, 빗물에 씻기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
그림자를 썰며 다가온다 또각또각 소리 들린다 나를 붙드는 벼랑 잭나이프를 들이댄다 입을 틀어막고 두 손을 끈으로 묶는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고개를 흔들며 중얼중얼 용서를 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왜 날 죽이고 싶어 하는데 질문은 허공을 치며 달아난다 번뜩이는 눈빛만을 기억할 뿐 허공에 친 손사래에 놀라 깬다 무슨 비명을 그리 지르냐고, 당신은 계속 나를 흔들었다는데 달콤한 서러움의 시간 들썩이는 어깨에 투박한 손을 얹는다 그 사람은 누군가 기억의 꼬리는 자꾸만 자꾸만 늘어져 간다 피가 나도록 물어뜯는 엄지손톱, 감정을 꾹꾹 씹어 삼킨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자라
아버지는
시간을 쌓듯이 지게에 연탄을 쌓아올렸다
작대기에 무게를 의지한 채
혈관을 닮은 골목길을 밤낮없이 오르내렸다
발목에 힘을 주고 또 주며 걸었다
사계절 내내 검어진 땀방울은
빗물처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목에 차오르는 시간들은
계속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딱딱해진 등에는
새까만 눈동자들이 따닥따닥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다 자주 길에서 굴렀다
관절이 고장 난 아버지는
해가 뜨면
밤새 앓던 자리 털고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어느 한 날,
오르막길 빙판에서 다시 넘어진 아버지는
등껍질 속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새
엄마는
육남매를 장사를 하다가 낳았다
아픈 배를 잡고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나다 주저앉았다
자신의 손으로 항상 가위를 들었고
손수 불을 지피고 물을 끊였다
엄마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나는 옆에서 훌쩍거렸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보고 가위를 달궈오라고 했다
가위는 불 앞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엄마는 탯줄을 자르던 가위로
쓸데없이 자라나는
육남매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식음을 전폐하던 이틀 만에
시간을 싹둑 자르고 홀연히 떠나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 날,
피어난 꽃도 보이지 않고
당신 냄새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웃어보곤 하지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눈을 꼭 감고 입술을 자근자근 씹으며
머리에 시집 다섯 권 올리고 외줄을 타보는거지
몰입을 향한 경건을 향한 환영을 쫓는 나를 버리기 위해
손가락 끝에 매달린 우울을 만찬에 초대해 보는 거지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웃어보는 거지
헐거워진 관능
60도로 기울어진 문장
바닥 친 분노게이지를 위해
메피스토에게 이면계약을 제의해 보는 거지
발가벗겨진 영혼도 거래가 될 수 있다면
그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집 '페이드 인'은 불화의 세계를 탐문하며 이 시대가 설정해 놓은 나와 당신의 경계가 높은 벽이 아닌 서로 가슴을 맞대는 울타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예로서 새로운 어법을 실험하는 도전의식과 변증법적 사유의 통로를 따라 긍정에 이르려는 시도는 시 페이드 인, 한 편에 성공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어쩌면 시집의 시편들도 페이드 인의 부록이라고 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듯도 하다
ㅡ나호열 시인의 평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