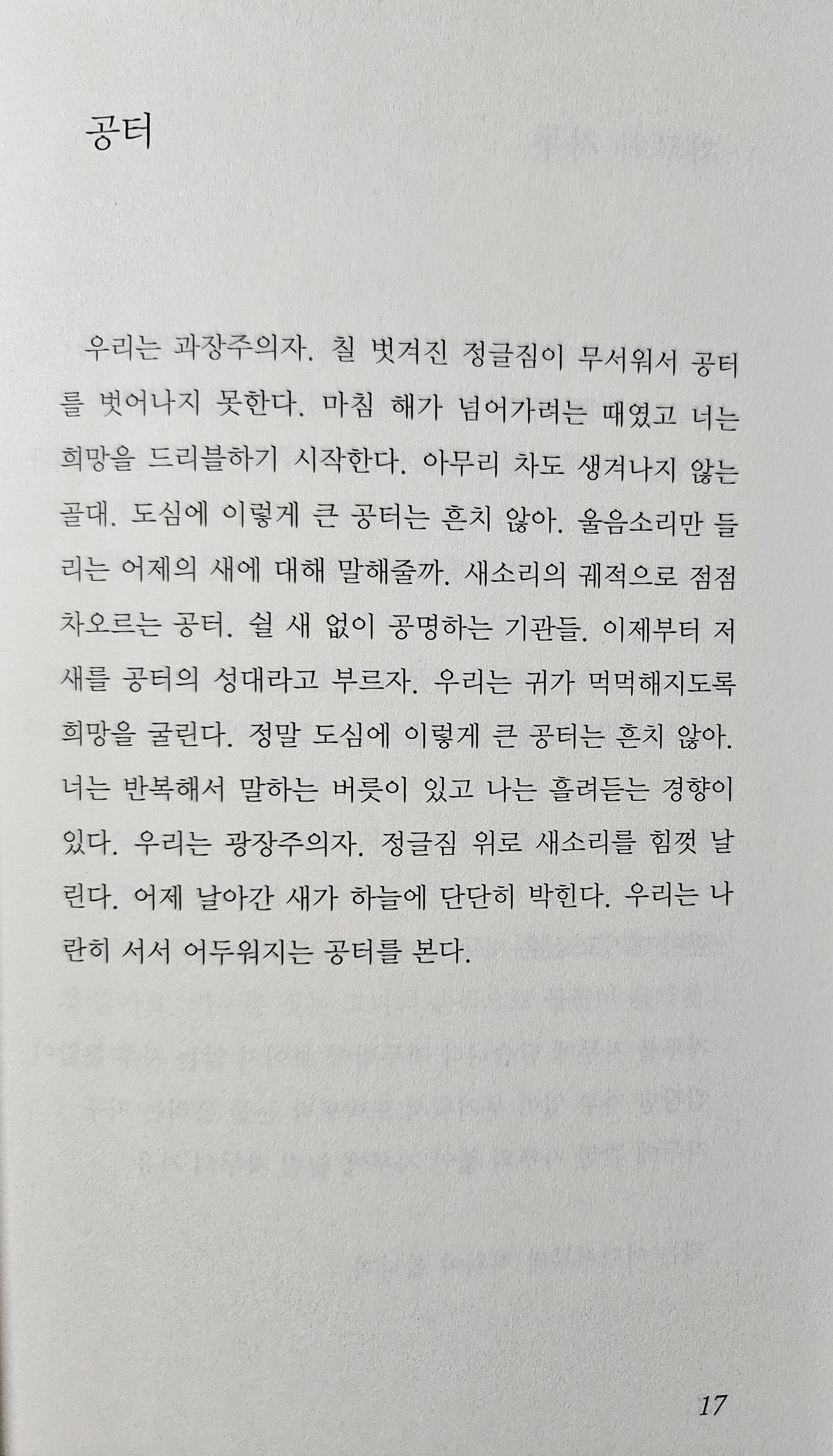자루와 자두
지관순
자루에는 새가 들어 있고 자두에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자루는 노래할 수 있고 자두는 굴러갈 수 있죠 자루는
자두를 의심하기 좋아하고 자두는 자루를 벗기기 좋아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루와 자두에 관한 내연의 질서
자루는 자두를 조용히 이끌 수 없을까요 새를 날려 보내면
자루는 꺼지고 자두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루와 자두는
함께 묶을 수 없습니다
깊이 담기고 싶은 자두 끝까지 차오르려는 자루
자루를 자두에 담습니다 자두밖에 보이지 않는 자루 눈앞이 캄캄한 자루 입이 무거워서 또박또박 눈물 흘리는 자두
자두에 갇힌 자루의 불안 자루에 눌린 자두의 자유
새는 어디서부터 지워야 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샌드 페이퍼
물푸레나무 식탁 앞에 우리는 마주 서 있다
나뭇결들이 출렁이며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탁한 강물 같지 않니
얼굴을 담글 수 없다면 그렇겠지
표면을 쓰다듬다
놀란 무늬들이 어깨를 움츠렸다
무늬는 가까울수록 멈추어 있고
멀수록 일렁이고 멀어질수록
지저귀는 이야기들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우기던 때가 있었어 잘 아는 것도 뒤죽박죽 열거하던 때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난 여기서부터 문지를게 넌 거기서부터 시작해
샌드페이퍼가 지나간 자리
가루로 변한 이야기들이 점점 쌓여가고
우리는 땀방울로 힘껏 빛났다
눈부시지 않니
식탁에서 손을 떼자
빛의 물결 속으로
무수한 이야기들이 잦아들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버찌의 스물여섯 번째 도서관
수요일의 우체부가 버찌를 꺼낸다
푸른 잉크로 쓴 편지봉투 속에서
황소자리와 전갈자리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디로든 닿지 않는
새벽 두 시
스물여섯 번이나 빗나간 예측과 성급하게 익어버린 열매가 가야 할 길
이제 눈을 떼도 될까
부풀다 번져버린 것들 밑줄 긋다 짓이겨진 것들
다 써버려 남아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황홀하다 버찌의 생일날 날아든 키스!
다 읽어버릴 테야
박쥐우산이 서른두 번 뒤집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관순 시인의 등단작 <부불리나의 침대>를 여태 잊은 적이 없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서늘한 농담과 때 묻지 않는 상상력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어떻게 부불리나를 이토록 살아 있는 얼굴로 그려낼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시적 대상을 선택하는 그의 안목이 탁 트여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번 시집에서 거듭 발견하려고 한 것은 소중해서 난감한 것들, 삶의 가려운 부분이다. 시인은 마치 우리 삶에서 지속되며,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라일락 나비'같다. 시적 대상에 나앉아 춤을 풀 듯 시인은 동음어와 유사어와 다의어와 반대말을 시적 장치로 사용하여 사유와 낙차와 쾌감을 만들어낸다. 균일한 아름다움이다. 무해한 아름다움이다.
-이병일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