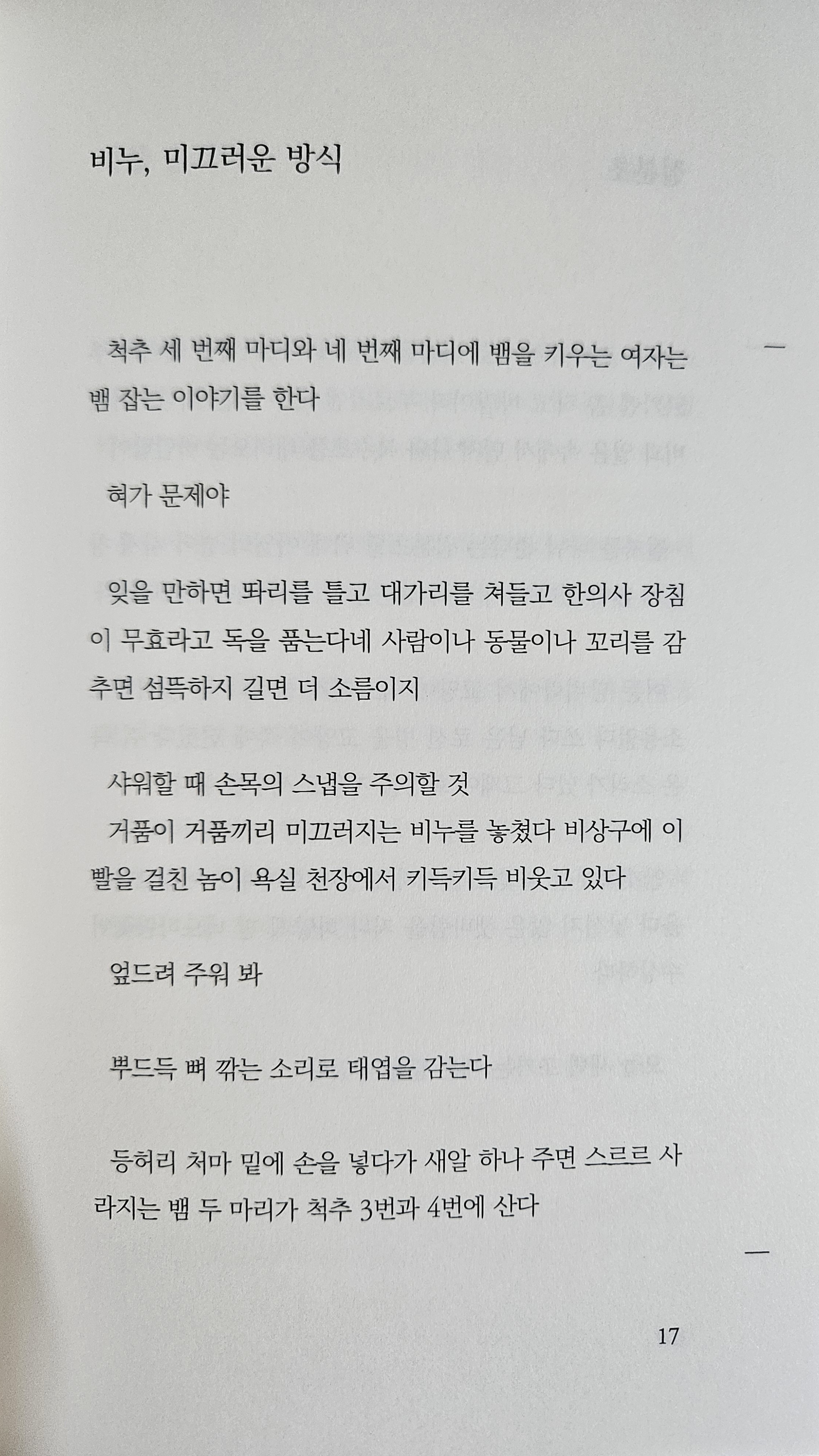늘어나는
황려시
그러니까 맨 끝에서 밥을 먹었지 키 작은 탓에 몽돌과 같이 놀았지 묵찌빠를 하면 더 자랄까
바지에 집어 넣은 끝단추처럼 잃어버린 3센티를 찾을 수 있겠니 눈썹까지도 볼 수 있는 키높이 구두를 샀거든
더 길어진 팔로 퍼피포트 스위치를 올린다 G7 커피는 포트 안에서 터키 여자와 방언을 하고 나는 손을 뻗어 내 편 아닌 모든 밖을 더듬는다
자꾸 늘어나는 손가락과 멀어진 몽돌의 성장판이 흩어지기도 하지
나는 서서히 많아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직립으로 키 크는 소리
긴 복도에 돌 구르는 소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밥 먹는 밥
전기밥솥이 고장 났다 하루 한 번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 에먼 데로 수증기를 보며 아는 형님을 생각한다 선배가 형이 되고 형이 애인이 된 방식으로 밥솥은 우물쭈물 보온으로 바뀐다 악기를 거절하는 다정한 방식으로 뜸을 들인다
밥이 밥을 먹으면 입은 두 개가 되지 원 플러스 원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던 애인이다가 남편 된 선배가 주민센터 열람실엔 아직도 살아 있어 그 세상은 얼마나 클까 참을 수 없이 배는 부를까
맛있는 백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저어 주세요
애인이 등본에서 돌아왔다는 아이를 낳았다는 뜬소문이 설익은 밥을 먹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시콜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느라 바쁘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입맛 없는 점심엔 너를 불러내지 안경을 코까지 내리면 미안하다는 뜻 너는 오렌지가 먹고 싶어 운동화를 빨고 식탁 의자 모서리를 닦고 오렌지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일 수상해요 오른쪽을 먹는데 왼쪽이 나와요 여덟 쪽을 냈을 뿐인데 우린 오렌지를 모르고 모르고를 모르고 왼쪽을 모르지 나는 네 얼굴 속으로 들어간다 당귤나무 냄새가 맹목적으로 흐르는 두 개의 입 그리고 구구단 7×9에서 귀신이 발을 걸었다
앗, 브런치! 하마터면 아점을 놓칠 뻔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황려시의 시들은 한마디로 언어의 무의식, 무의식의 언어에 충실한 시들이다. 이런 열쇠를 가지고 황려시의 시들을 읽으면 그 외피에서 보이는 난감하고 복잡하며 난해한 미로의 지도가 보일 것이다.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박쥐가 되고, 밤이 범이 되고, 사막이 강물이 되며, 밤이 방이 되는 것은 난해한 일이 아니라(무의식콰 기호의 세계에선) 일상이다. 그러면 둥근 소리들이 가까이 다가가 눈으로 입술을 더듬는다와 같은 문장도 이해가 갈 것이다. 황려시에게 일상은 로고스가 아니다. 그에게 일상은 은유이고 환유이며 무의식이다. 황려시는 바로 그런 일상의 풍경들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다. 그 그림들에선 파면 팔수록 다양하고 깊은 미로가 리좀처럼 펼쳐진다.
-이현승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