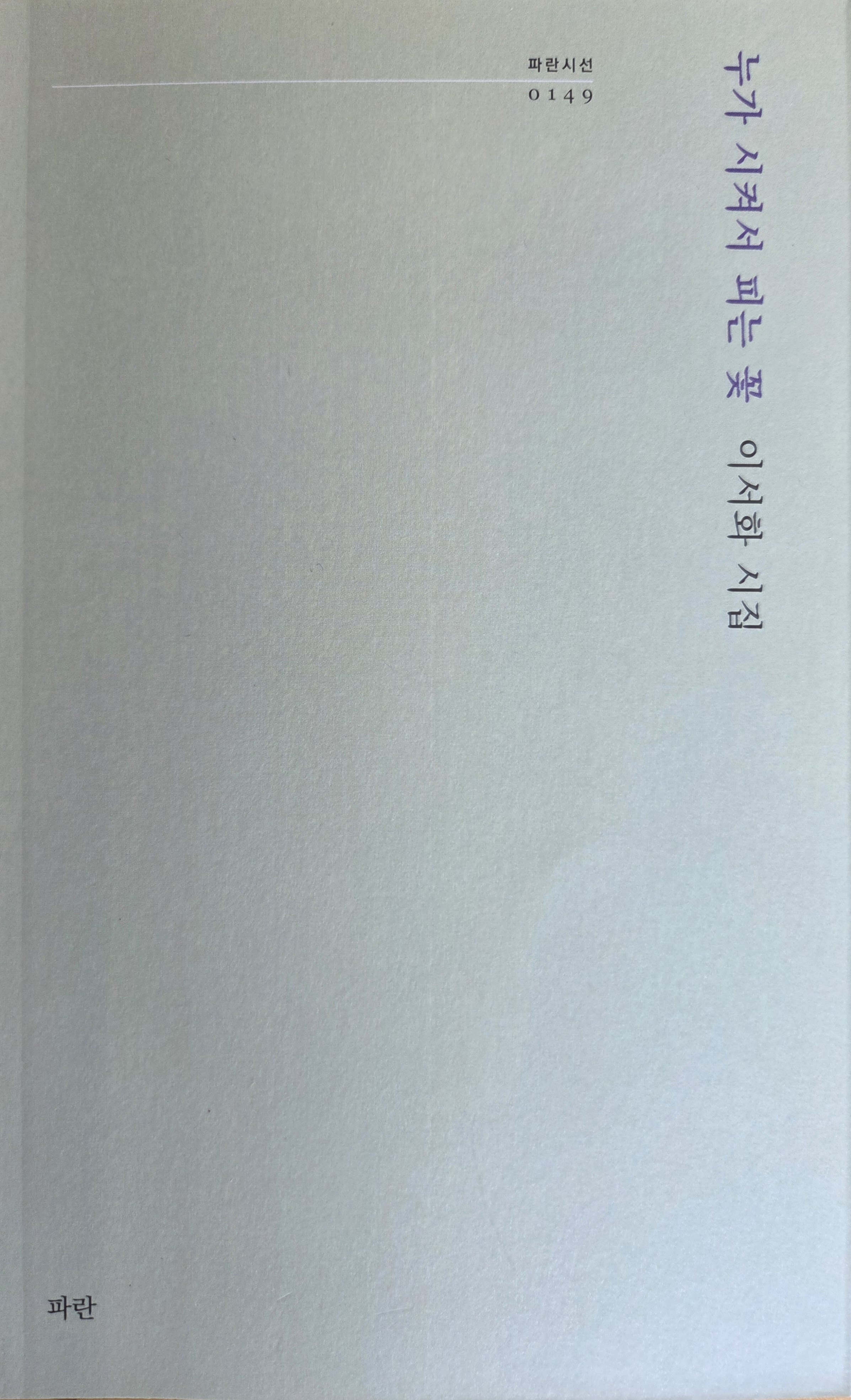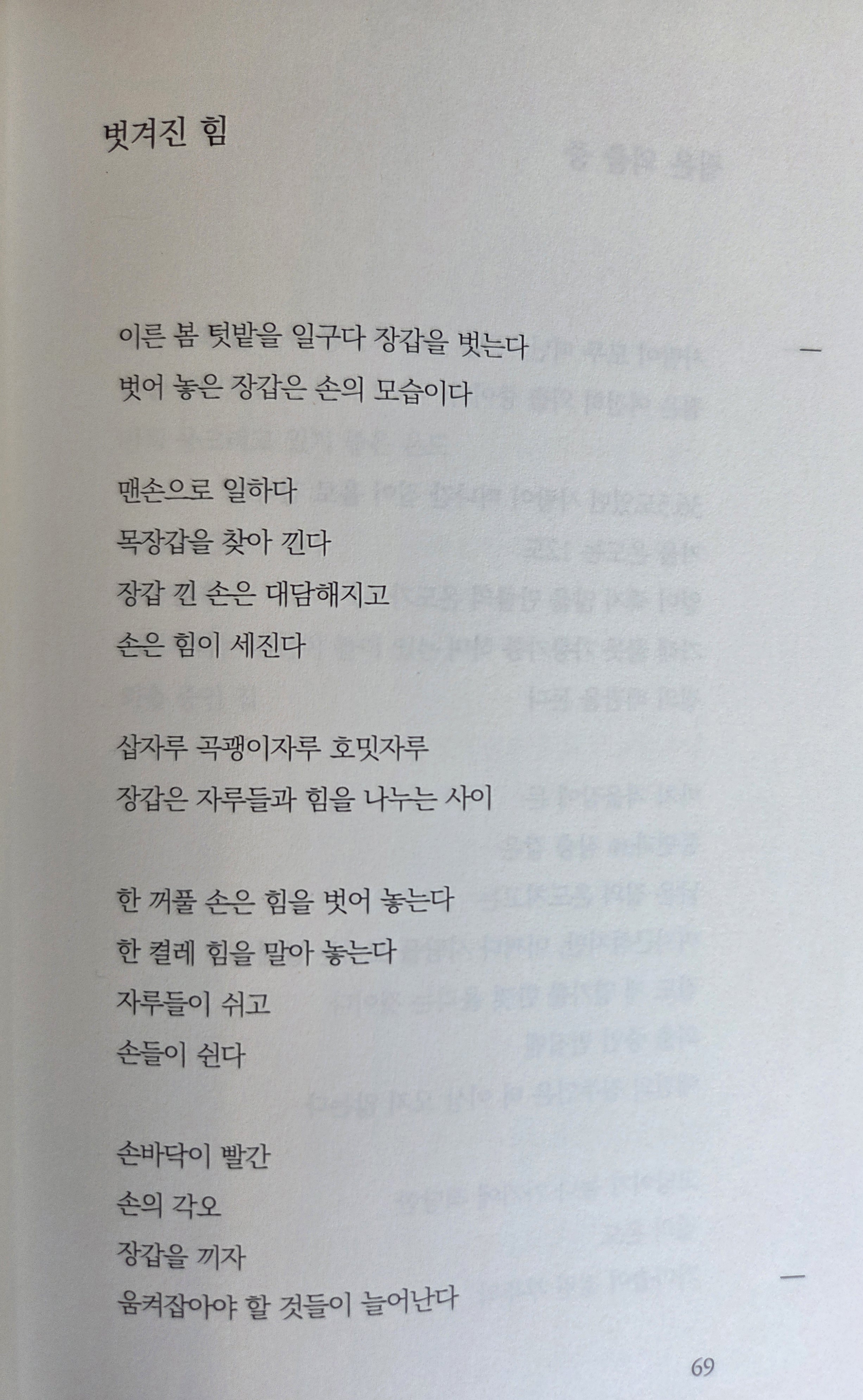두 개의 별 사이
이서화
별은 우주 공간에
몸을 매어 두고 있다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는 그쯤
현재라는 시간으로 버려져 있다
멀리 빛나는 두 개의 별 사이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다
별이 늘 한자리에 머무는 것은
줄다리기할 때처럼
어쩔 수 없는 두 개의 힘
저 별빛은
아득한 먼 곳에서 온다
먼 곳의 빛 그 끝이나 처음쯤에서
가깝게 혹은 또 멀게 서 있다
멀리멀리 가면서 사라지는
별의 일생
도착도 돌아갈 곳도 없는 빛의 일생이라면
그런 별빛의 종착을
자처하고 싶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려서지 않는
빛은 내가 살아서는 닿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두 개의 별 사이
그곳은 가만히
서 있기 딱 좋은 곳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숨을 껴안다
오늘은 흉곽이 아파
내 숨을 내가 가만히 껴안고 있다
가늘고 부드러운 숨을 골라
흉곽으로 넣어 주고 있다
흉
왠지 흉본 일이나
들었던 일들이
흉곽 속에는 웅크리고 들어 있을 것 같아
보듬듯 타이르듯 안고 있다
내 숨을 껴안고 있다 보면
숨이란 참 아픈 것들이었구나
따끔거리는 것으로 보아
삼각형이나 가시 모양의 혹은
깨진 사금파리 모양이겠구나 생각한다
남을 흉본 흉과
내 귀에 닿지 않은 흉을
어쩌면 들숨으로 불러들이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등이 아니라
앞쪽이 아파서 다행이라며
껴안아도 아픈
비밀스러운 숨을 천천히 내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벌레 도서관
벌레를 잡는 일은
다초점 렌즈가 필요하다
책을 털면
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책이 한 그루 나무 같고
흐릿한 눈은 뾰족한 부리 같다
가끔 벌레들이 꿈틀 돌아눕는 소리
도서관엔 죽은 책들이 많다
목차들은 벌레 알 같고
고딕체 제목들은 사슴벌레 같다
어떤 나무는 장기 대출 중이고
키가 높은 나무들엔 중세의 수도원 같은
새의 둥지가 을씨년스럽다
바짝 마른 벌레의 사체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글꼴들
콕콕 쪼아 대기만 하는
읽다 만 책은 핑계의 나무
읽던 나무와 벌레들을 대출해간다
벌레들은 풀숲 죽은 나무들의 기록
다 읽은 책은 날개가 돋는지
겉장을 덮고 포르르 날아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서화 시인의 시를 읽으면 우리의 생이 아주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안도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시인의 시선이 닿는 곳은 일상적이고 가깝지만 가려지고 소외되어 쓸쓸한 곳이딘.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연과 사물.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들은 때로는 견딤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제 몫의 생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다. 시인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본다. 작고 아픈 것들에게 스스로 맨살이 되어 고스란히 그 말을 듣고 닿으려 한다.
그런 시인의 시선은 섬세하고 무심한 듯 따뜻하다. 그리하여 시인이 말하는 "서로 같은 처지를 곁에 두고/희끗희끗 위로하고/위로 받"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
-이승희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