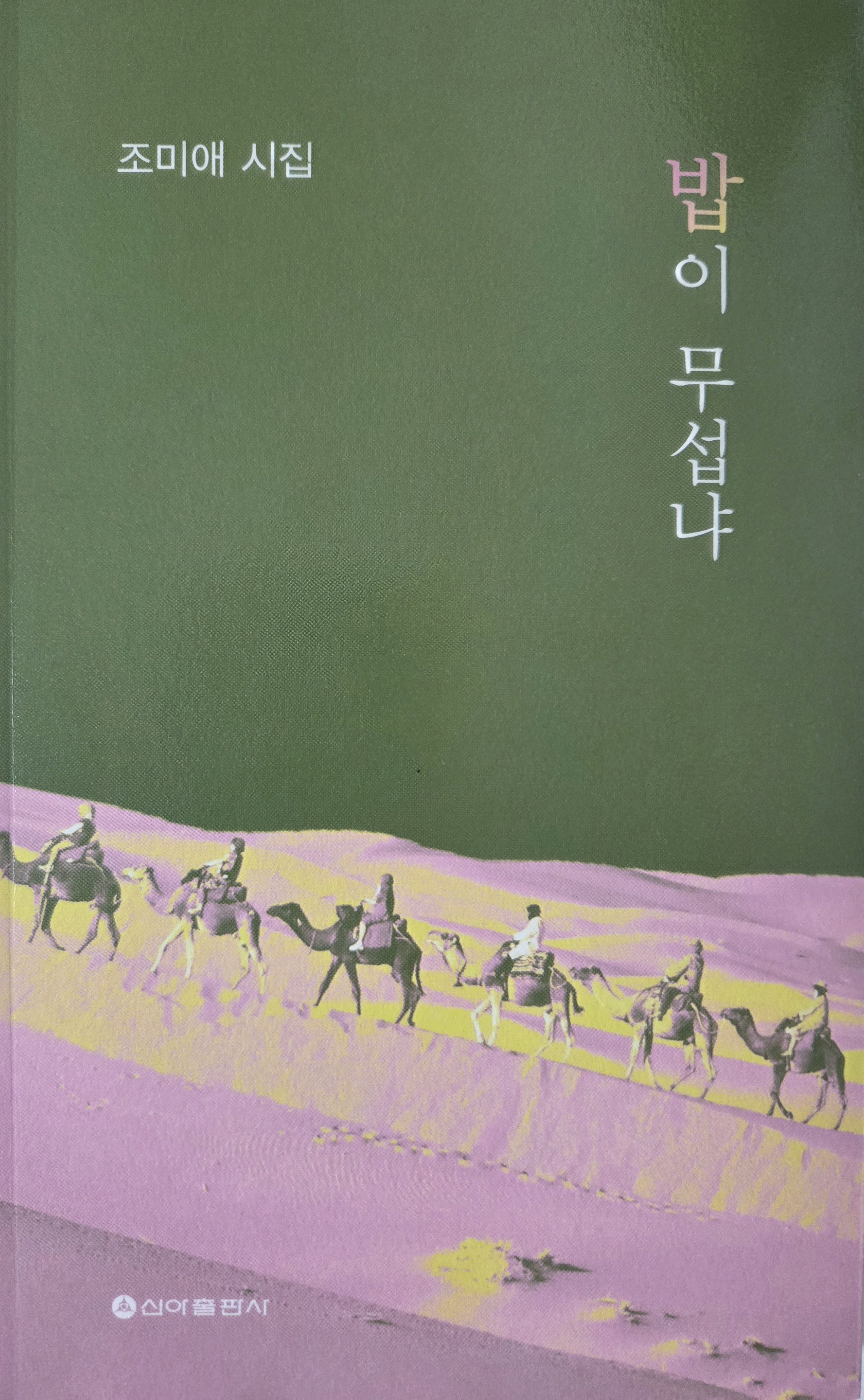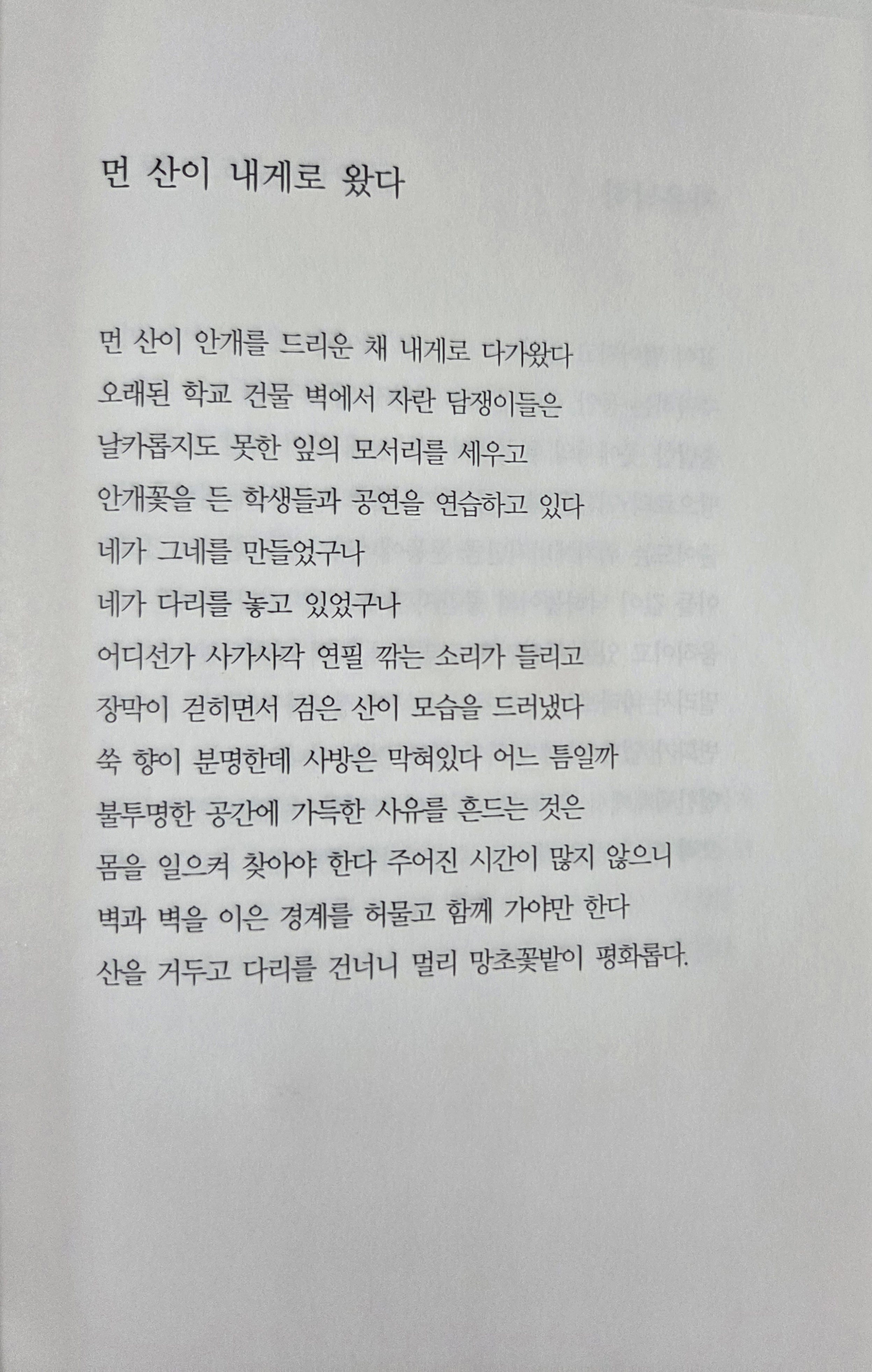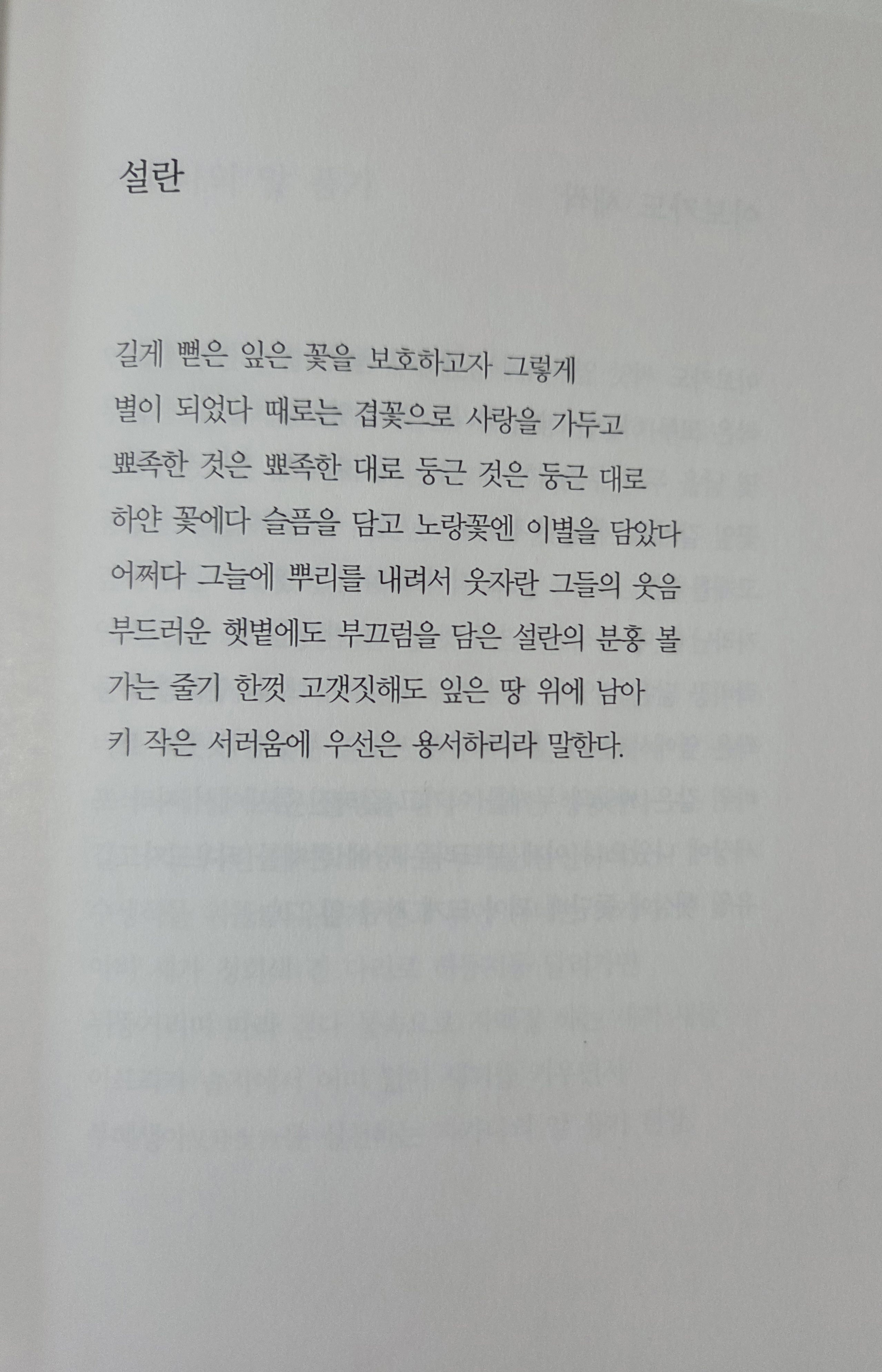누에의 꿈
조미애
태초에 벌레 한 마리 있었다
하늘 아래 길게 누워 온 세상을 제 품에 가두고
실을 토하여 뱃길을 만들었으며 스스로 출렁이는 물결이 되었다
무명의 휘장은 어둠과 빛을 가르는 경계를 허물었으며
벽과 벽을 넘나들면서 끈끈한 진액으로 자취를 남겼다
하나의 행성으로 태양을 바라보며 공전하였으며
수십 수백의 소행성으로 목성주위를 맴돌면서 그렇게
누에의 알들은 초록의 우주에서 일생을 시작한 것이다
1령 2령 3령을 지나 5령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혜를 얻어
자애로운 늙은 누에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에 집을 지었으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함께 어깨동무하고 쿵쿵 거리면서
나아가 꽁지머리 어린 소녀의 초롱한 눈망울에도 응답한 것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는 느릿한 걸음을 세고 있다
잠종장의 부지런함과 넉 잠을 자는 누에의 먹성과
지천에서 자라던 뽕잎의 수런거림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황금빛 누에의 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밥이 무섭냐
어머니는 밥이 무서웠다
삼시세끼 행여 새끼들 굶길까
숙이고 또 숙이시며 닦고 또 닦았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설렘과 두근거림에 거울을 만지작거리는 자식들
학교 중단시킬까 불안하여 텅 빈 통장 자꾸 열어서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셨다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몫
꽃이 피는 줄도, 꽃구경은 사치스러운 여인들의 것이라고
바닷가 해수욕도 가을 단풍구경도 모두가 남들 이야기라고
밥을 무서워하던 젊은 어머니는 어느새 팔순 노인이 되시어
늙어가는 자식들 먹을거리 투정을 보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밥이 무섭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봄볕을 다투다
한참 푹 자기를 소망하여 욕심을 내던 날
노란 꽃이 활짝 핀 멜라초를 따라서 온 것은
어린 은행나무와 민들레 한 포기 그리고
키가 큰 팽이나물 그러고도 뾰족한 잎에 날이 선
그 모든 것들은 꽃과 잎이 시들자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제 한번 살아보자고
제 몸 일으켜 세울 손톱만 한 땅 마련했다고
일어서 언젠가는 단단한 씨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더 이상 땅에는 관심이 없는 것들과
아직도 땅이 필요한 것들이
늙어가는 봄볕을 다투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씨앗을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릇파릇하게 싹이 났다. 밭으로 가는 좁은 길에도 풀들이 자라서 부드럽게 발목을 간지럽힌다. 복숭아 꽃이 만발한 바람마저 향긋한 초록의 봄날이다.
풀밭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 모두 시로 쓰고 있다.
바람이 물 위를 스칠 때 일어나는 파랑은 제 나름의 규칙이 있어 흩어지나 어지럽지 않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바람이 물 위를 가는 풍행수상의 법리를, 성긴 듯하나 놓치지 않는 소이불루의 묘로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시인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