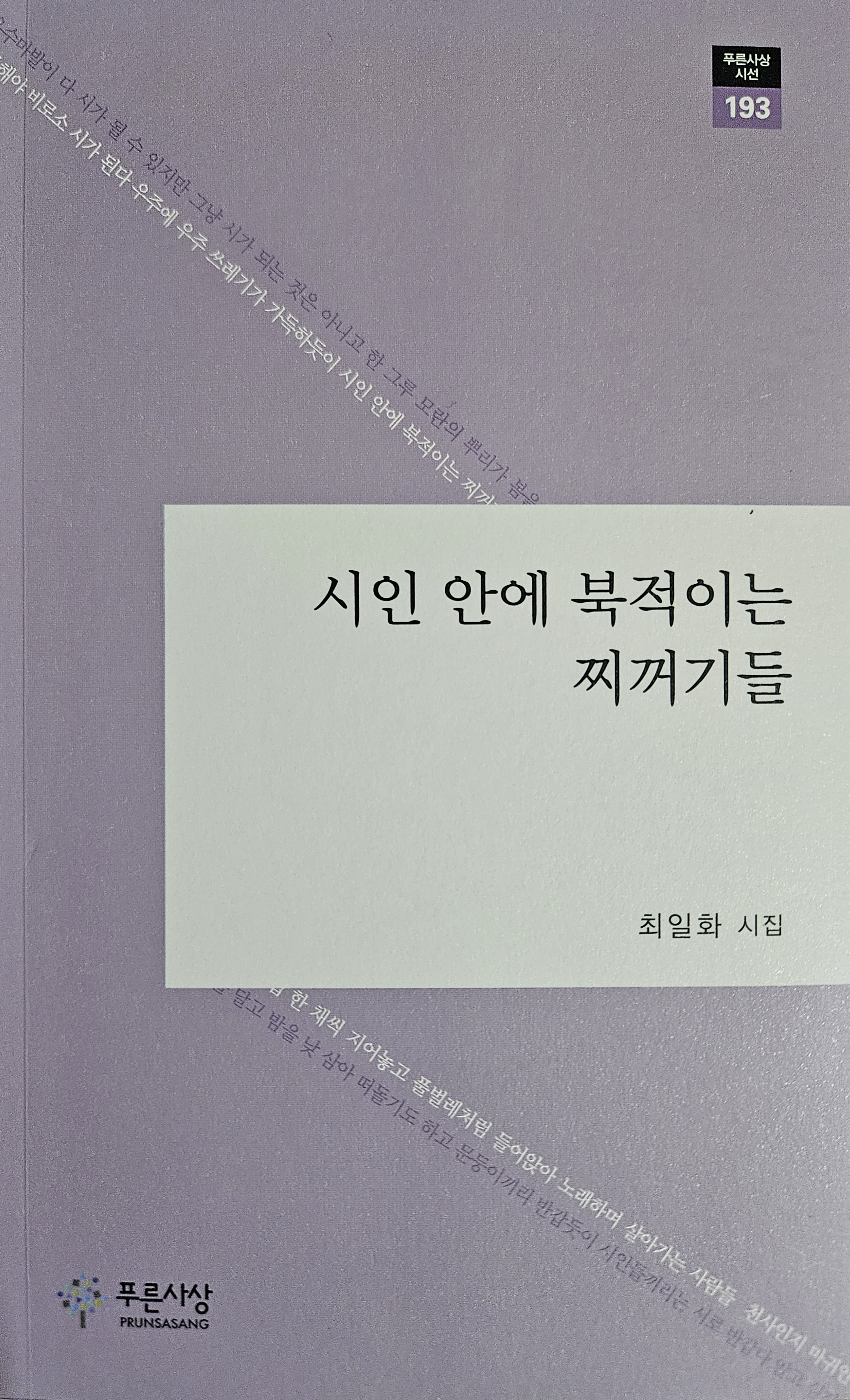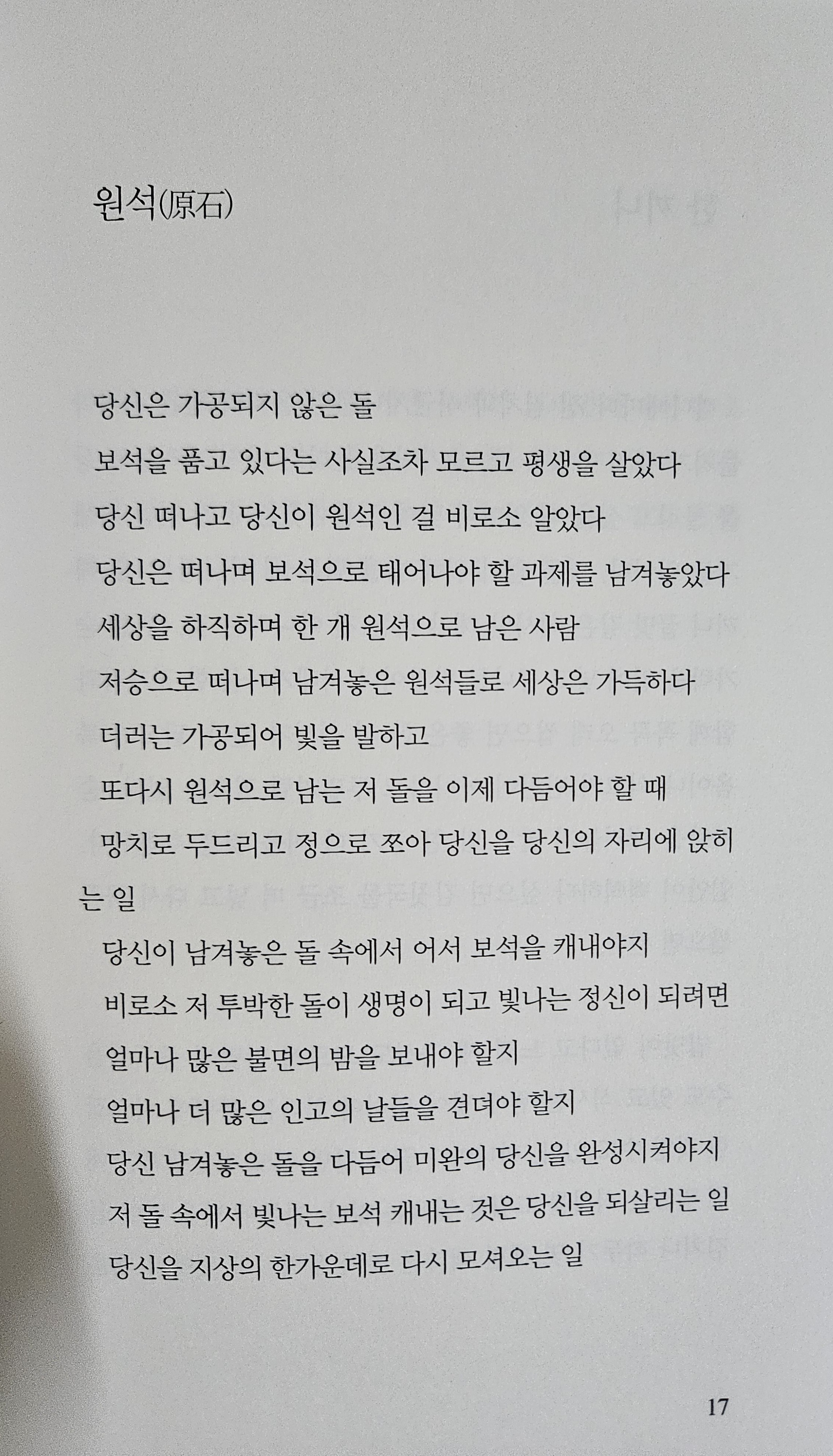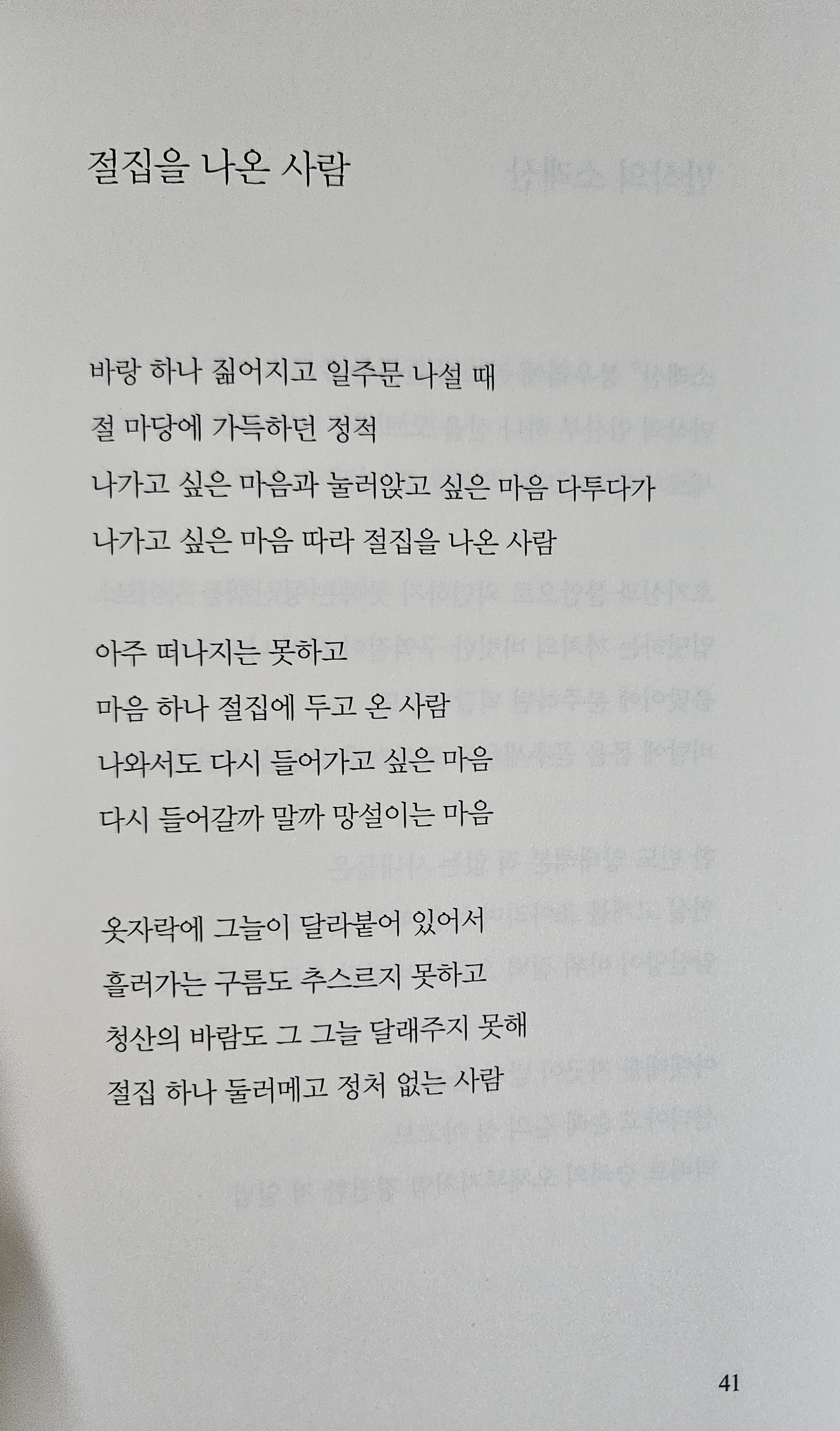방정식
최일화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그녀가 떠나버렸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위험한 일
날갯짓으로 새를 붙잡아놓거나
사방으로 튀는 공을 붙잡으러다 놓치고 마는 것은
새에게는 새의 마음이 있고
공에게는 공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새의 영혼과 공의 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시가 태어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려거든 때를 맞추어야 한다
앉으려는 새는 결국 곁에 날아와 앉는다
날갯짓하는 새를 붙잡아놓으면
초라하게 깃털 빠진 껍데기 하나 잡힐 뿐이다
그것은 방정식의 정답이 아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사차 씨
우리 동네 마실 방엔 사차 씨가 마실 온다
술 잘 먹고 재미있는 사차 씨
어느 날 넌지시 물었구먼
한자로 성함을 어떻게 쓴다요
넉 사에 버금 차
사차四次 씨 말에 하하하 폭소를 터트렸네
사차 씨 아버님은 한문에 조예가 깊으신가 봐
멋과 풍류가 넘치는 분이신가 봐
사차 씨 고향은 전라도 고창
풍천 장어 구워놓고 소주 한잔 해야 쓰겄네
그 이름에선 국화꽃 향기가 나지
육자배기 노랫가락 흘러넘치지
사차 씨와 술을 먹으면 사차四次까진 가야 해
일 잘하고 술 잘 먹는 우리 동네 사차 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봄길
저 복수초는
작년 봄의 것과는 다른 복수초
기다림과 외로움도
지난해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마늘 밭에 마늘 싹 다시 움트고
동갑내기 시인 떠나보내고 다시 맞는 봄
산책길 옆 새로 돋는 어린 연잎도
다른 세월 속에서 돋아난 연잎
국밥집에 들러 앉아 있어도
지난해 같이 갔던 그 국밥집 아니고
꽃구경하며 봄길 걸어도
함께 걷던 공원 그 봄길 아닐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일화 시인의 시들은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처럼 선량하면서도 정연하다. 시는 고상한 정서나 그윽한 시상이 아니라 "일상의 잡다한 것과 닮아 있고/저잣거리 소음과 먼지 속여 섞여"있는 존재이기에 고심하는 밤이나 고단한 퇴근길에 싹튼다는 시론을 무결하게 완성한 것이다. 시인은 잡다한 것들을 끌어안고 "시시포스의 돌을 굴려 올리듯/시를 짓는다"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시인의 운명을 고통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시인이 뒤쳐져 있는 것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 묻힌 시의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맹문재 시인, 안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