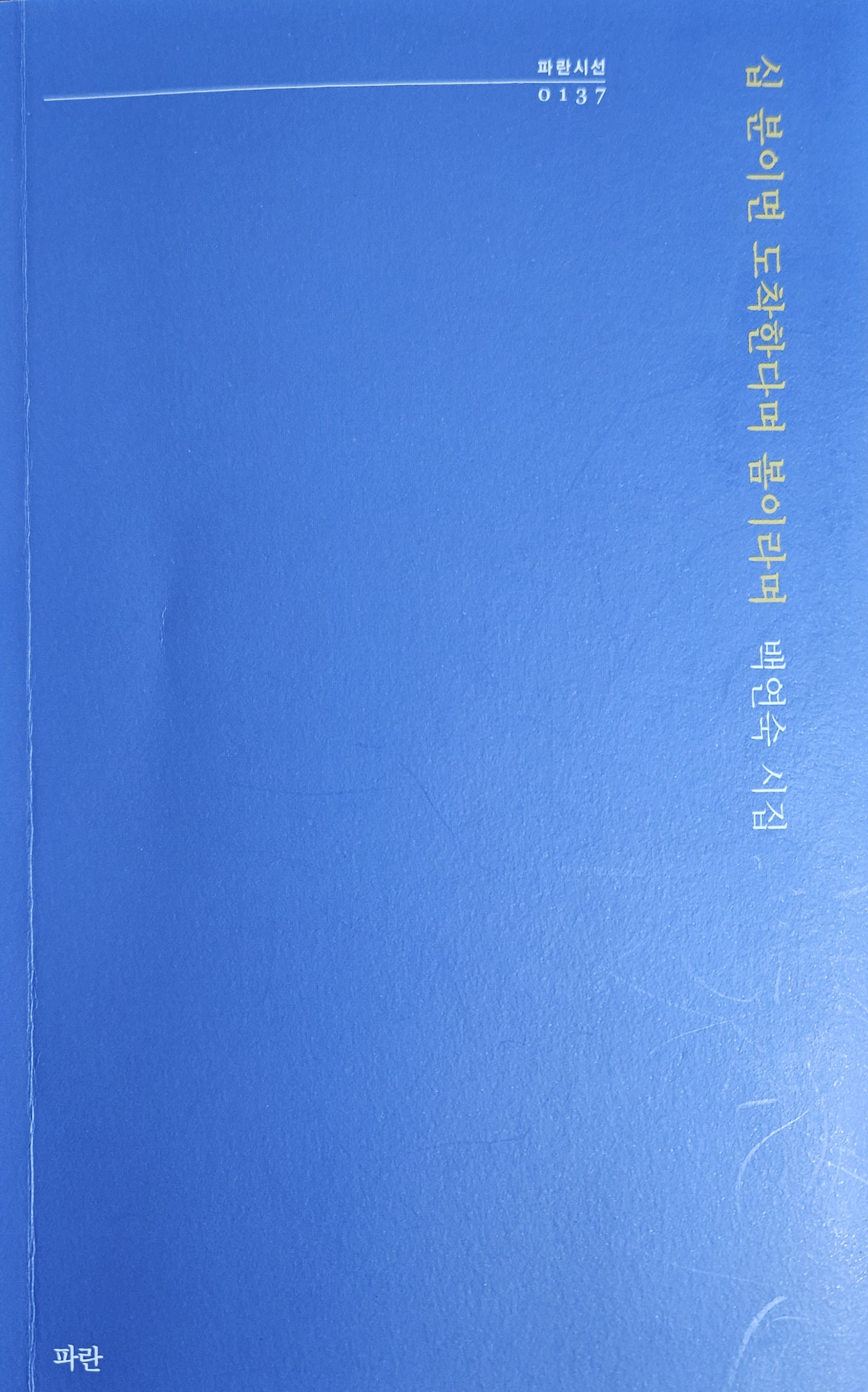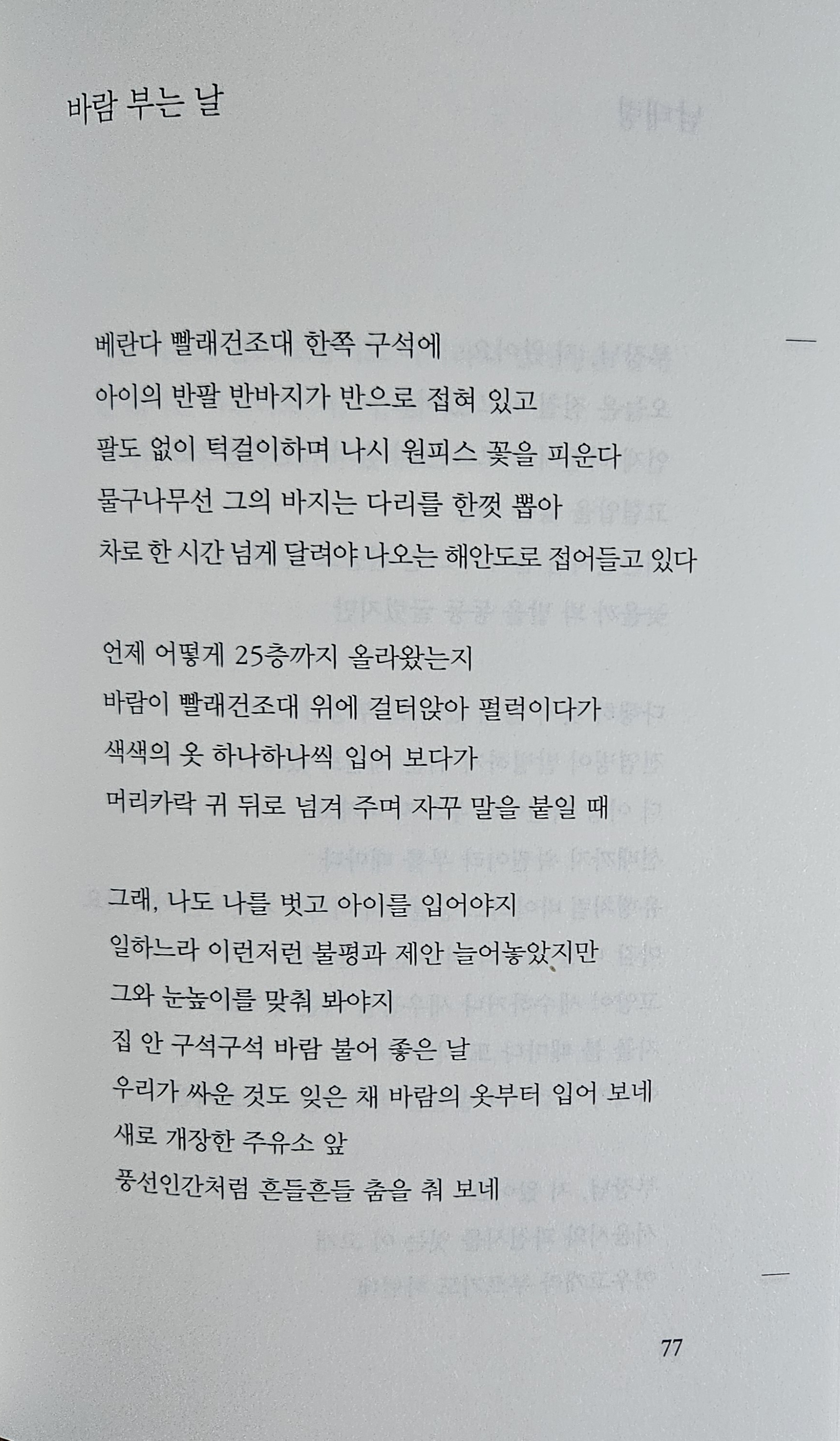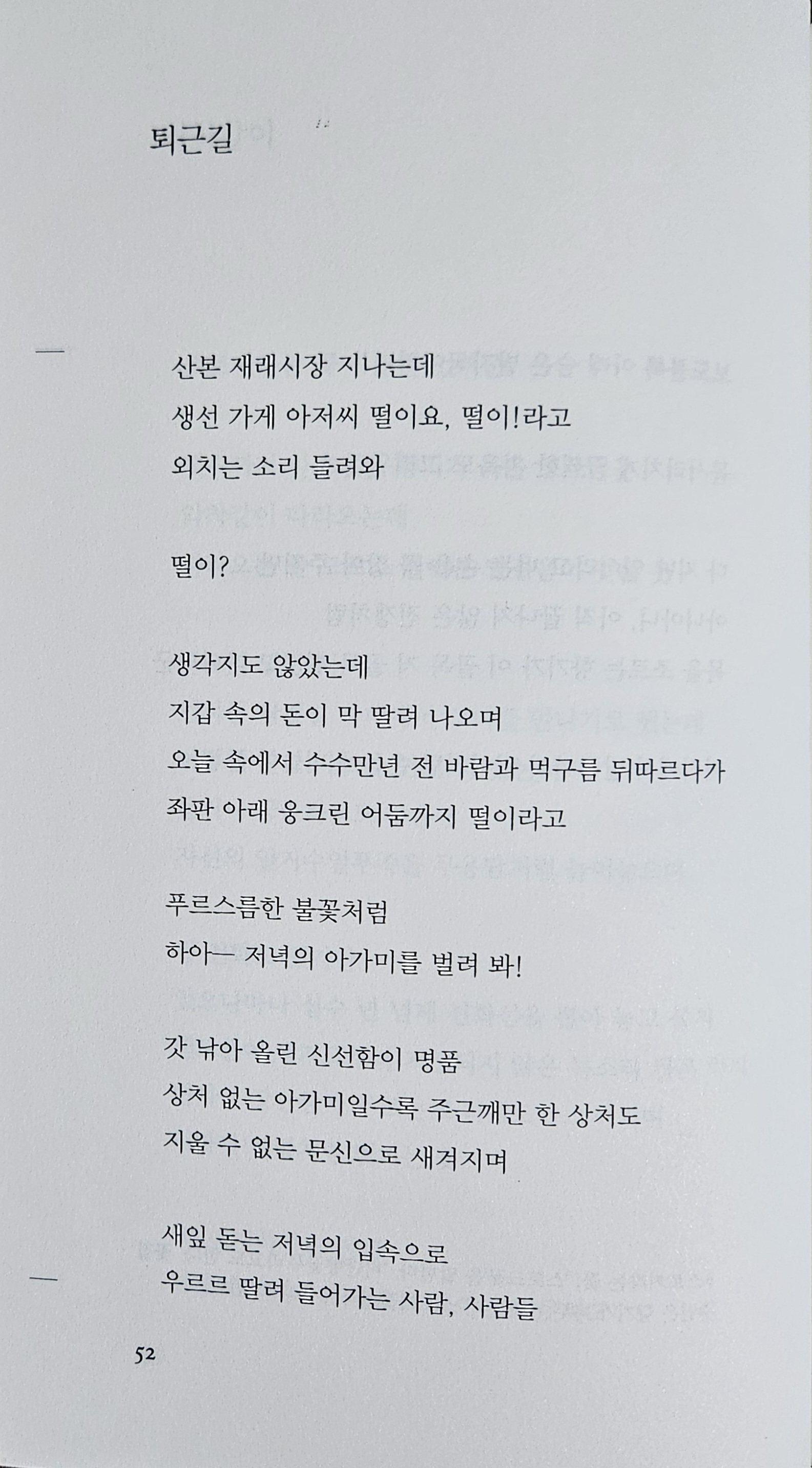평촌
백연숙
거미줄에 걸려 말라붙은 나비를 본다
바람 불 때마다 파닥거리는 나비
멀리 쌍둥이 빌딩이 보인다
벌레 먹은 산딸나무 잎사귀
거미줄 위에 매달린 채 흔들린다
줄을 쳐 놓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지만
육천 원짜리 백반을 먹기 위해
식판을 들고 길게 줄이 섰다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무거워지는 허기,
요란하게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 경적 소리도
거미줄에 걸려 있는 가을장마 끝이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자는 푸르다
하나은행 종로지점 김 대리가
왼쪽 유방이 없는 대신
왼팔이 불거져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약국 자리에 제과점이 들어서 있다
남편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김 대리의
의자 위에 놓인 병원 추가 서류처럼
의자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다
주문을 하는지 뒷자리에서 웅성거리자
우리는 또 말이 끊겼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 맞은편 수족관에서
물방울 뽀글거리며 올라간다
왼쪽 유방이 없는 탓일까
김 대리 비칠거리며 일어서다가
오른손으로 탁자를 짚자 교보문고 쪽으로 향하던
두 시 방향의 구름 내려와 앉는다
김 대리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억
한낮의 햇살 무너져 내린다
의자는 푸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달빛 감옥
언제 들어왔는지
차고 푸른 달이 거실까지
창살 자국을 찍어 놓았다
달은 언제나 젖은 발이었다
물 마시려고 나오자
뒷걸음질 치는 발자국들
가느다란 발목을 어루만져 본다
어두울수록 달의 발자국 움푹 파이고
바닥의 물기 마를 새 없는지
달빛은 고양이 자세로 한 발짝 두 발짝 우아한데
환하게 불 켜진 거실에서
물 마시다가 말고 스위치를 내린다
저편 어둠 속에서 보이는,
베란다 창살 감옥에 묶인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실 창문에 맺히는 여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십 분이면 도착한다며 봄이라며
물들까 봐 근처도 가지 않았다며
쥐똥나무 창공이라며 친구라며
졸지도 않았다며
꽃은 피었지만 나비는 날지 않았다며
사각지대는 아니었다며
새가 노래로 울었다며
58년 개띠 열댓 살짜리 아이가 있었다며
게이는 아니지만 스타킹이 나왔다며
뒤로 갈 수도 없었다며 대포통장이었다며
아이와 노모가 타고 있었다며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며
애인이라며
월요일은 일산 수요일은 목동
토요일은 우리 동네 약수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운 좋게 발을 뺐다며 물까지 타진 않았다며
고향 가는 길이었다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녀 시대
우리는 한 때 소녀었다
제복 스타일인 여동생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지나갈 때마다
멋지다고 내 귀에다 더운 입김을 뿜어 댔고
방학 숙제로 일기를 하루 만에 써서
국어시간에 빗자루처럼 털리던 나는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선수로 활약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엄마는 낭만 소녀처럼 부치지도 못할 연애편지나 쓰고
할머니는 그야말로 양갓집 규수답게 참하기만 했는데
너무 내숭을 떨었는지
떠날 때 이토록 소란스럽다고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상기된 소녀들처럼
신기하다는 둥 어이없다는 둥
다른 건 몰라도 이 병만은 걸리지 말자는 둥
할머니의 단발머리 곱게 빗어 나비 핀까지 꽂아 주면
우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소녀었다
살아생전 가장 행복한 날갯짓으로
할머니는 밤에도 꿀을 빠는 제비나비처럼
검고 푸른 하늘을 날아다녔다
같은 시간대 우리는
종종 할머니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시골집 마당을 떠나지 못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찍이 1996년에 시인이 되었으나 이번이 가까스로 첫 번째 시집이다. 따져 보면 이십팔 년 만에 시집을 내놓는 셈이다. 그 함구와 침묵의 시간에도 시인은 타자를 유심히 바라보는 일만큼은 내려 놓지 못한 모양이다. 타자의 슬픔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연민이 발생하는데 그순간 타자에게 값싼 동정을 내비치는 주제는 속물로 전락하고 만다. 그 점을 잘 아는 백연숙은 타자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식의 전략을 택한다.
-안도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