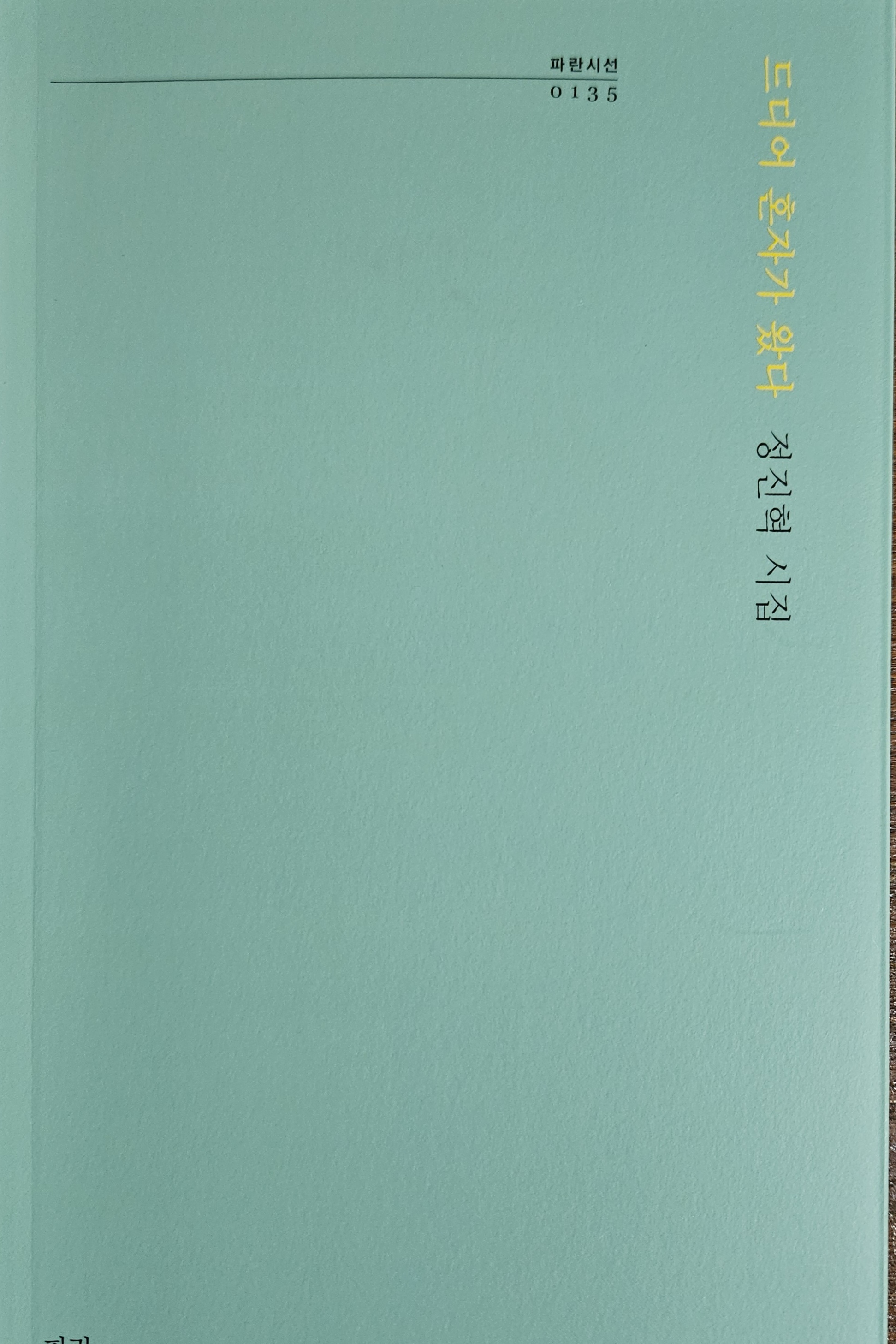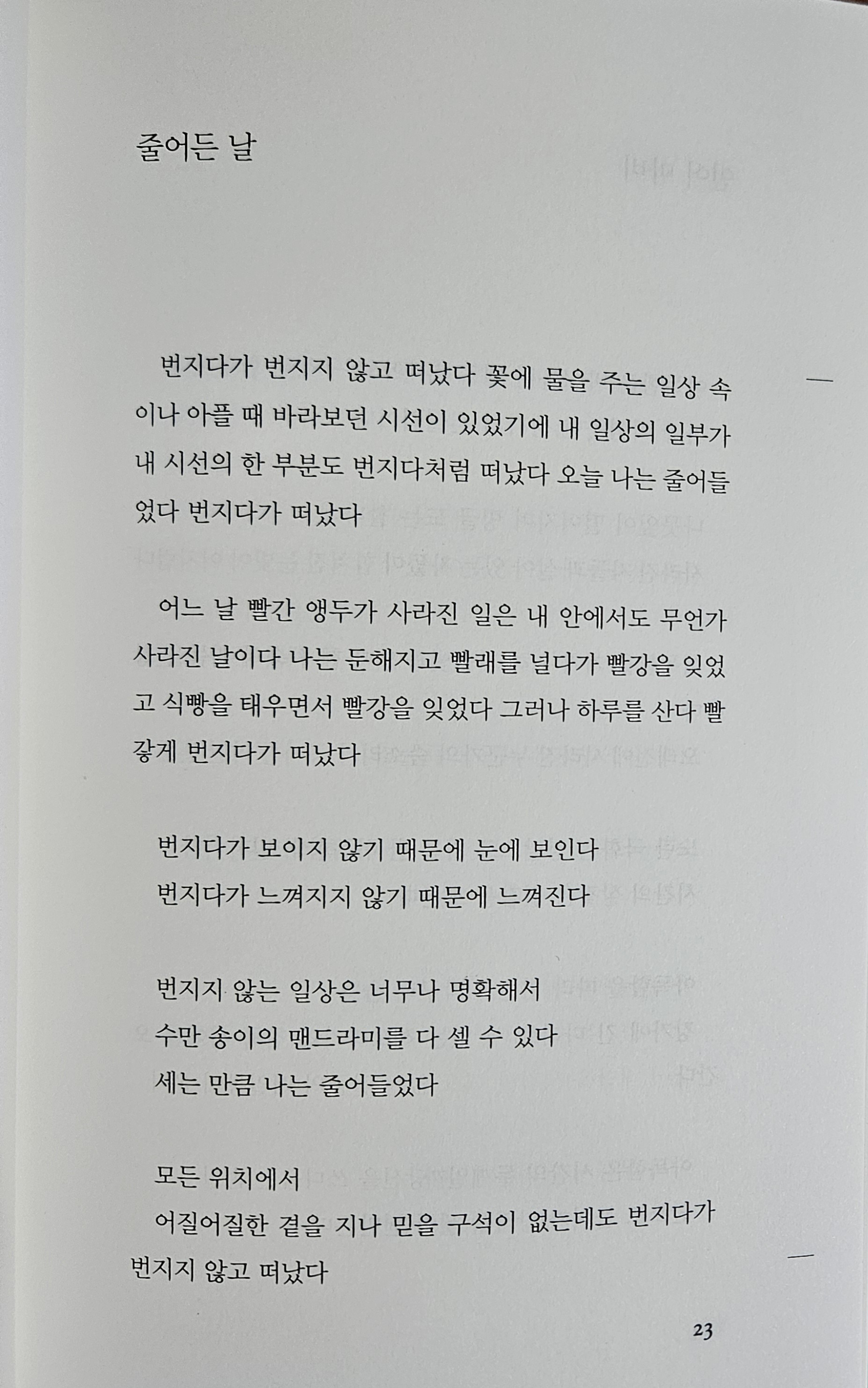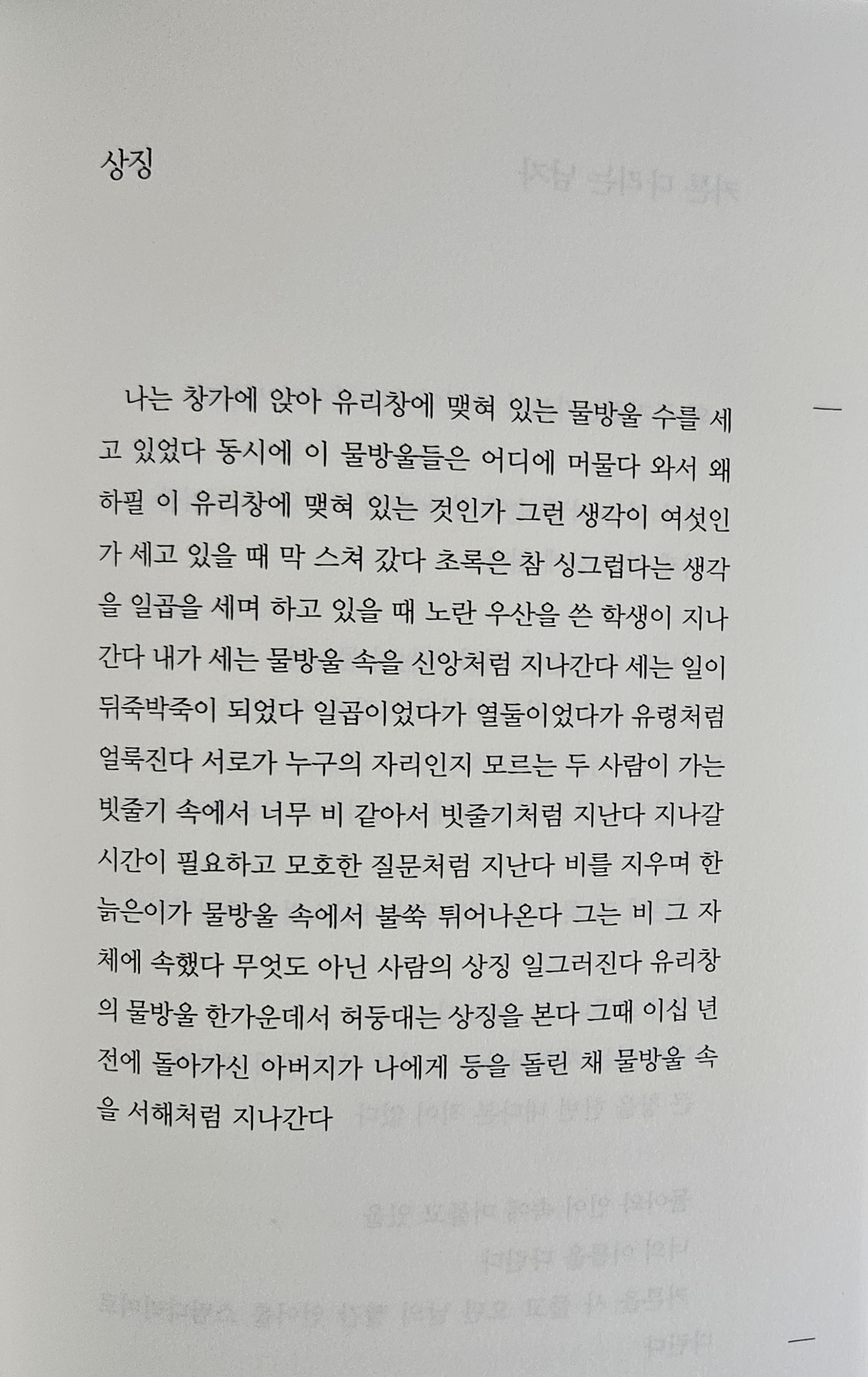연애의 언어
정진혁
벚꽃의 영역과 물의 영역 사이에 생긴 낙서 같은 것
물가에 서 있는 벚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대성리 물가는 세상의 경계선이었다
밤늦도록 벚나무 아래에서 놀다가 우연히 그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벚꽃 물가라는 말이 밀려온다
때때로 남서풍이 부는 물가에 가늠할 수 없는 울림
박각시나비와 휘어지는 강물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허공을 다녀온다
언어 몇 송이가 물 위에 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혼자의 배치
바깥과 안이 완전히 뒤바뀌며 왔다
때마침 밤나무 잎이 서걱거리며 흔들렸다
세상은 잠시 알 수 없는 색채와 공간으로 어른거렸다
드디어 혼자가 왔다
그림자의 등을 보고 있는 나와 마주쳤다
발걸음이 희미해졌다
슬며시 혼자가 왔다
그때 붉은 감이나 하얗게 피어난 국화처럼
느낌을 가진 것들이 자신과의 작별을 마음에 품었다
혼자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귀뛰라미가 울고 있다는 가벼움을 관통하며 바람이 지나갔다
지나가는 것들 사이로 혼자가 왔다
가을의 한가운데 희미하게 남아 있는 색채들을 지우며
혼자가 왔다
익명으로 왔다
한 명의 관조자로 왔다
붉게 사그라드는 황혼 속 슬픔에 잠긴 채 왔다
어떤 향기는 가 버렸고
항거는 말없이 왔다
생각하기도 전에 이 모두가 나에게 그대로 왔다
오롯이 지금 이곳에
내가 살아갈 첫 번째 혼자는
내가 잃어버린 혼자이다
혼자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 앵두의 시작
붉음을 아는 모든 앵두는 앵두에 가까워진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기쁨이
앵두에는 있다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앵두 앵두
그 소리가 좋아서 나는 멀리 앵두의 붉음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앵두와 함께 투명해진 모든 시간
아무도 모르는 투명한 시간이 온다
둥글둥글 구르다 어디에 멈춰 서는 앵두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앵두는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몸짓이 있기도 전에 붉은 앵두가 있다
꿈이 있기도 전에 앵두가 있다
앵두는 시간
모퉁이를 돌고 도는 시간들
앵두야말로 모든 기원
주소를 버리고 혼자인 날들
너의 붉은 입술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모두 앵두의 귀여운 완성 속으로 떠난다
모두가 앵두이다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앵두는 분명 신이 손으로 지은 이름
앵두 부르면
모든 가장자리가 빨강이 되는
그래 앵두의 시작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숙주 인간
타인에게 달라붙은 기생충이다 나는
너의 개성이라는 물컹함 안에서 꿈틀거린다
너의 발걸음을 내 정신에 새기고 내 의식은 깊숙이 너의 뇌에 파고든다
종로3가에 발걸음을 내디딘 자가 된다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간 자가 된다
어제는 너를 지니고 부산에 다녀왔다
봄밤은 진부해라는
네 안의 말라붙어 있는 감성을 나는 살아 낼 뿐이다
나는 흡충의 일종이다
영혼의 밑바닥을 한참 찾아 기어들어 가
살아 내라고
다 짓물러 맛이라고는 없는 너의 정신을 빨아 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너의 외양이나 의상이나 행동도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를 조종한다
나는 네 몸속에서 너의 꿈을 체험한다
너의 육체와 충동적 본성과 행동 양식을 동시에 체험한다
빨아들인다
동시에 나를 누군가가 빨아먹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녁 붉음 속에서
화단의 백일홍과 분꽃 그리고 사루비아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다 저것 봐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를 쓰다듬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백일홍은 사루비아를 분꽃은 백일홍을 잘 모른다 서로 함께 모여 살고 서로 보고 있지만 서로를 모른다 서로의 빛깔을 보고 있지만 자기의 색깔만 고집한다 타인의 말은 이해의 풍선일 뿐 언제든 티지고 만다 사루비아는 백일홍에게 난 너를 이해하지만 어떻게 백 일 동안 꽃을 피우지? 무심히 입에 오른 말이 우리의 욕망과 삶을 읽는다 비둘기의 목소리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옥수숫대의 서걱거림 풀잎의 술렁거림 이 모든 일이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석양의 붉음 속으로 번져 가는 이 모든 환幻의 목소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진혁의 시적 화자는 존재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카메라 같다. 그것은 존재가 다른 존재로 넘어가는 무수한 문턱들을 집요하게 포착한다. 존재와 존재를 가르는 문턱에는 무수한 자아들이 우글거린다. 한 면의 자아가 다른 면의 자아를 만날 때 존재의 주름이 생긴다. 자아는 떠나온 시간으로 돌아가 내부에 안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먼 외부의 서사를 좇아 우글거리다가 바깥주름을 만들기도 한다. 자아의 내부와 외부에 주름들이 접히고 퍼지면서 존재와 존재 사이의 문턱에는 무수한 자아들이 올챙이처럼 꼬무락거린다.
존재는 처음에는 혼자였다가 내부에 여러 개의 주름을 가진 복잡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존재와 겹치면서 복잡한 무늬의 바깥주름을 가진 존재가 되기도 한다.
-오민석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