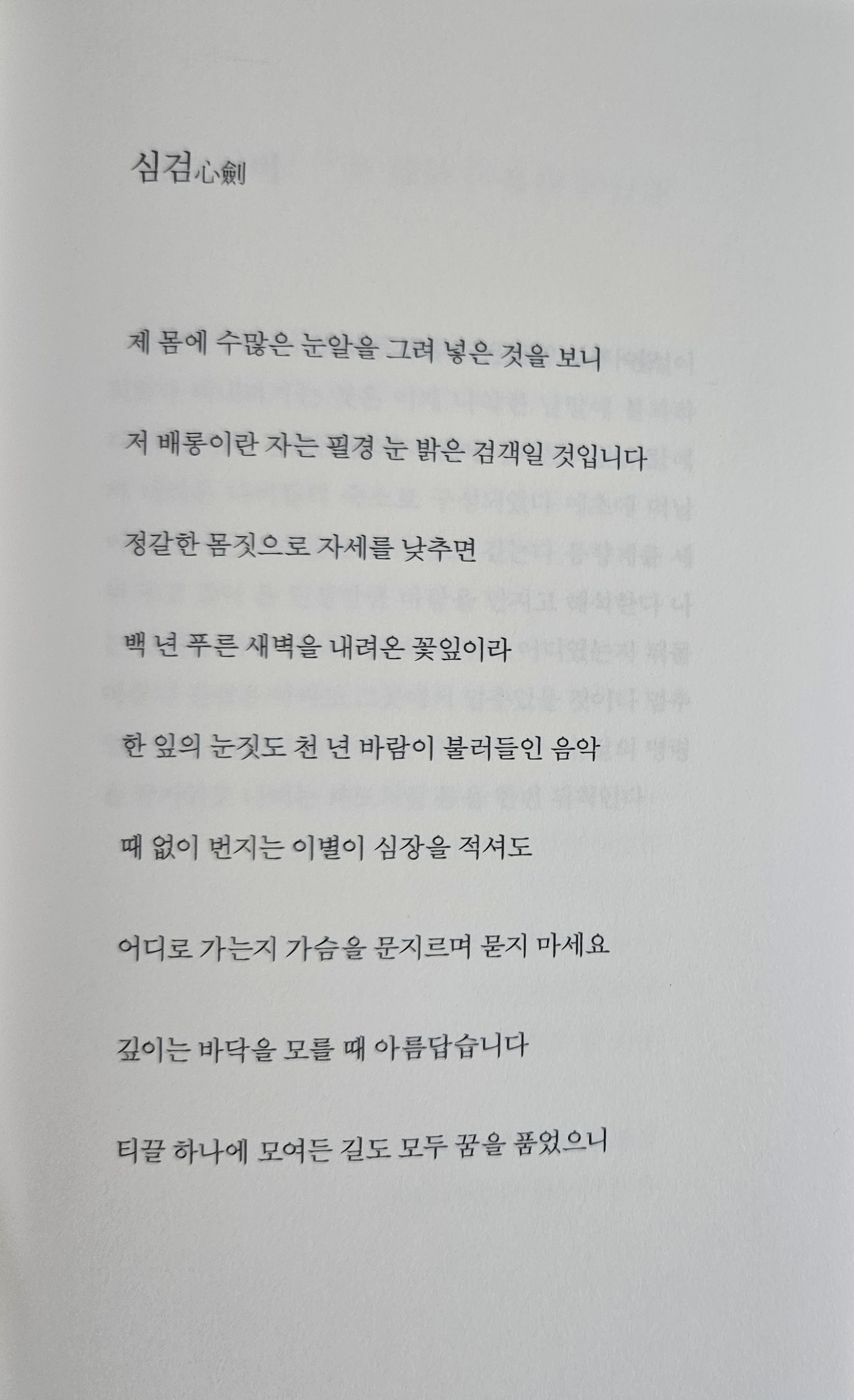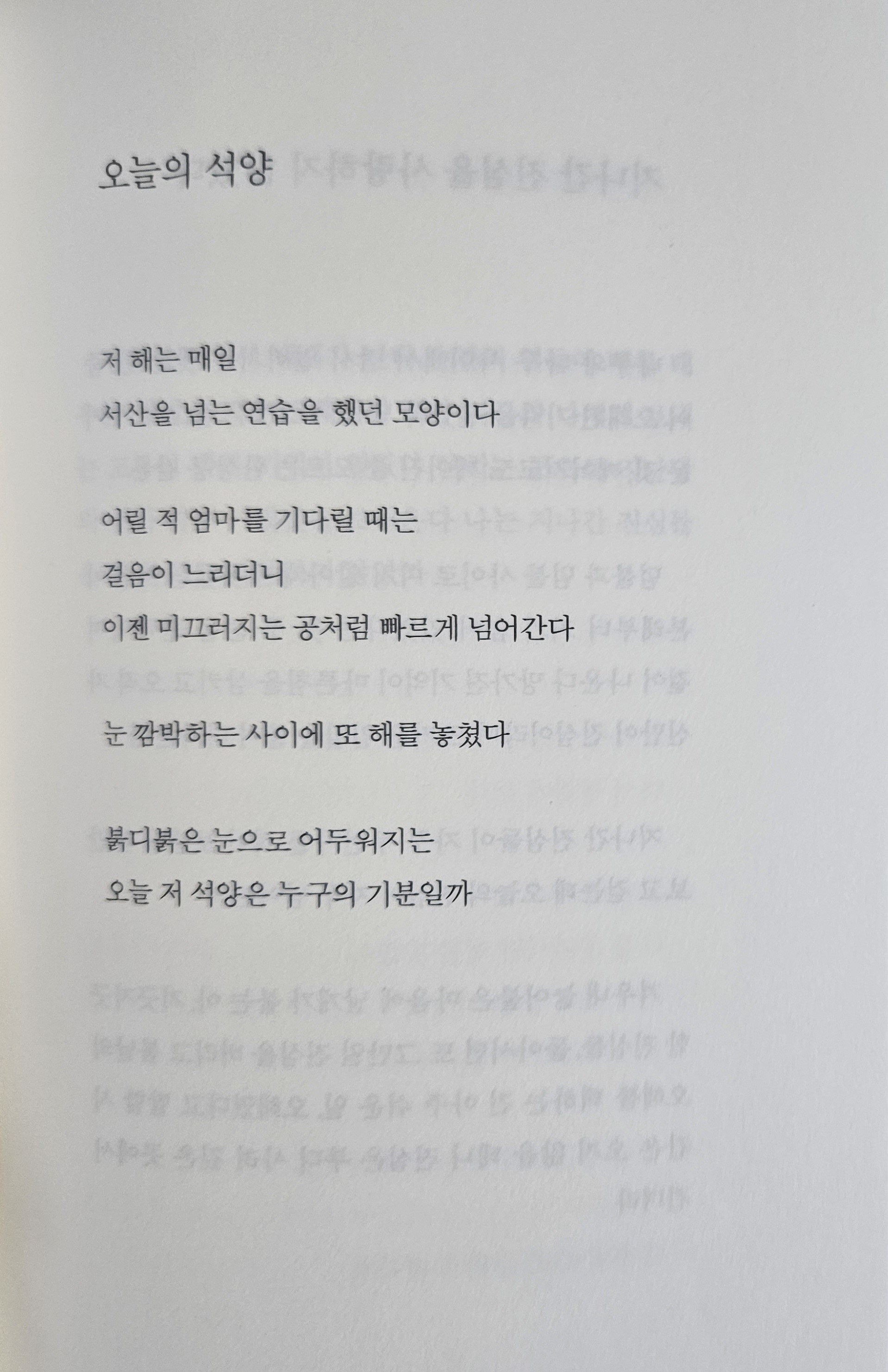걷는 나비
박주하
오래전부터 이곳으로 떠내려온 것은 모두 전설이 되었다 떠내려가는 것은 이제 나약한 낱말에 불과하다 이 골목의 성향은 달의 체온에서 비롯되었다 달에서 내려온 나비들의 숙소로 구성되었다 애초에 떠날 이유를 버린 나비들은 날지 않고 걷는다 풍향계를 세워 두고 겪어 온 인생만큼 바람을 만지고 해석한다 나는 날개를 떼어 낸 내 극도의 통점이 어디있는지 뒤돌아 본다 진실은 아마도 그곳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멈추면서 더는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새벽 두 시, 달의 명령을 끌어안고 나비는 파도처럼 몸을 한번 뒤척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죽은 몸을 붙잡고 우는 사람
잠자리 한 마리가
자신이 빠져나온 육탈을 붙잡고 들여다본다
젖은 몸을 털고 날아올라야 할 것인데
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걸까
슬픈 육체를 버리려고
긴 어둠과 침묵을 빠져나왔으니
친구여, 희망의 깊은 눈을 믿고
시들해진 고요를 치대어
어서 한번 날아 보시게
망초꽃 만발한 완벽한 계절에 함께 가자고
여름 오후가 바람 한 줄 넣어서 전갈을 보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눈물을 마시는 나비
아마존의 어떤 나비는
거북이의 눈물을 빨아 먹는다지
그 눈물을 모았다가 암컷에게 선물한다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짠맛
너에게 준 짠맛은 소문이 되었지
소문을 헹구다가
안개의 옆구리에 매달려 울었지
뼈아프게 살고 싶어졌지
염분을 만들지 못하는 나비가 되기로 했지
산에 가면 산새
물에 가면 물새가 되기로 했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떤 당부
잘 보내 주세요
저 그림자는
언젠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울어 준 사람이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백 년 여관
백 년 닳은 문턱에
노란 은행잎 한 장이 내려와 묻는다
잘 지내니?
별빛 돋았던 흔적도 낭랑하게 첨부한
뒷심 깊은 안부를 받으니
침묵에도 한계가 온다
우연을 꺾고 싶은 결심마저 도진다
하지만 어긋난 폐허를 더듬어서 어쩌겠는가
잘 지내지는 못했으나 이젠
무엇이 그리 잘 사는 것인지 딥할 일도 아니어서
그저 간절히 묵었던 무덤 같은 방에 들어
백 년 전에 넘어진 구름의 까닭이나 탐한다
늦가을을 풀어
더는 익지 않는 모과 한 알의 사정을
창에 어리는 물방울에 찍어 벽에 기록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전부,
다만 침묵의 충만함을 뭉쳐서
백 년 후에 다시 찾아들 그림자들
무심히 닦아 허공에 걸어 둘 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주하의 이번 시편을 읽는 것은 폐우물 속에 머리를 밀어넣고 어둠을 주시했을 때 듣는 환청의 경험과 비슷한 값을 지닌다. 그 스산하고 아득한 울림은 기억나지 않아 안타까운 슬픈 꿈결 같기도 하고, 전생의 뒤안길을 배회하는 황폐한 영혼의 통점을 지시하는 성싶기도 하다.
내성의 쓸쓸한 깊이와 처연한 환멸, 시집을 펼쳐든 첫 번째 인상이다. 젊을 무렵, 어쩌면 화쇄류처럼 분류하는 운명에 가파르게 맞섰던 그녀의 그에 대응하는 자세가 이제 이처럼 외롭고 고즈넉하다.
인환의 봄날 저녁, 내부의 어둠을 응시하면서 전신으로 운명의 등피를 닦고 있을 박주하라는 텍스트와 개성은 더 화창하게 개어도 좋을 터이다.
-오태환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