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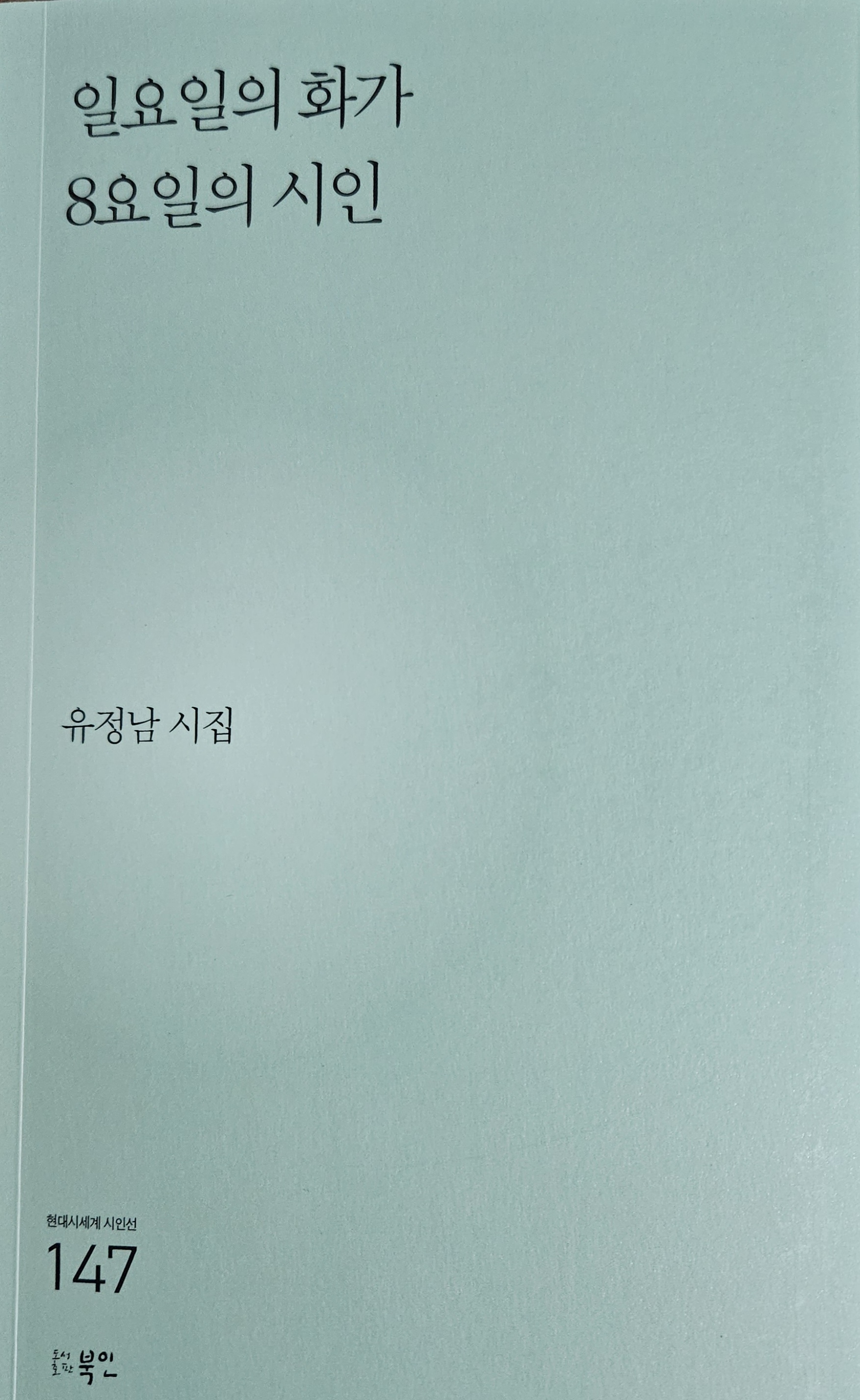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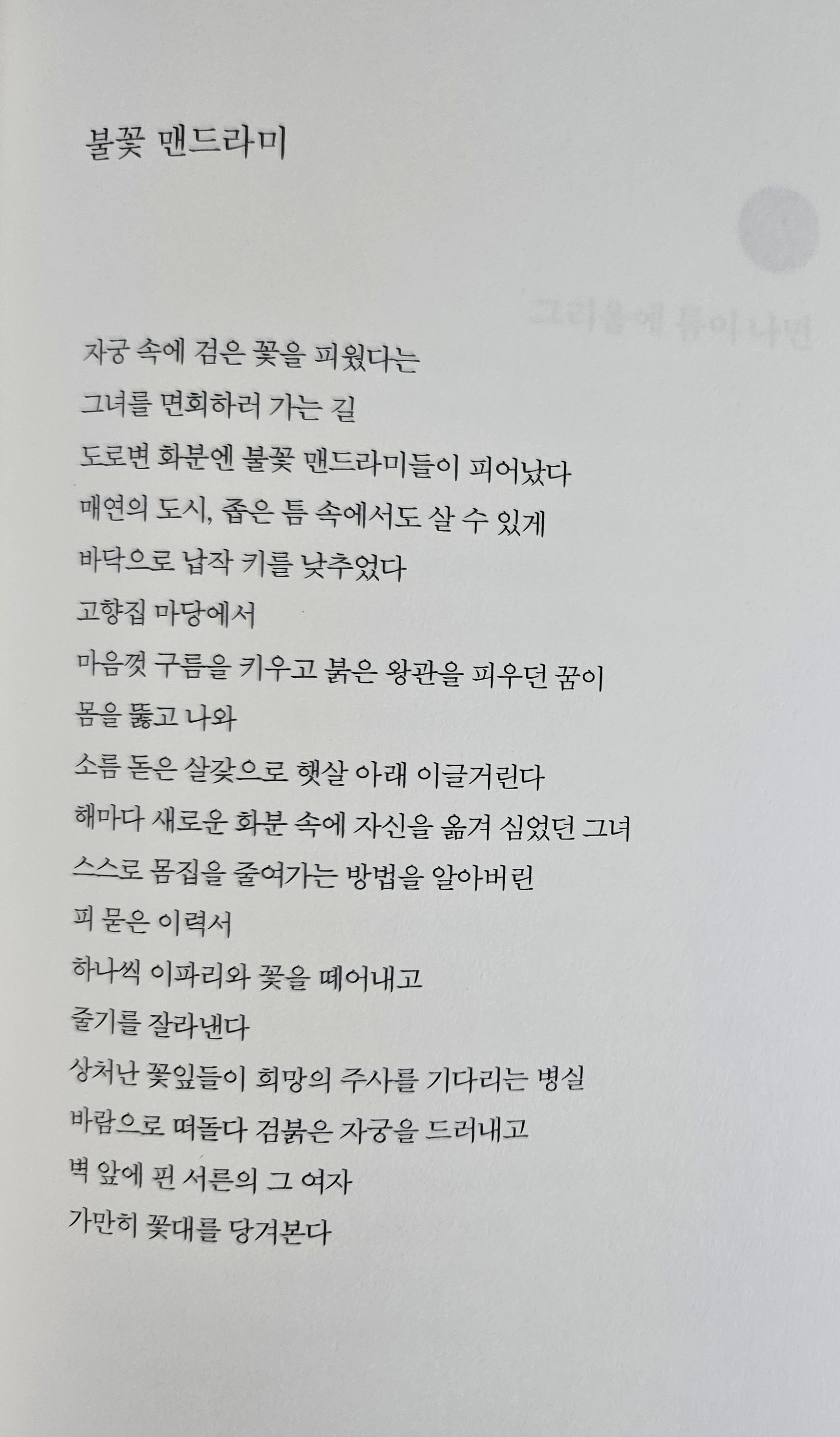

유정남
뭍으로 건너온 바다는 폭염 속에 몸을 맡기고 화두를 건진다 갯벌의 수로를 지나올 때는 젊은 날의 부유물들이 등짐처럼 따라왔다 방향도 모른 채 심해를 유영하다 찢어진 지느러미들, 바람을 다그치던 파도의 높이를 잠재우느라 밤이면 신열을 앓기도 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느라 뼈를 드러낸 어깨의 늙은 염부가 구릿빛 땀방울을 떨군다 수평으로만 이어지는 염전에는 한 뼘의 그늘도 햇볕에 녹고, 쓰라린 언어의 자모들도 갯바람에 묻어 하나씩 증발되어간다 별꽃 뜨고 지는 몇 생을 지나 수면의 흔들림이 모두 사라지면 끝없이 나를 비워내 온 시간의 결정들, 하얗게 풍화된 뼈로 눈물꽃이 되리라 거울 속에 눈부시게 정제된 별들을 쓸어모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카츄를 뽑다
불 꺼진 도서관을 나와
버스정류장을 지나면 인형들의 방이 나를 기다린다
스펙의 의자에 묶여
굳어가던 뼈들이 말랑거리고
온종일 활자에 시달린 눈빛마저 흔들리면
꾸깃꾸깃했던 하루를 펴서 기계 속으로 밀어넣는다
간신히 잡혔다가도 허무하게 떨어지던
백 장의 이력서를 돌아다보면
어린 날의 한 조각 꿈이 만져져
오늘은 활짝 웃고 있는 피카츄를 선택한다
내 이십 대는 아래로만 떨어지게 조작된 인형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
천 원짜리 몇 장이면
닿을 수 있는 오래된 추억을 뽑는다
등을 긁어주고
밀치고 놓쳤다가 집어올리는 시간이
캄캄한 책가방을 올리는 밤
잃어버린 단어를 찾은 듯
튀어나오는 너를 끌어안을 때
백만 볼트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을 만난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유리상자 속에 갇혀버린 인형은
나의 뒷모습
나는 지폐 한 장 들고 매일 나를 구출하러 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신 불량 지역에서
수시로 별의 주파수를 놓치는
이 마을은 수신 불량 지역
장밋빛으로 끓는 리모컨의 기도에도
그는 오늘 밤 켜지지 않는다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초고층 아파트 숲까지 자신을 끌고 오느라
떨림도 울림도 놓아버린
한 마리의 검은 짐승
가늘어진 발목으로
사각형의 어둠을 받치고 잠들어 있다
뜨거워지지 않는 빨간 배꼽은
세상에 맞출 수 없었던 채널의 또 다른 언어일까
그녀의 달뜬 손가락에 응답하지 않는다
클라이맥스마다 지지직대던
파동을 잡지 못한 드라마의 시간이
콘크리트 사막으로 흘러와 전파를 방해하는 밤에
돌아누운 브라운관 한 점 온기에 닿아 있을
외계를 향한
그녀의 달빛 타전은 계속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편의점의 달
편의점에 달이 뜬다
밤의 뚜껑을 따고 나온 번데기들이 간이테이블에 앉아 별을 마신다
컵라면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주면
굳은 혀들이 깨어나 풀어놓은 매콤한 언어들
풀어진 넥타이 하나 보름달로 행운의 즉석복권을 긁는다
구름으로 채워진 함량 미달의 과자 봉지들은
팽팽히 헛바람으로 부풀어 있다
차갑게 식은 유리병들의 마개를 따거나
삼각형을 베어먹으면 동그라미가 될 거라 했지만
조각난 아이들은 달빛 우유나 몇 갑의 담배를 훔쳐 달아났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찍힌 바코드를 지울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는 천직이 되었다
김밥들은 자정을 기다려
어제라는 유통기한을 지우고 폐기된 하루를 위장에 채워주곤 했다
어느 날 사막으로 걸어간 아버지는
불 꺼진 도시의 별을 지키는 편의점이 되었지
가시뿐인 손목에 걸린 시계가 늘 가리키던 25시
낙타의 밤은
지독한 모래바람이 불었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뚫고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 오실까
고치를 열고 나온 나방들은
어둠이 묻은 초콜릿 하나씩 입 안에 녹이며 제 갈 길로 떠나고
진열대 위의 얼굴이 멀고 먼 아침을 기다린다
골목엔 둥근 피자가 떠오르고
길 잃은 고양이들만 차가운 달빛 조각을 뜯어먹는 밤
편의점은 잠들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카톡새
하루 내내 새가 운디
눈물 마른 세상에서 새는 먼저 울음을 내밀었다
스마트폰 뒤편, 외로움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제 새는 애완견보다 흔한 반려동물이 되었다
한 마리를 새장에 넣었는데
백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는 침실의 밤이 오기도 한다
새는 눈 깜찍할 새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소금기 묻은 집게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누구든 새를 간단히 끌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초대 손님은
새 울음을 알약처럼 삼키며 자신을 죽인다
새가 오지 않는 날엔
혹시 새가 죽었나 종일 새장을 만지작거린다
깃털 찾아 빈 방을 들락거린다
새를 십 년째 읽지 못한 노인은
한두 마디 단어마저 버리고 우울새가 되었다
이 골목 저 골목 새똥을 주우러 다녔지만
새의 얼굴 볼 수 없었다
금 간 둥지에 수북한 새 뼈를 만져보는 밤
아무도 보지 못한 노인의 환한 부리가 열린다
까오톡
까오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정남 시인은 먼저 기억이 환기하는 청춘시절의 좌절과 상처를 시인 특유의 은유적 상상력과 정밀한 언어로 형상화한다. 꿈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 상처 깊은 풍경에 꿈의 지향점인 별을 띄워, 인간의 삶이 결코 잊혀진 꿈이 되지 않게 혼신의 언어를 바친다.
별은 그가 창조한 시 정신이며 꿈의 지향점이다. 궁핍한 시절에서 풍요의 시대를 거쳐오는 사이, 시인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인위적 일변도의 문명과 욕망의 틈바구니에서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시인은 현대의 문명이 저지르는 생명 파괴의 직각적이고 직선적인 속도의 사고를 거부하며, 자연적 생명의 원리인 곡선과 둥긂과 느림의 사상을 완곡히 표방한다. 위태로운 직선적 고속적 사고에 대한 응전으로서 예술 혹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에술가들의 부드럽고 느린 곡선적 사고와 둥긂의 미학을 생존 현실의 지표로 내민다. 그리고 기다림과 결정체적 삶의 곡선적 사유를 소금의 정제과정에서 통찰하고, 그의 복합적 은유의 표현미학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의 어둡고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향한 별과 소금의 시학이라는 결정체로 완결됨을 보여준다.
-조명제 시인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