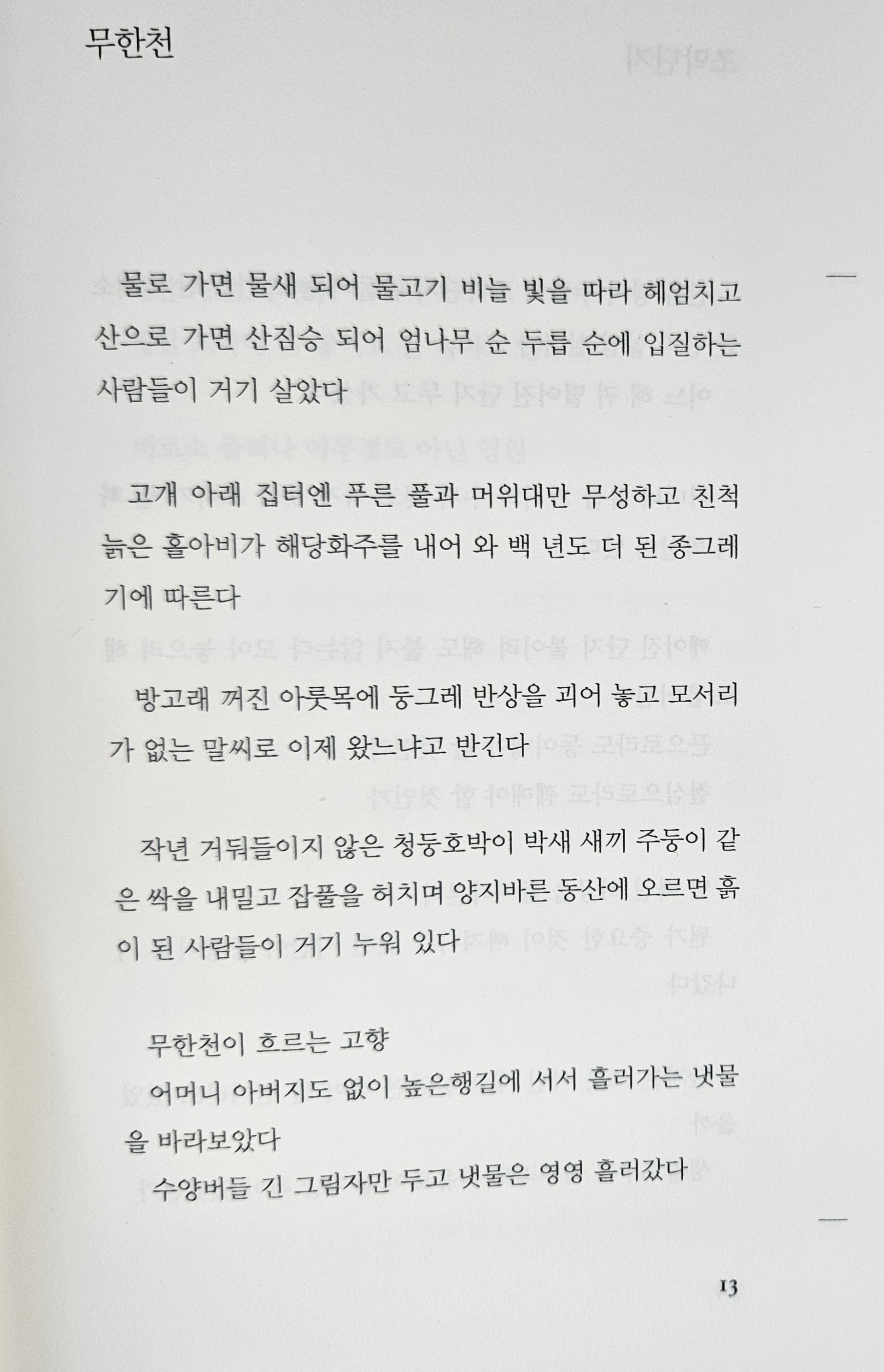히말라야 소금
이 잠
청정이란 말은 조만간 국어사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바다가 오염되었으니 생선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생선만 그런가 내가 나를 더럽힌 날들은 또 얼마인가
인터넷을 뒤져 히말라야 소금을 주문해 놨다
아주 오래전 바다 밑바닥이 솟아올라 산맥이 되고
그때부터 바닷물이 버릴 거 다 버리고 히말라야에 남긴 돌덩이
산을 헐어 국을 끓여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손안에서 차돌처럼 반짝인다
흠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돌을 씹어 먹는다
청정하다는 히말라야 산을 입에 물고 녹인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심심해진 소금 바위 굴러 내려
내 부끄럼들, 사무침들 올올이 녹아내려
창해만리 바닷물로 출렁일 때까지
두 번째 살아 보는 것처럼 한 번을 사는 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끝없는
장미나무 옆에 앉아 새벽을 기다린다
장미꽃 봉오리를 센다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잡을 수도 없고 되풀이될 수도 없게
모든 것은 날아가 버렸다
현관문 열면 바로 길거리인 집들
길보다 낮은 방에서 삼 년
자국도 남지 않는 슬픔이
바닥을 밀고 지나갔다
어디서 개가 몸 터는 소리 들린다
곧 그쳤다 환청인가
환청 같은 푸른 밤길
장미나무 옆에 앉아 꽃봉오리를 세며
꼭지 떨어진 봉오리처럼
새벽안개처럼
세상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고립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주먼지
세상 몹쓸 먼지가 둥글어 다니다 뭉쳐져서
여자 몸뚱이가 되었다는
어머니 말씀은 서럽기도 했지
이왕이면 고운 꽃이파리나 귀한 보석이
보태져서 만들어졌다고 말해 주면 좋으련만
생리통으로 쩔쩔매는 나에게
허리를 자근자근 밟아주며 하신 말씀은
더욱 서러워 엎어져 울게 했지
진흙 반죽도 아니고 몹쓸 먼지라니
그러다 지구과학 시간에
가스와 먼지가 뭉쳐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웠다
캄캄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수백 억 년 전 먼지들이 별 가루처럼 빛났다
이왕이면 그중에 쓸모없는
먼지가 뭉쳐져서 여자가 되었다면
더욱 마음에 드는 말이다
곰이 어두운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참았더니 여자가 되었다는 말보다
혁명적인 말이다
혁명은 말보다
밀어붙이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이, 미트
맥 빠질 땐 먹으려 간다
하이, 미트
몇 분이세요?
혼자요
달궈진 무쇠 주물판 위에
안창살 토시살 갈빗살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한 점씩 부챗살 펼치듯 늘어놓는다
무한 리필!
싸구려 힘이라도 받아야 살 것만 같다
기름 타는 연기를 헤치며
따끔거리는 눈알을 비비며
화투 패 잦히듯 고기를 뒤집는다
혼자 치는 화투
지거나 이기거나 잃을 것 없는
심심한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우걱우걱 씹어 삼킨다
장차 너는 배짱 두둑하게 살아가거라
차디찬 동치미 국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장차 너는 뒷심으로 천하장사가 되거라
잔칫상에 끼어 낯선 사람처럼
성성한 눈물과 허기를 감추고
오오래 견디기 위해
하이, 미트!
땡볕 속을 걸어서 폭설을 뚫고서
무한 리필!
힘 받으러 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늦게 오는 사람
오 촉 짜리 전구 같은 사람을 만나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사랑을 하고 싶다
말없이 마주 앉아 쪽파를 다듬다 허리 펴고 일어나
절여 놓은 배추 뒤집으러 갔다 오는 사랑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순한 사람을 만나
모양도 뿌리도 없이 물드는 사랑을 하고 싶다
어디 있다 이제 왔냐고 손목 잡아끌어
부평초 흐르는 몸 주저앉히는 이별 없는 사랑
어리숙한 사람끼리 어깨 기대어 졸다 깨다
가물가물 밤새 켜도 닳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
내가 누군지도 까먹고 삶과 죽음도 잊고
처음도 끝도 없어 더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
오 촉 짜리 전구 같은 사람을 만나
뜨거워서 데일 일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
살아온 날들 하도 추워서 눈물로 쏟으려 할 때
더듬더듬 온기로 뎁혀 주는 사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잠 시인의 이번 시집은 헨리 밀러의 "쓰면서 나는 독을 빼내고 있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십 년 전 그는 속수무책 절망 속에서 세상과 유리된 채 몸과 마음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를 찌르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두 번째 시집에서 비애와 분노를 자기 것으로 체화하면서 상처 입음에서 온전함으로의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시적 삶이 문득 내적 성찰로 전환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굳이 묻고 싶지 않다.
"누가 나뭇가지에서 기어 다니는 유충에게 장래의 먹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땅바닥에 놓인 고치 속 유충이 여린 껍데기를 깨뜨리는 걸 도울 수 있겠습니까? 때가 오면 저 스스로 밀고 나와서 날개 치면 서둘러 장미의 품 안으로 가지요"[괴테, 치유와 화해의 시]
시인에게 있어 시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존재론적 자기 성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인의 근거이며, 상처에 대해 뒤늦게 조문하는 마음의 발견일 것이다.
-고영민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