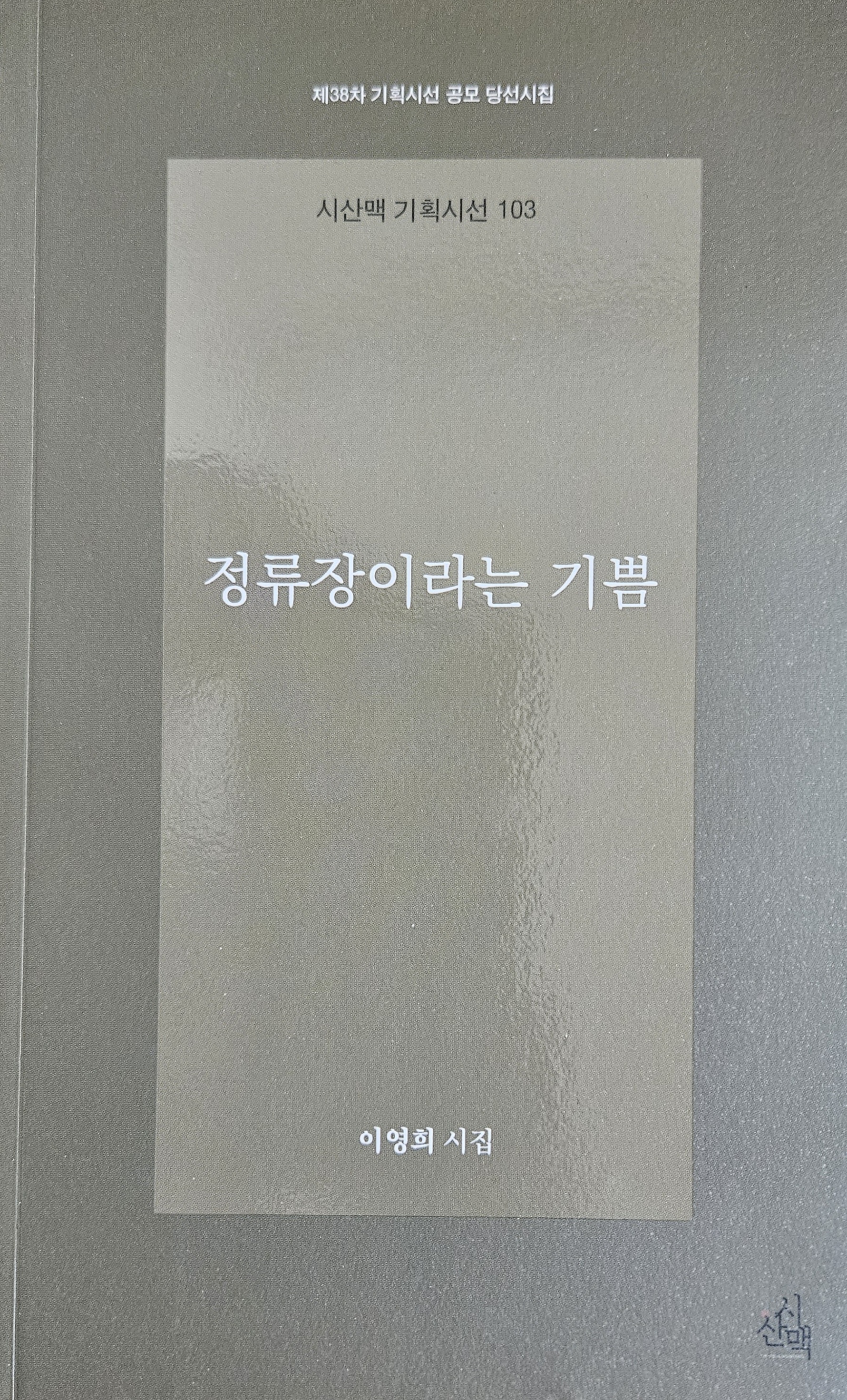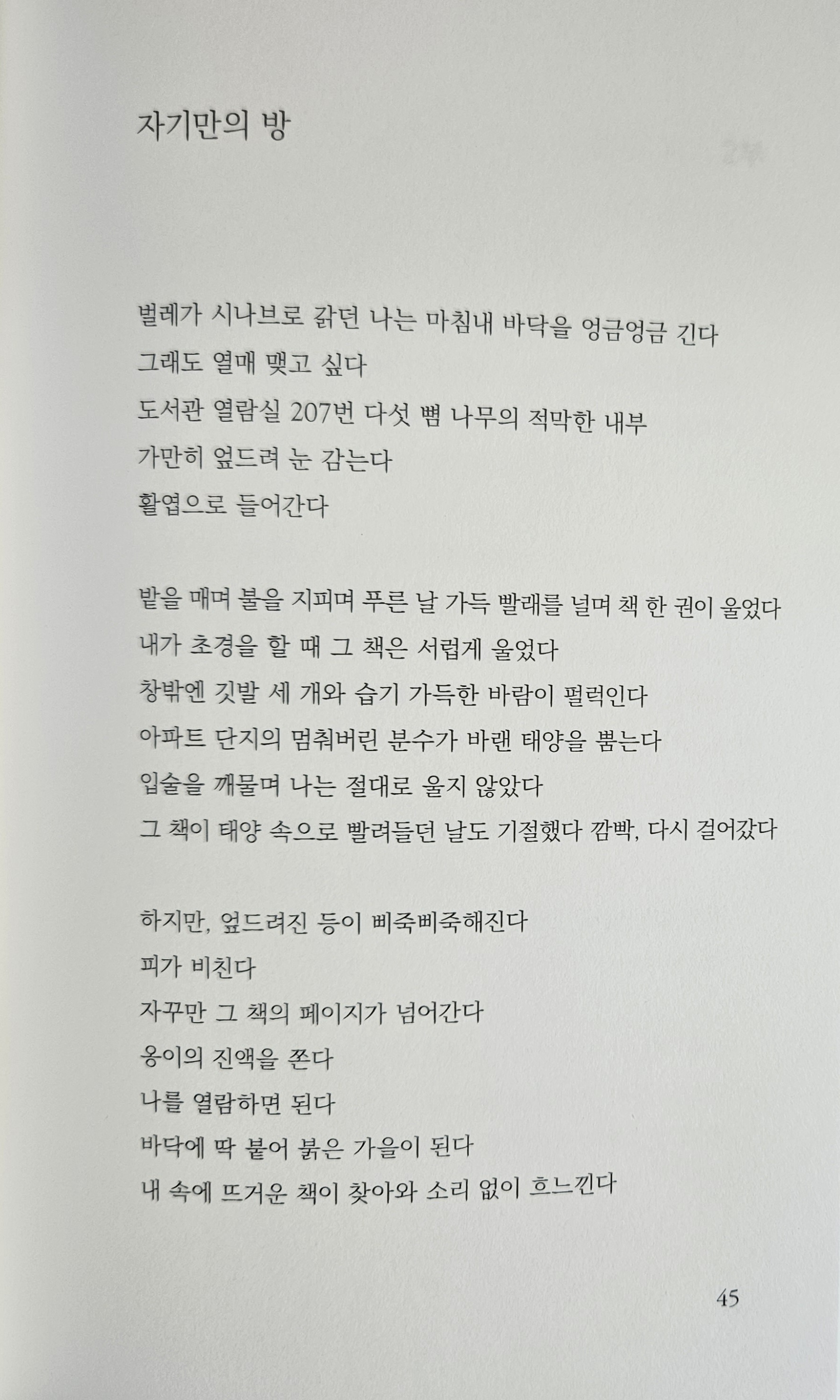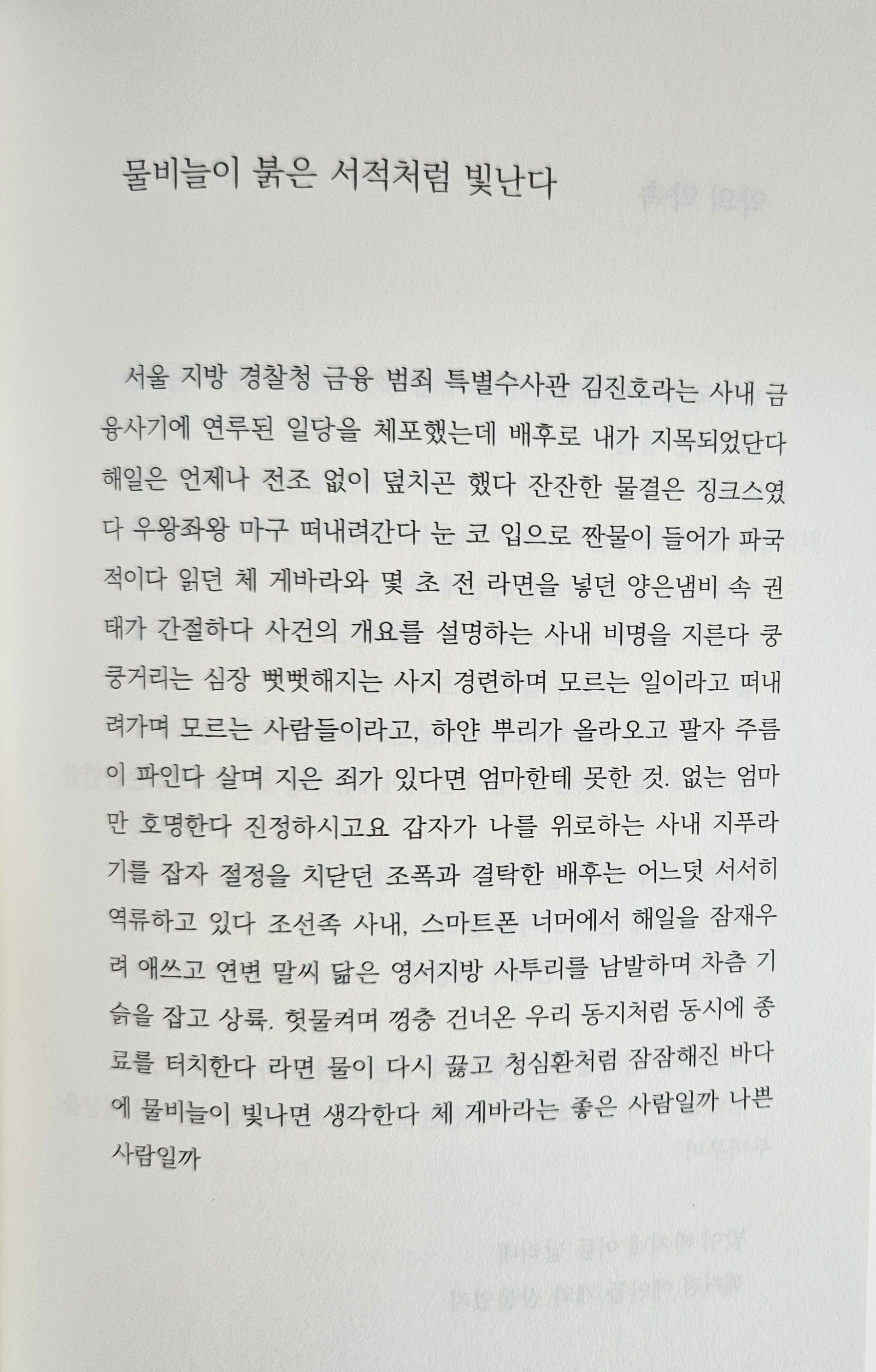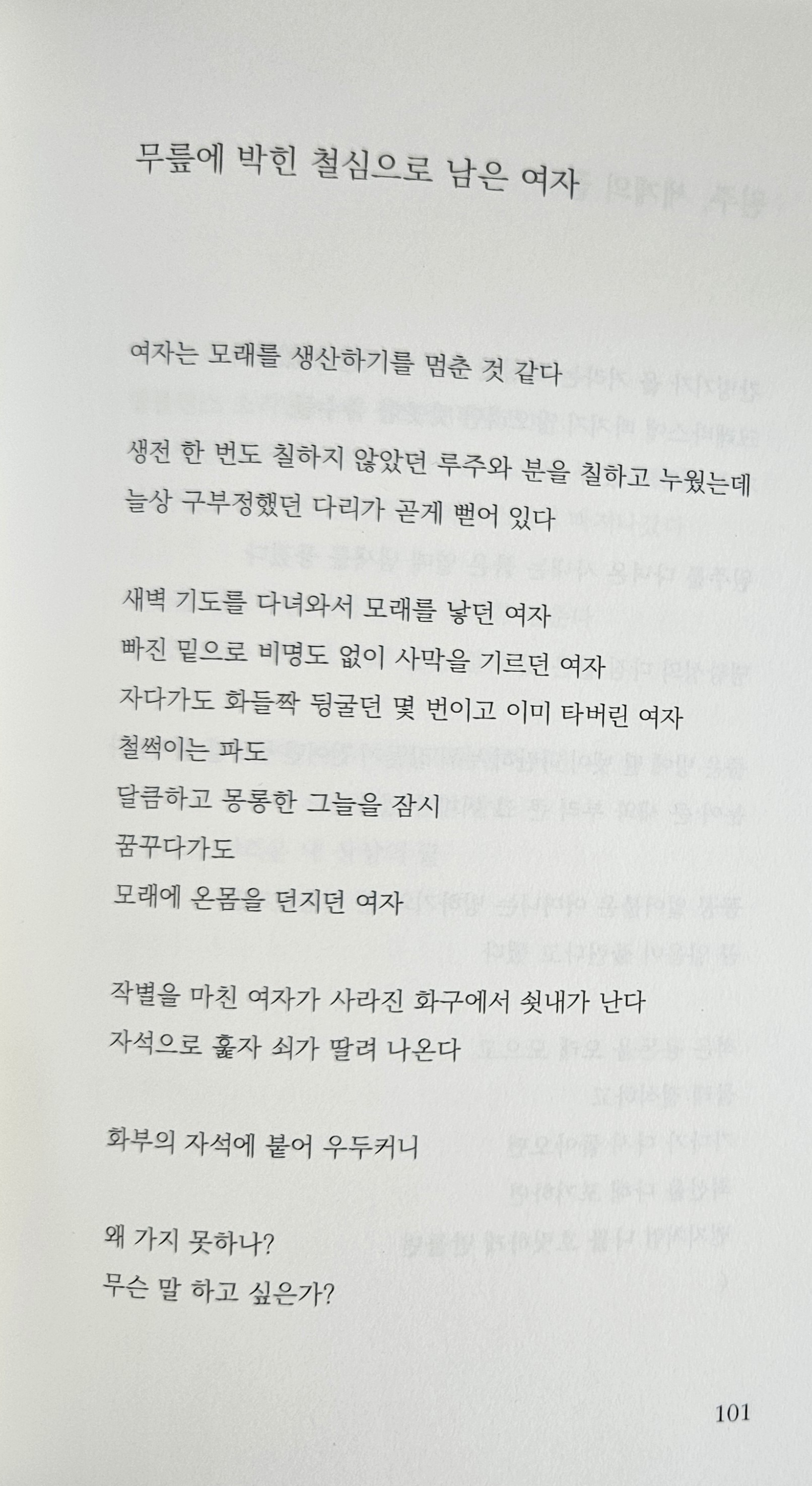싱클레어&데미안
이영희
물을 껴안은 사내, 무릎을 접고 비스듬히 기댄다
하늘은 레드향을 터뜨린다
밀리는 퇴근길이
연어 알처럼 붉다
가로등이 자신을 켜면
저녁이라 부른다
부르던 나무의 긴 목소리 굴뚝같은 손짓
알처럼 해거름은 깨어날 거라 속삭여주곤 했다
오동나무 요람에 누우면
물관 가득한 속삭임
희붐한 시절이었다
찢겨 사포질 당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이름을
영원처럼 불렀다
벤치의 노숙은 소년을 향한 기다림이었다
종일 하류를 뒤지던 소년 환청을 헤매며
저녁이란 저녁을 샅샅이 뒤져
벤치를 찾아
바닥을 쪼며 갈퀴를 저으며
목이 길어지고 무릎 밑이 검어지더니 우아한 먹이 낚아채게 되었다
부리에서 팔딱이는 은빛 찰나는 슬프도록 아름다웠으며
지금은 산란의 시간
사내가 흘리는 물에 흘러 벤치는 숲을 다녀올 수 있다
스스로에 기대 가로등이 켜지면
저녁이라 부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류장이라는 기쁨
당신은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목련을 기다리며 소년처럼 저녁을 기다리며 노을처럼 숨소리 기다리며 그네처럼
두 손 모은다
커브를 돌아 버린 버스를 기다리고 어린 미라가 깨어나길 기다려
그의 부족이 다시 돌아오기를
당신의 뿌리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당신은 구름을 기다린다
언젠가 당신을 감싸리라고
때가 되면
당신이라는 구름이 잠식한 여기, 지금과는 다를 거라며
몹시 바람 부는 날이면
기다림이라는 각성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연을 끊으며
보내는 익숙함에
느리고 무던한 당신이 운다
더듬으며 오래 서성인다
물끄러미 지나가는 것에 사로잡히고
반드시 오리라고
희미한 낮달 밑에서
간절함에 복무한다
몇 차례 소나기로 바짓가랑이를 적시고 갔다
당신이 기다리던 구름은
바닥을 보라 해도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은 여전히 높이 본다
시들었는데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목련을 기다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분홍 사막
천 원을 넣으면 기계의 심장이 뛴다
팔이 움직인다 손가락을 편다 움켜잡는다 놓친다
인형을 뽑으려 한다
분홍 노을 속으로 걸어간 엄마
빠져나가기 위해 분홍을 할퀴며
자꾸 희박해지는 공기를 뽑는다
일당을 털린다
남자는 분홍 가방에 자신을 구겨 넣는다
사각의 분홍 속에 모래투성이 하루를 눕힌다
엄마의 가방이 되어 함께 걷는
남자는 애써 꿈꾸려 한다
젊음은 자주 충혈된다
밑천으로 쓰기에 젊음은 금세 바닥이 날 것이고
그것을 전부 쥐어짜면 미움이라는 또 다른 사랑이 남는다
엷은 피 차츰 선명해져 분홍이 된 인형처럼
얇은 스타킹 신고 젖가슴 부풀리면 분홍이 될까
손이 기계 안에서 부른다
남자의 심장이 구두 굽처럼 뛴다
숨을 쉬기 위해
남자는 심장을 기계에 넣는다
어둠이 걷힌 기계에 분홍이 켜지고
남자의 일당을 삼키고 남자를 삼킨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주, 세계의 끝
간빙기가 올 거라는 확실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으려던 빳빳한 촉수들
자주 원주에 갔다
원주를 다녀온 사내는 붉은 열매 냄새를 풍겼다
명왕성의 다짐 같은 곳
좁은 방에 딸 넷이 나란히 누워 잠들기 전이면 원주를 생각했다
눈이 큰 새와 부리 큰 그 어미가 있다는
꽁꽁 얼어붙은 어머니는 빙하기와 잘 어울렸지만
곧 얼음이 풀린다고 했다
적은 용돈을 오래 모으고
몰래 결석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 포기하던
먼지처럼 나를 흐릿하게 만들던
간병기가 도래하여
앰뷸런스 소리만 나면 집으로 뛰었으나
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스르르 녹아버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크레바스에서 빠져나갔다
그곳을 생각하면 아득해져서 걷기를 멈춘다
아직도 나는 원주에 가고 싶은 걸까
빳빳한 촉수들이 다투어 붉고 말랑해지던
언젠가는 이라며 사라진 명왕성 같은
그립고도 서러운 내 상상의 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화양연화
너 향해 꽃이 피지 새가 태어나지
원시림이 정령처럼 돌아와 노래는 노래하지
단풍 들 예정이지 색스럽게
네게로 뜨는 달과 별의 소용돌이 너를 위해 가다듬는내일
기대해, 지구는 네 중심으로 돌 거니까
바람 불지 않는 날도 꽃잎 흘날릴 거야 네가 거기 있으니까
보상 끝난 땅에 꽂힌 깃발처럼 붉어져서는 지켜낼 거야 네 아름다움
서툰 눈빛은 믿음의 가지
경계 위의 너를
너만은 알아봐야지
공공 도서관 앞에 꽂힌 깃발 세 개처럼
없는 뿌리를 내리게 될 테니
당간지주에 꽂혔던 축제처럼
모든 상징처럼 태연해지기
달리고 펄럭이면서
트랙 위에선 총소리처럼
흔들며 외치던 백골단도 두렵지 았던
화양연화처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빛의 이면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소멸의 운명을 저녁이라 부르는 시인이 있다. 그런데 시인 바라보는 이 저녁의 시간은 소멸에서 다시 생성을 기약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어서 마치 허물을 벗는 애벌레의 지난한 과정처럼 성숙의 시간을 담보한다
이영희 시아의 첫 시집 정류장이라는 기쁨은 생의 한가운뎃늘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숙명을 스으로 직관하고 있다.다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독하다는 말로는 식상하고 슬픔이라는 말노는 날개를 떠는 비상이 탈바쿰 직전의 발화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서 무척 견고한다.
-전혜수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