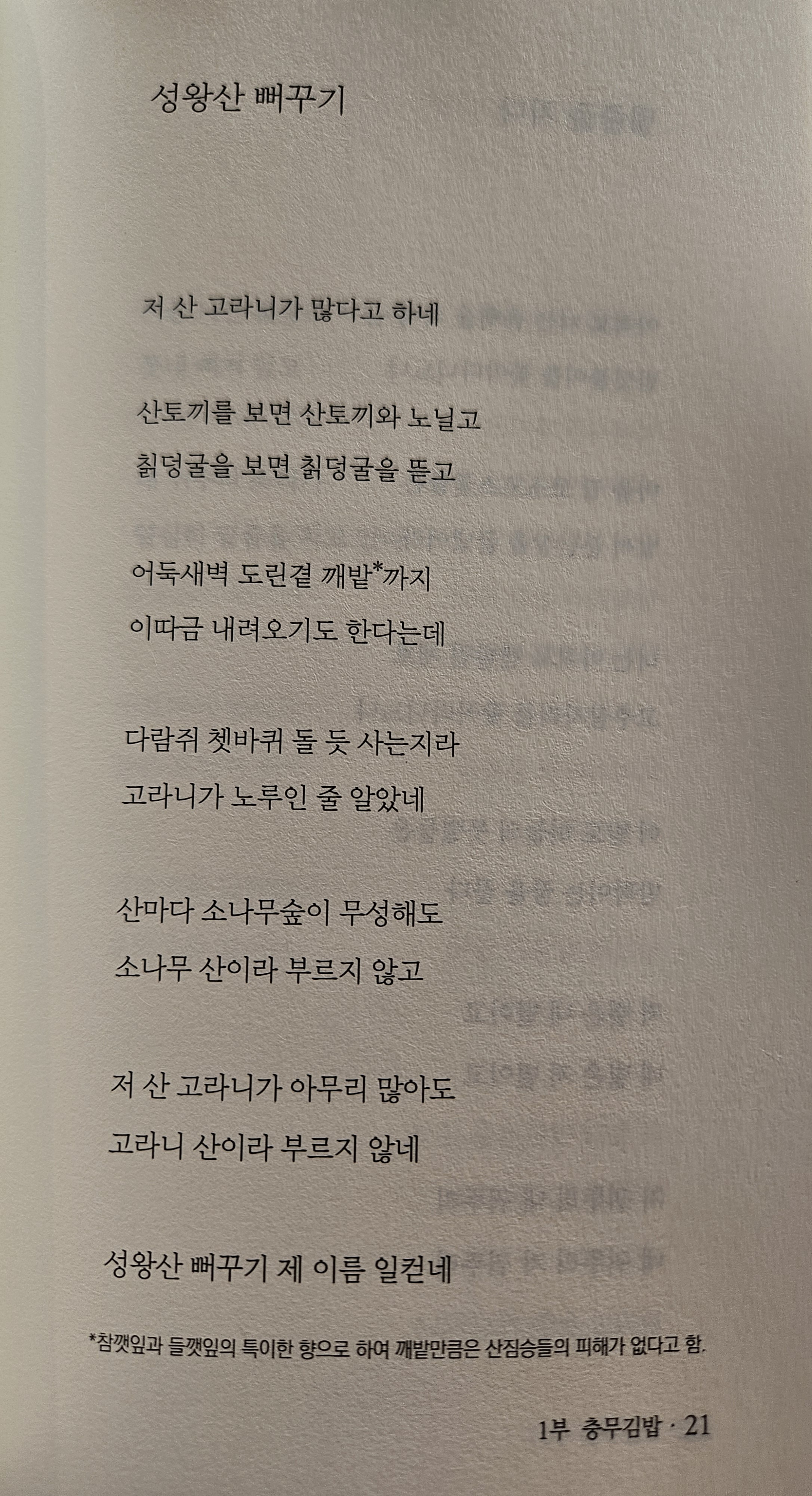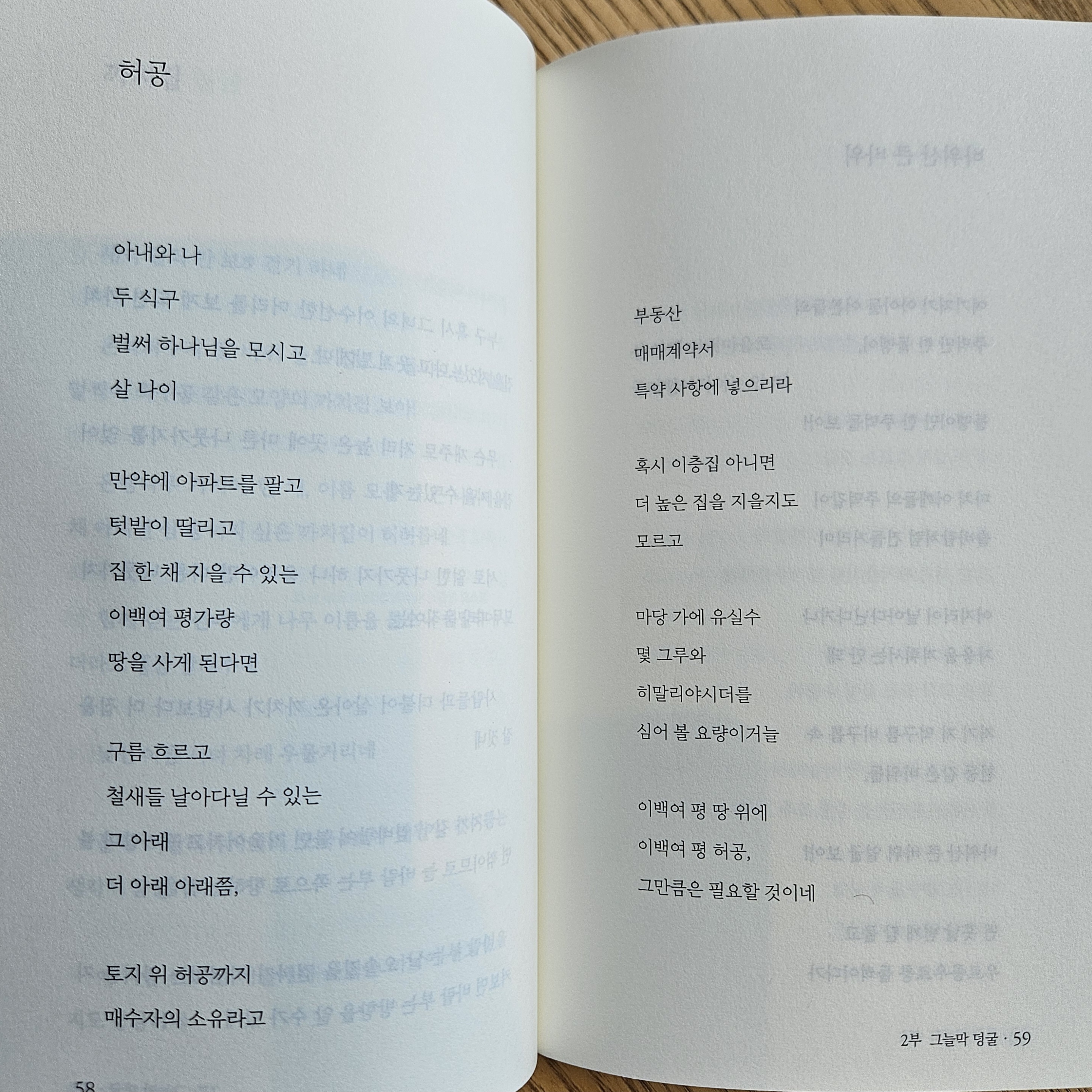밤나무
박만진
봄비가 오면 올수록
더워지는 게야
송이송이 풋 송이
푸른 가시 보아!
여기저기 밤나무,
밥 나무인 게야
밤벌레가 벌레면
밥벌레도 벌레야
생밤도 맛있고
군밤도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른 찐 밤,
가을비가 오면 올수록
추워지는 게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밑줄을 치다
아직도 너는 손뼉을 치며
반딧불이를 쫓아 다니느냐
마을 길 코스모스꽃들은
벌써 분단장을 끝냈어라
너는 아직도 맨발인 채로
고추잠자리를 쫓아다니느냐
이 밤도 하늘의 뭇별들은
반짝이는 꿈을 꾼다
저 별은 내 별이고
네 별은 저 별이고
저 귀뚜리 내 귀뚜리
네 귀뚜리 저 귀뚜리
지금 나는 윤동주 시집에
못내 빠져 있고
내 귀뚜리 소리가
열심히 밑줄을 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걷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은석저수지
한 바퀴 도는 데 8분
걸음 수 900보
물을 가둔 둑이
둑길이 되고
둑길이 오래전부터
둘레길이 된,
새벽녘 일여덟 명이
돌고 돌면서
시간과 걸음 수를
헤아려 본들 무엇하랴
수문 쪽 저수지 아래
들녘 푸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울음의 변천사
갓난아기였을 때 기억 전혀 없지만 응애응애 울어본 적 있었을 게야
코흘리개였을 때 기억 희미하기는 해도 앙앙 울어본 적 있는 듯싶어
학창 시절 기억 모람모람 새롭기는 하지만 엉엉 울어본 적 있었던 게야
시쳇말로 황소 같은 눈에서 닭의 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며 울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 울었던 게야
돌이켜보면 소설처럼 영화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인 듯싶어
아홉수인 예순아홉에 이르자 다시금 마음에서 몸으로 옮겨 울고,
언어 장애도 아니면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듣기만 하던 귀가 우는 게야
이명이 골치 아픈 병이라더니 깊은 밤이면 더 크게 우는 것 같아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내귀의 울음을 온전히 듣고 있는 게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후루룩 서정시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언어와 상상력을 통해 일상에 편재한 불모성을 치유하고 위안해주는 상상력을 품고 있는데, 박만진의 시가 그러한 하나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풍경과 시간을 충실하게 담으면서 뭇 생명의 모습을 매우 친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랜 기억을 되살리게끔 해준다.
아득한 기억과 사랑의 힘이 결속하면서 그러한 서정의 파문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