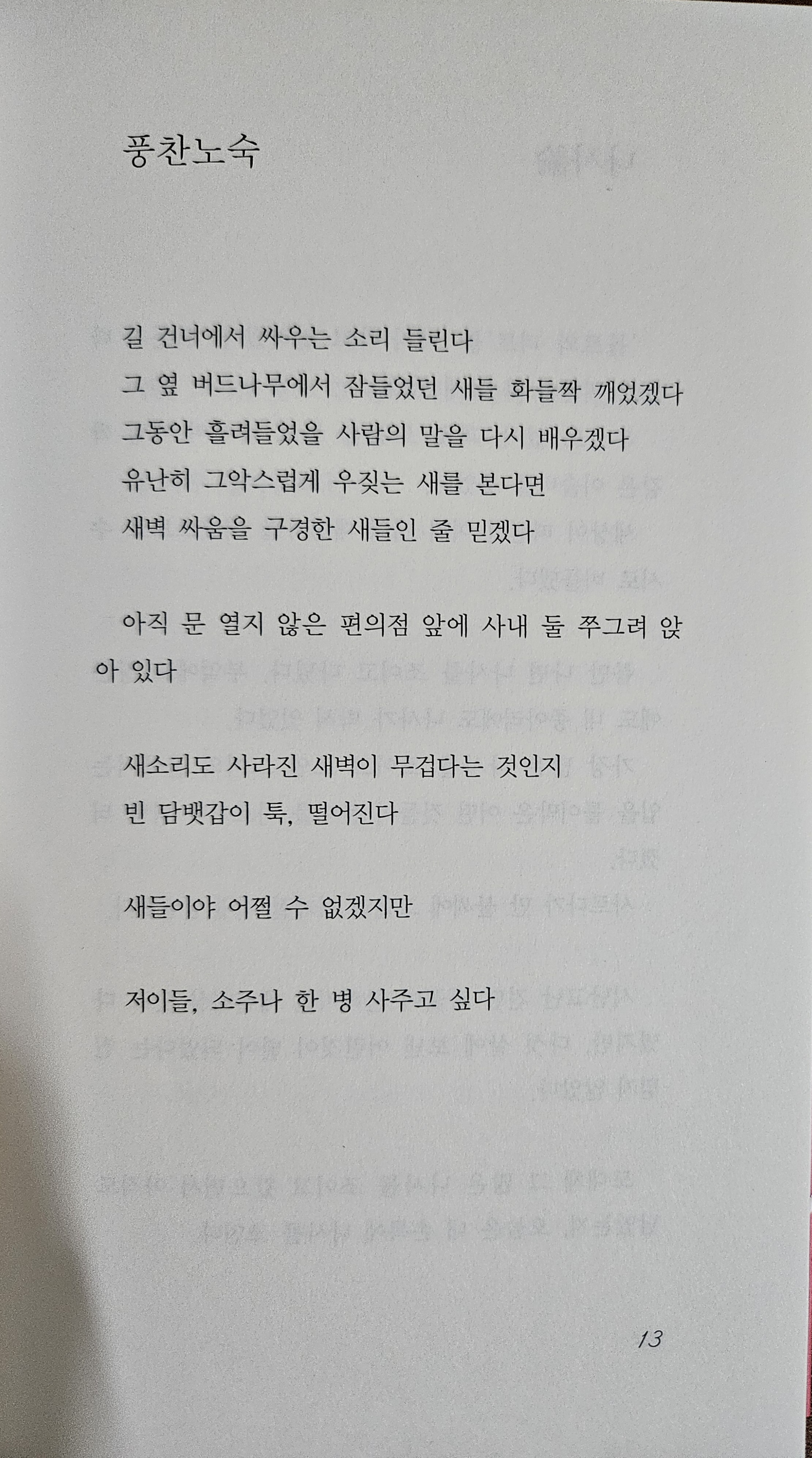나사論
박미라
'볼트와 너트'를 '나사'라고 일러줬다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알게 했다
우산도 없이, 과꽃 모종을 들고 나서며 메밀 싹 같은 이슬비를 웃었다
세상이 떠넘긴 여러 개의 대명사를 지녔으므로 수시로 비틀댔다
틈만 나면 나사를 조이고 다녔다 부엌에도 창문에도 내 종아리에도 나사가 박혀 있었다
가장 많은 나사를 조이고 조인 그이의 몸에서는
입을 틀어막은 어떤 것들이 불씨를 사르거나 탁탁 터졌다
사르다가 만 불씨에 그을려 사계절 내내 캄캄했다
시난고난 견딘 과꽃이 환해지면 배실배실 웃고 다녔지만, 다섯 살에 보낸 어린 것이 별이 되었다는 건 믿지 않았다
도대체 그 많은 나사를 조이고 갔으면서 아직도 남았는지, 오늘은 내 손목에 나사를 조인다
이런, 그이가 두고 간 손이 내 손목에 달려 있었다
왜 자꾸 헐거워지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짐승을 잠그다
연둣빛 새순이나 갉작거리는 실베짱이 같은 것들에게도
어금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이 삼아 어금니를 부드득 갈아보는 초식동물도 있을 테지만
저 으슥한 동굴 안쪽에 숨겨둔 어금니가
소리소문없이 먹혔다는데
출입구가 협소하여 원인 규명에 난색을 표하는 저이도
협조할 방법이 없는 나도
그저 입이나 헤벌리고 난감할 뿐인데
우물우물 씹어 삼키는 맛에 길드는 중이지만
그래도 모른 체할 수는 없어서
긁어내고, 파내고, 갈아 내어
속눈썹만 한 칼날 찾기에 성공했는데
그 위에 낯선 위장막을 덧입혀서
어금니였던 기억을 봉인한다는데
고작 순한 푸성귀 줄기에나 달려들던
저 비루한 짐승을 잠그고
세상 같은 건 꼭꼭 씹을 필요가 없다고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 제낄 건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이 가렵다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들을 이해한다
목을 꺾어도, 팔을 구부려도,
거기서 꼼짝 않지만
간혹 윗목 쪽으로 끌어올려지는
물기 빠진 땅 한 평
아주 가끔 그쪽에서 아는 척할 때나
닿지 않는 손을 뻗었지만
수만 평 애면글면 양귀비처럼 숨겨 키우면서
흥청망청 달빛을 퍼 쓰기도 했지만
저렇게 헐거워질 때까지
맨발로 뛰어가던 울울창창 곁에서
심지 않아도 피고 지던 것들을 적어두고
제가 꽃인 줄 아는 버섯의 영토가 있다
저 깎아지른 절벽도 등짐을 질 때는 벌판이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인은 비본래성이 은폐하는 모든 것을 탈은폐한다. 시인의 눈을 통하여 존재와 결핍과 궁핍이 드러난다. 비본래성이 진리를 은폐할 때, 시인은 아픈 것들의 목록을 들이대며 본래성을 궁구한다.
박미림 시인은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궁핍한 시대의 시인"(흴더린)이다. 그녀는 시대가 은폐하는 것들의 목록을 열거한다. 그녀는 거대 서사로 목청을 높이지도, 이념의 뜨거운 날로 세계를 겨누지도 않지만, 존재와 세계의 몸통에 줄줄이 뚫린 구멍들을 드러낸다. 자만으로 가득 찬 세계가 감추고 있는 무수한 흠집들이야말로 존재의 본래성을 구축하는 것들이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픈 것들의 집합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순간, 본래적으로 덜 떨어진(결핍된) 것들 사이의 소통과 이해와 사랑이 생겨난다.
-오민석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