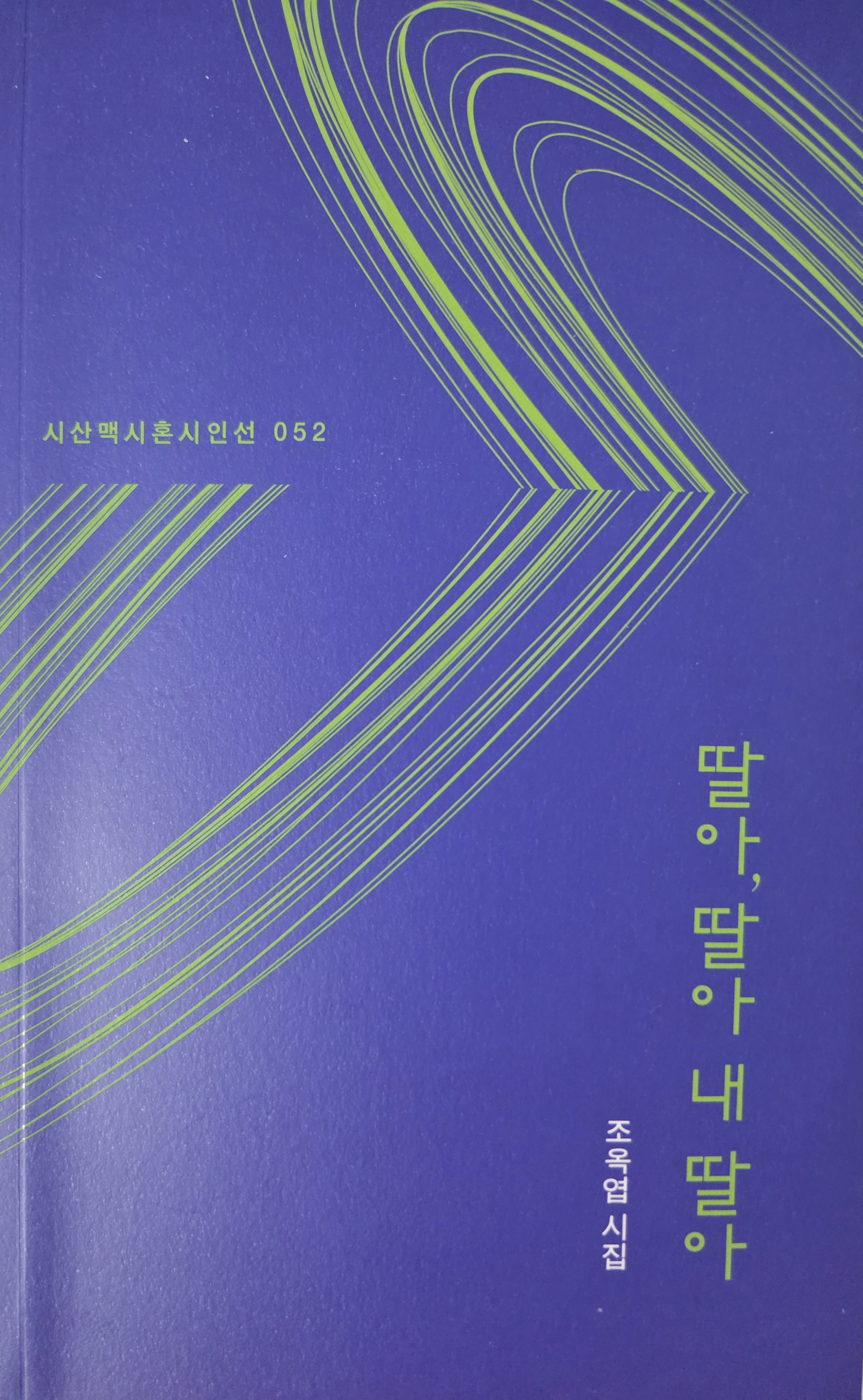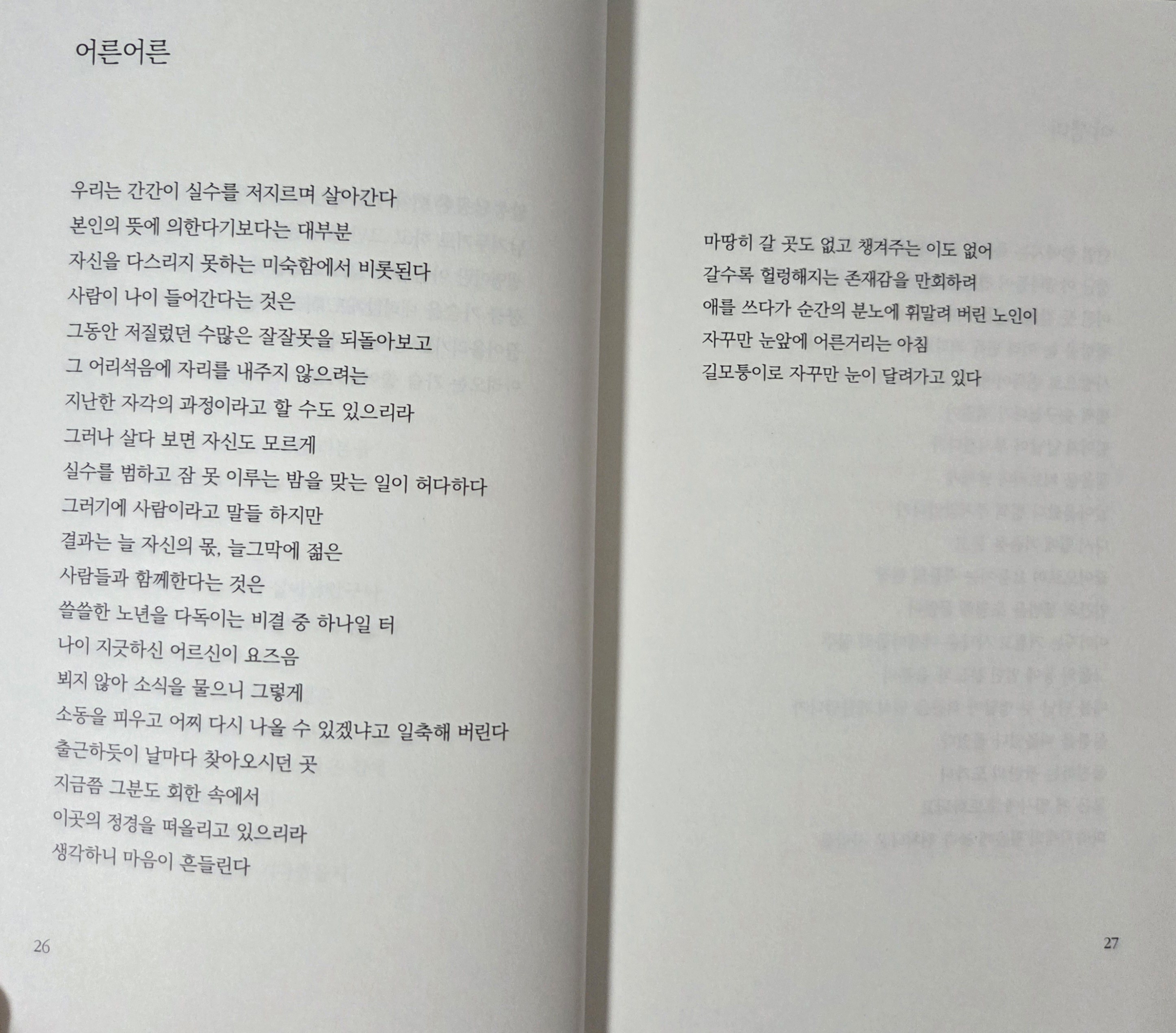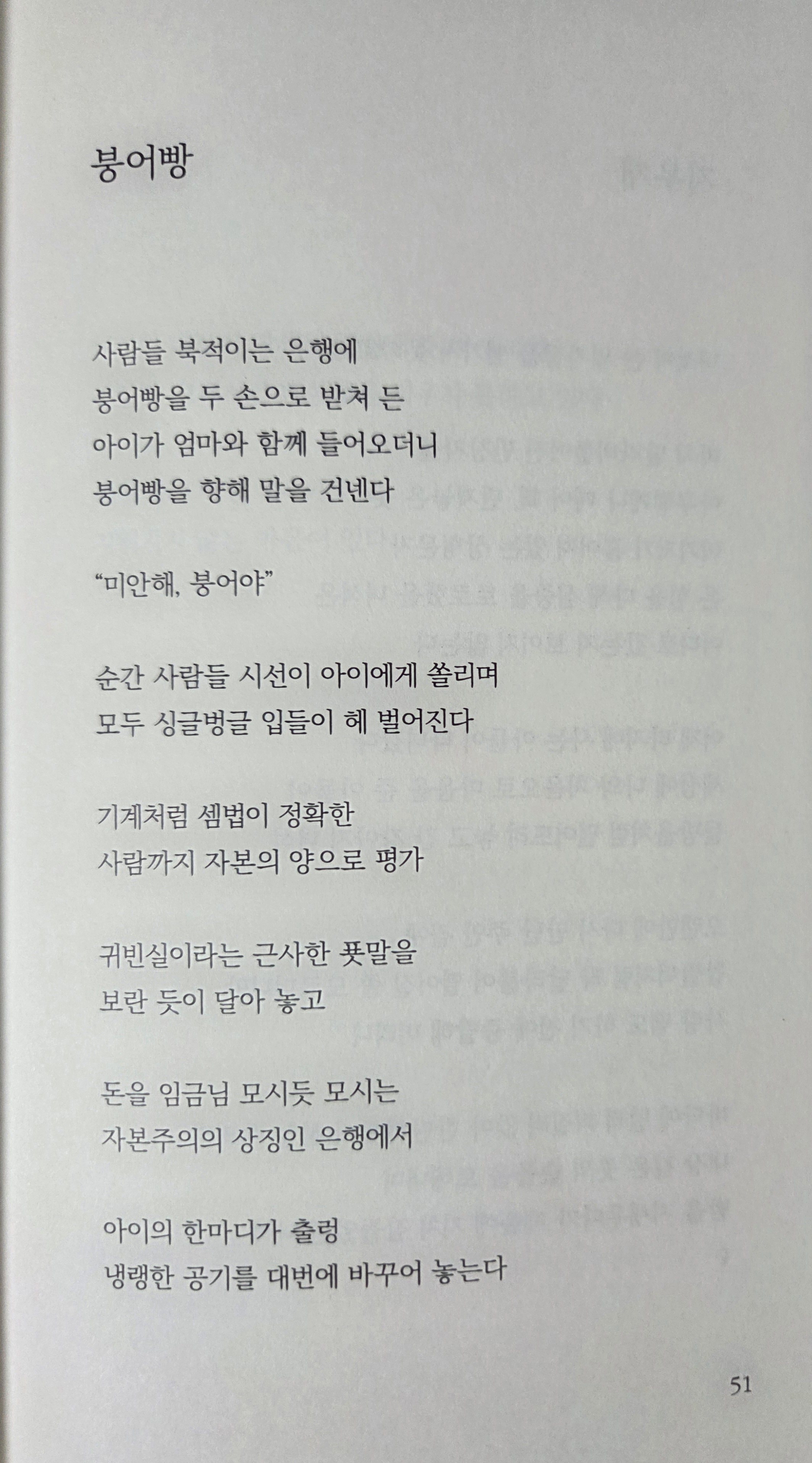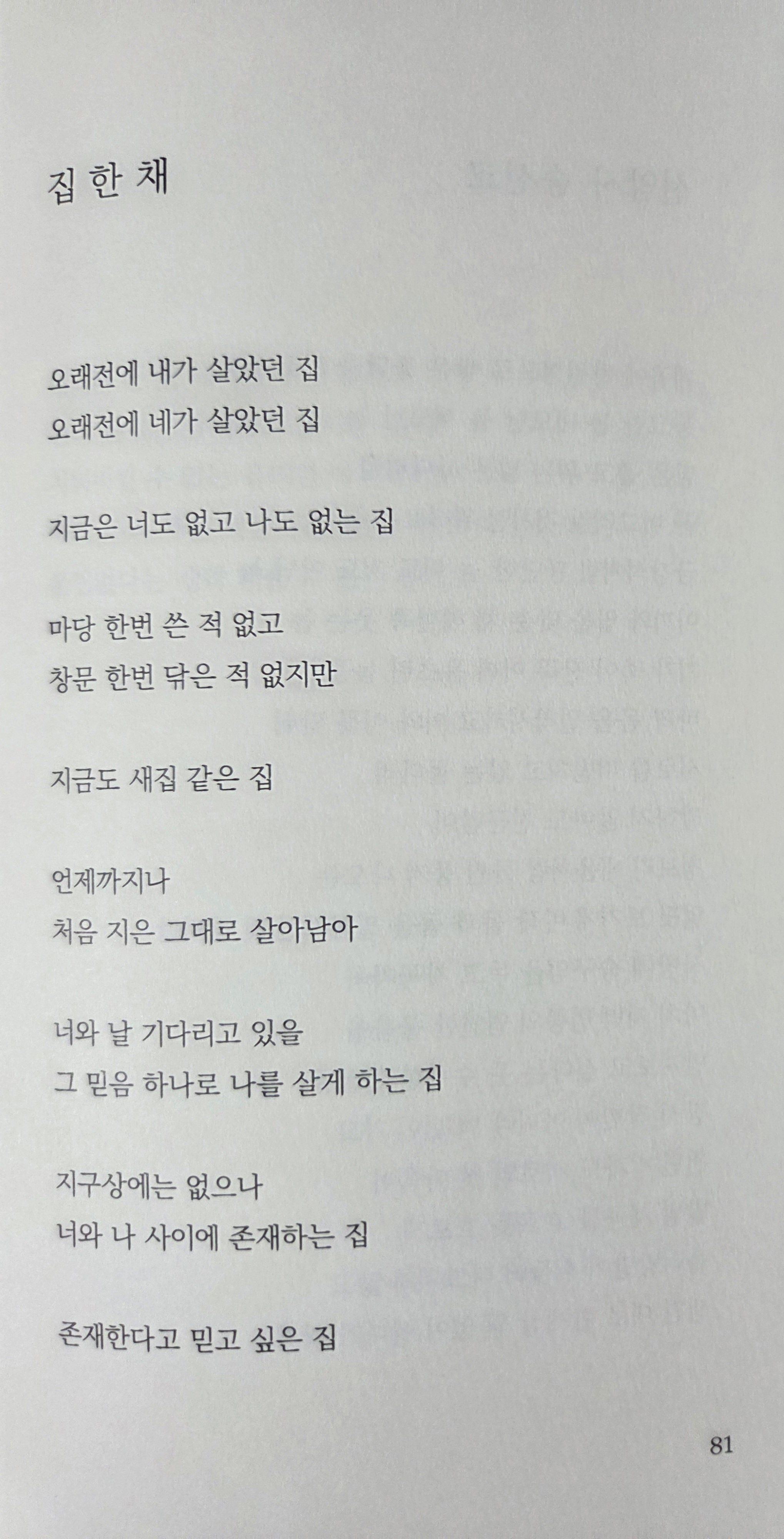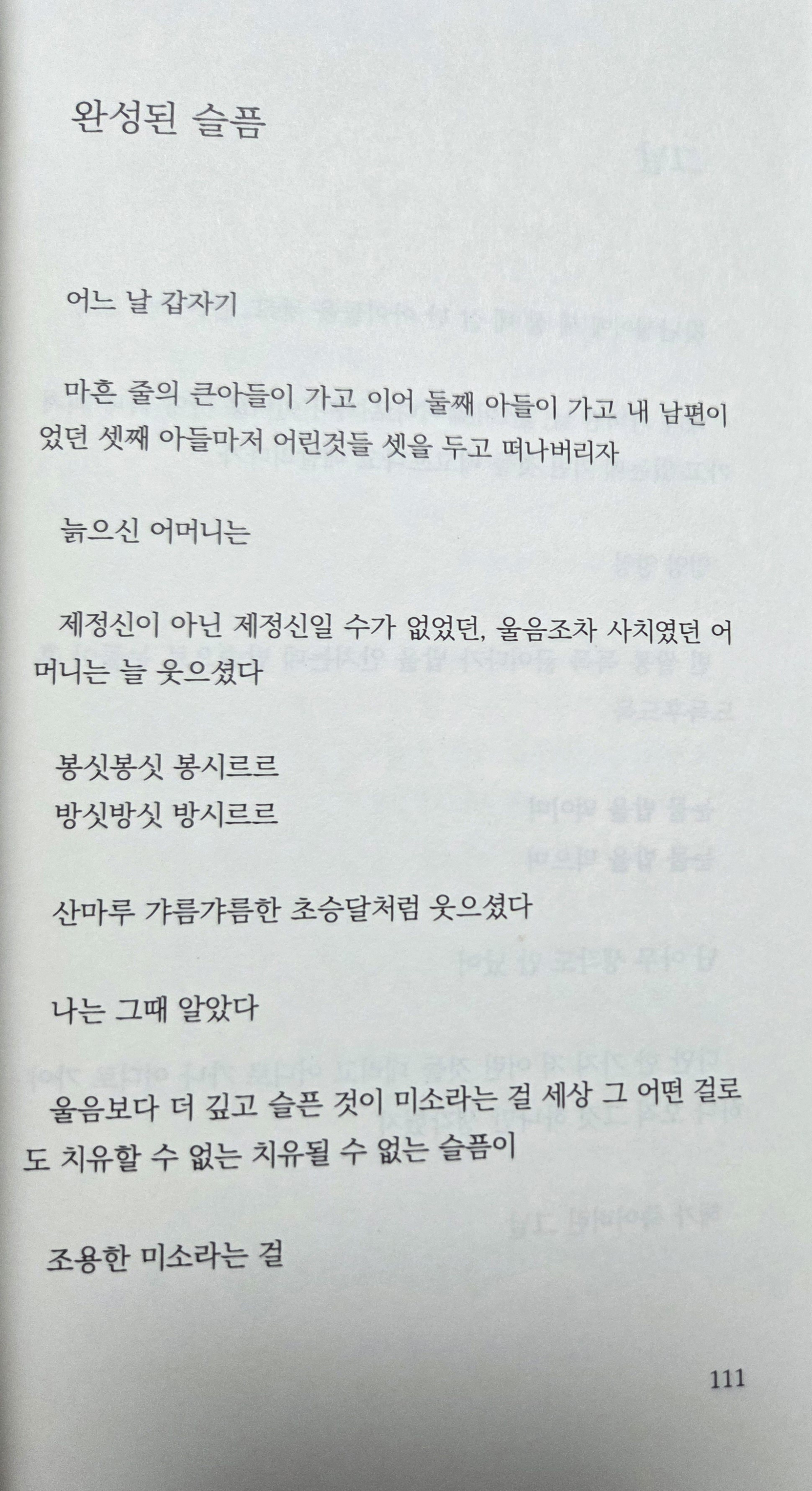딸아 딸아 내 딸아-조옥엽 시집
하얀 리본
조옥엽
수풀 수북한 곳에
누가 던져놓고 갔을까
리본만 남은 꽃다발 하나
무덤인지 풀빝인지 분간이
안 가는 사자의 집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치유 불가능한 상처처럼
무너져 가는 지붕 위의
피처럼 흐르는 붉은 흙
가버린 마음에 꽃다발 하나
던져놓고 쓰러져 울던 이는
어디로 갔을까
시간이 사람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
삭제할 수 없는 얼굴
가버린 이를 쳐내지 못한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
머물 곳 찾지 못해 헤매다가
던져놓은 슬픔 한 덩어리가
풀숲에 숨죽인 채 흐느끼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구름다리 양복점
구도심을 지나가는데
허름한 가게가 나를 붙든다
이름도 근사한 구름다리 양복점
빛바랜 간판과 깨진 유리창이
지나간 시절의 영락과 성쇠를
짐작게 하는데 뭉툭한 녹슨 자물통이
대화를 거부한 채 떡, 버티고 있다
저 문을 드나들던 이들이
한 때는 동네에서 잘 나가던
멋쟁이 신사들이었을 테고
주인장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을 맞고 배웅하며
신바람이나 콧노래 가락에
피로를 싣고 달렸을 것이다
무슨 완장처럼 귀에 볼펜을 걸치고
줄자를 도르르 풀었다 감았다
치수를 재고 마름질하며 흥겹고
바쁜 시간의 다리에 몸을 걸친 채
세월을 잊은 그의 새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앞태 뒤태를 비춰보며 무게를 잡던 신사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밀고 나올 듯한데
자물통은 결단을 내린 지 오래라며
맘 돌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딸아, 딸아 내 딸아
갓난재이에 세 살 네 살
어린 것들을 남기고 남편이 떠나버린 뒤 어미인 나를 도와 집안의 생계를 도맡아 온 큰딸이 언제부턴가 야근이에요 특근이에요 둘러대며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오는 걸 미심쩍어하면서도 믿자 믿어주자며 넘어가기 일쑤이던 어는 날
택시를 탔는데
뒷모습이 낯익어 어디선가 많이 본듯해 꽂혀 있다가 세상엔 닮은 사람이 더러더러 있느니, 어쩜 우리 큰딸을 저리도 닮았을꼬 혼자 중얼거리다가 말다가
목적지에 도착
뒷좌석을 돌아본 기사 얼굴, 모자로 마스크로 가렸으나 보이는 얼굴 숨겨지지 않은 숨길 수 없는 얼굴 아니 너, 너였구나, 내 딸이었구나
울컥 뜨거워지는 심장 녹아내리는 애간장
딸아, 딸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뜨거운 눈물 연달아 떨어지는 손을 거머쥐고 딸아, 딸아 내 딸아,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둘이 하나 되어 말을 잇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옥엽 시인의 시편들은 따뜻한 감동을 준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슬픔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시를 쓰기 힘들다.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승화했을 때 깊이가 생기고 감동을 줄 수 있다.
"정지된 듯한/흐름 속에 놓여 있는//무수한 생명들//영원히 머물 수 없기에//아름답고 슬픈//그리하여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리니"<시인의 말>이 문장보다 더 명징하게 시인의 감정을 터뜨려줄 수 없을 것 같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늘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집은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문정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