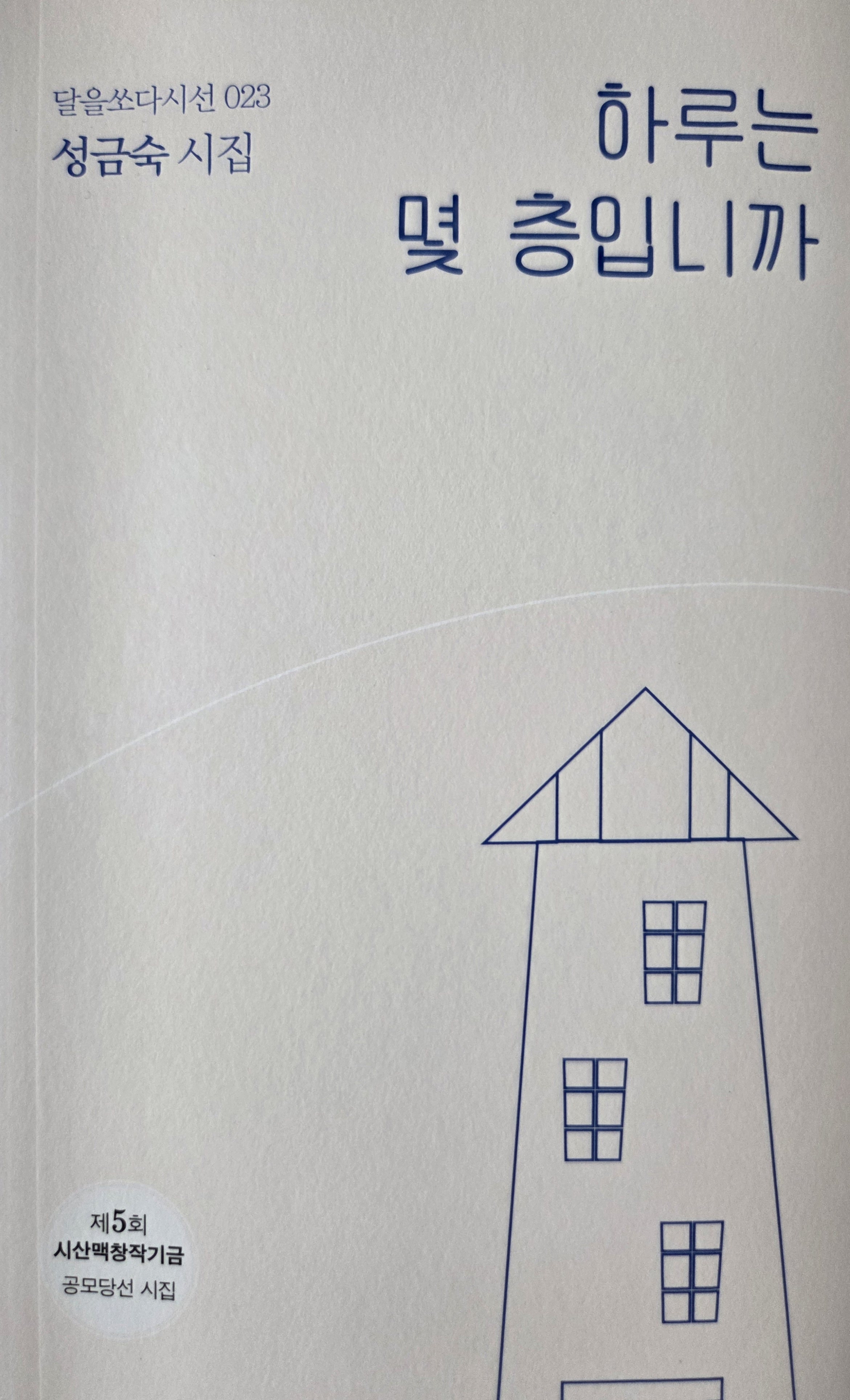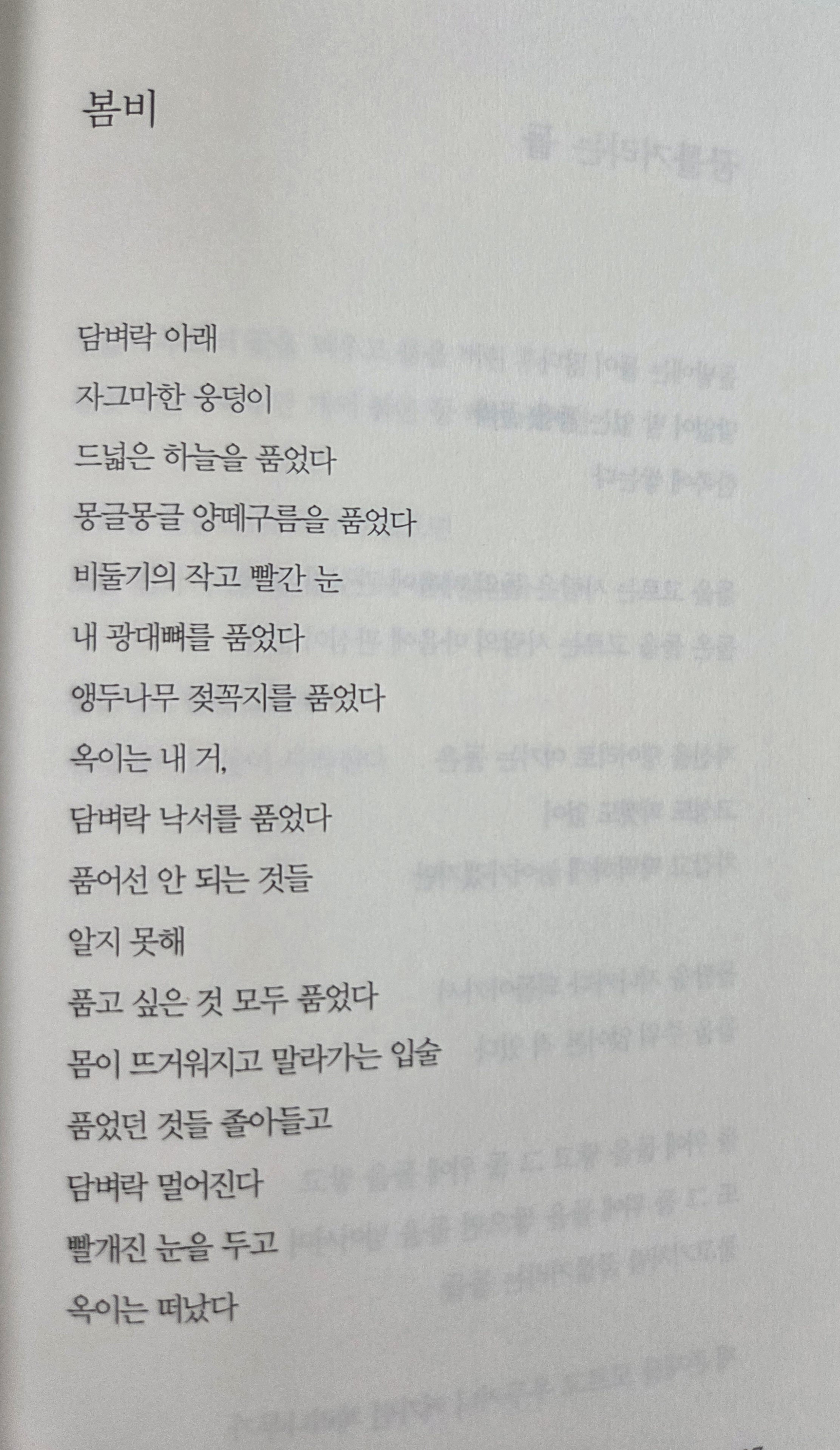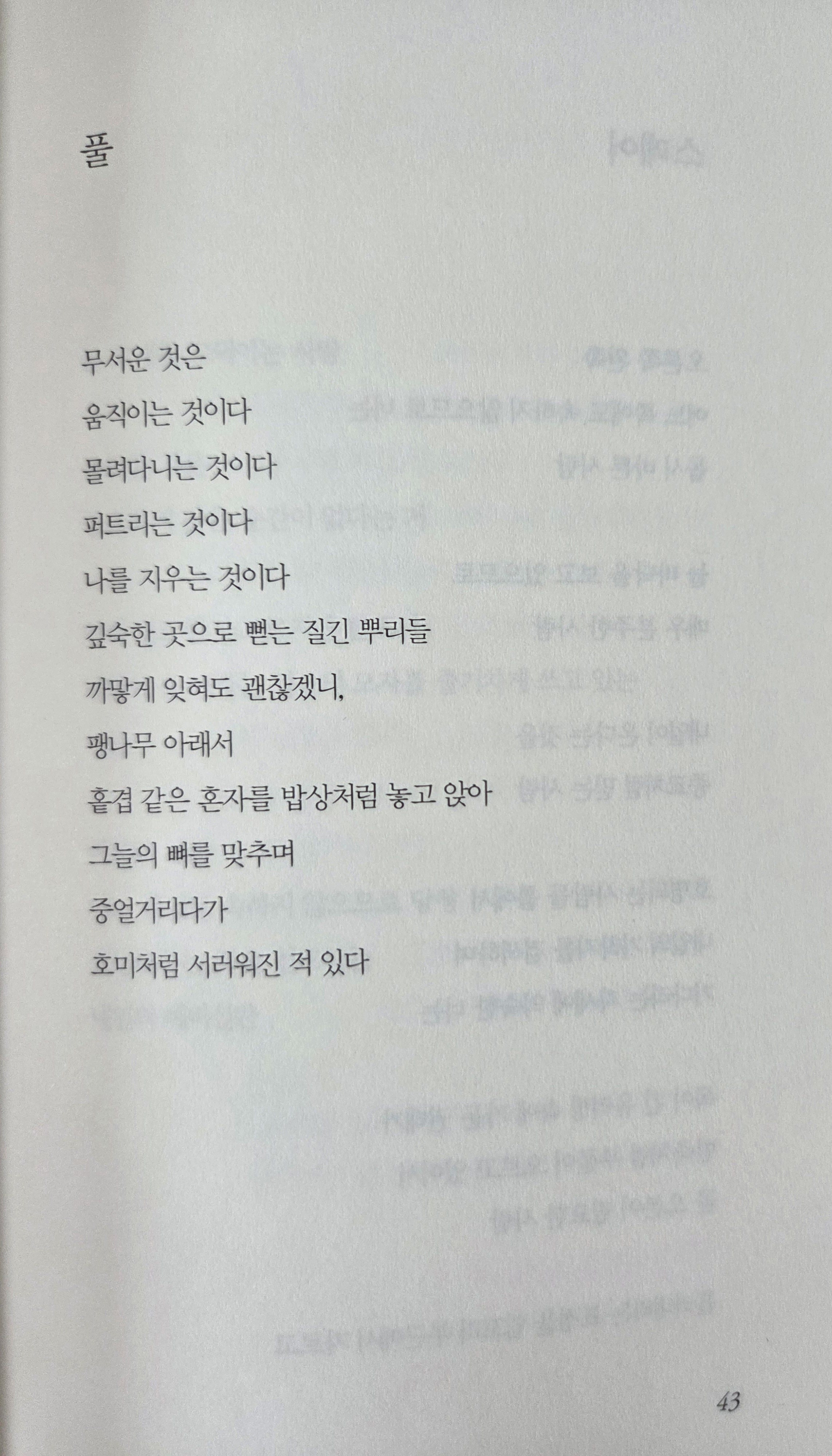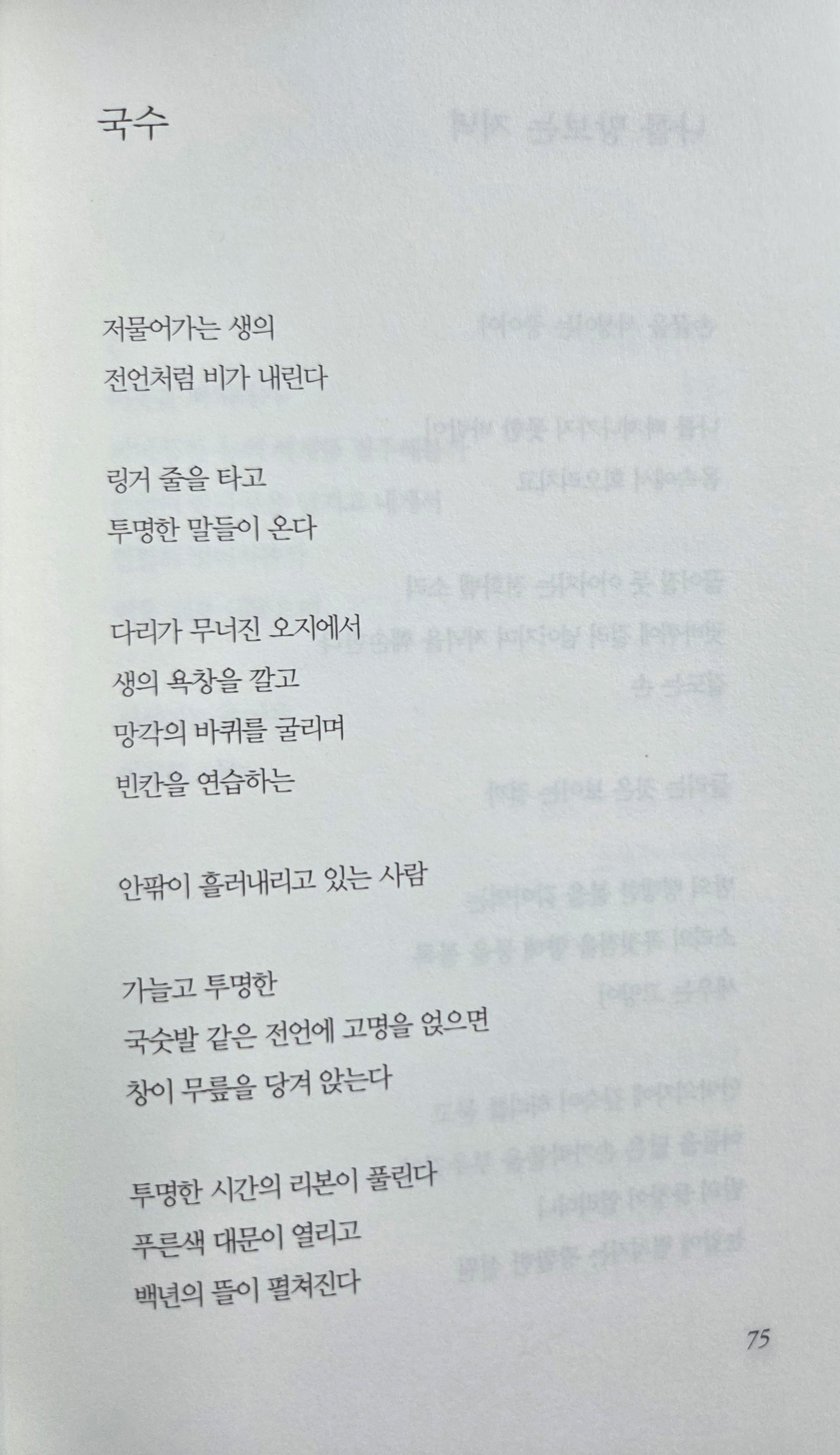하루는 몇 층입니까-성금숙 시집
저녁의 산책로
성금숙
오늘은 괜찮니,
문자가 왔다
답장을 보내고
천변 산책로에 간다
오리는 저녁에도
멈추지 않고
수면 아래 물살을 헤친다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구나
접시꽃이 꼬무작거리며
꽃문을 연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궐기
단호하게
비가 그치지 않아서
불법적인 희망을 철거시켰다
말라붙은 얼룩을 문지르면 충혈되는 손
주막에서 꺼낸 못을 게으른 벽에 박고
펄럭이는 결심을 걸었다
죽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저지르고 싶은 희망이 싹처럼 돋아나
날짜를 한 장 한 장 뜯고 기다렸다
눈을 감으면
빽빽이 불어나는
빚더미처럼
개나리꽃들이 눈을 당겼다
불법이던 희망의 잔해들이
빈 깡통처럼 굴러다니는 골목으로
바람을 앞세워 떼 지어 몰려오는
미래의 초록군단
연두주먹을 작은 깃발처럼 흔들며
구령에 맞춰 힘껏 전진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낙화
뜨거운 국밥을 먹다
입천장을 데었다
벗겨져 쓰라린 곳을
입 벌리어 거울에 비춰보는데
당신은 뒤돌아 앉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배고파서
영산홍이 또 피었다
깨진 거울 속에서
좁쌀처럼 돋는 통증
이번 생은
손깍지 낀 채 살다 먼저
바다에 닿아 읍揖해야겠다
성호를 긋고
거룩하게
나를 소등해야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금숙 시인의 작시는 문학적 트라이앵글을 압축하고 녹이는 과정과 다름없다. 이를 통해 시는 수태를 기다리는 생의 충만한 의지를 담는다. 발아된 그의 문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과 사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너머를 향해 나아간다.
시인은 멈추지 않는다. "이곳을 빠져나가/까마득한 눈의 세계를 질주해볼까/끝없이 발자국을 남기고 내게서/열렬히 멀어져볼까/더운 김을 내뿜으며"(나를 망보는 저녁), 또한 "모이고 흩어지는 구름을 따라/흩어지고 모이는 명령을 따라/나를 넘고 너를 넘고 우리를 넘어/불가능한 벽과 높은 철책을 넘어보자//명랑이 모인다/명랑이 드넓어진다 송이송이/명랑이 익어간다"(가능한 구름의 명랑)면서 이를 충의롭게 모색한다.
이를 우리는 작품과의 혼연일체로 명명해도 되겠다. 물론 성금숙 시인이 가진 문장의 매력 중 하나다.
-박성현 시인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