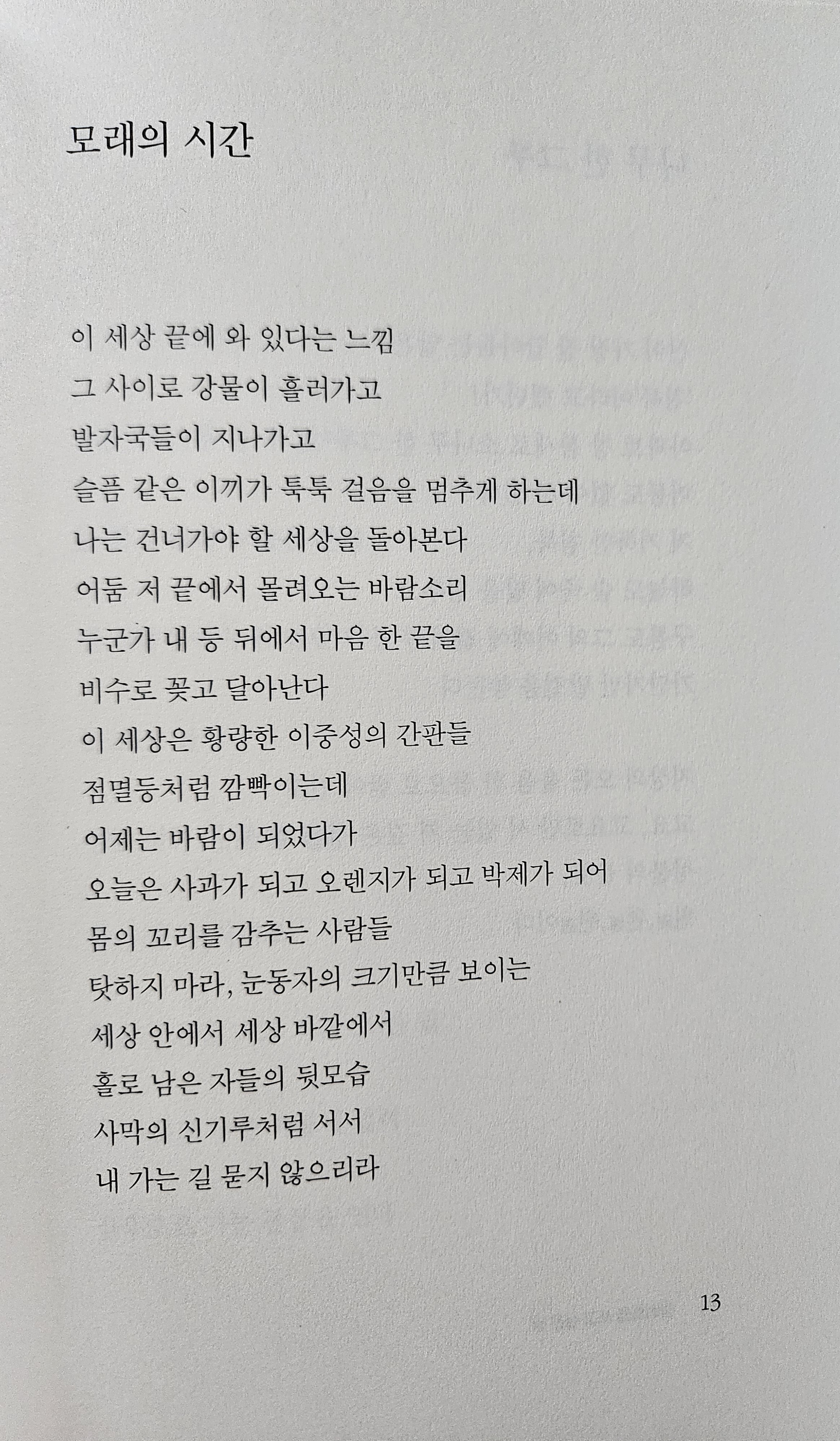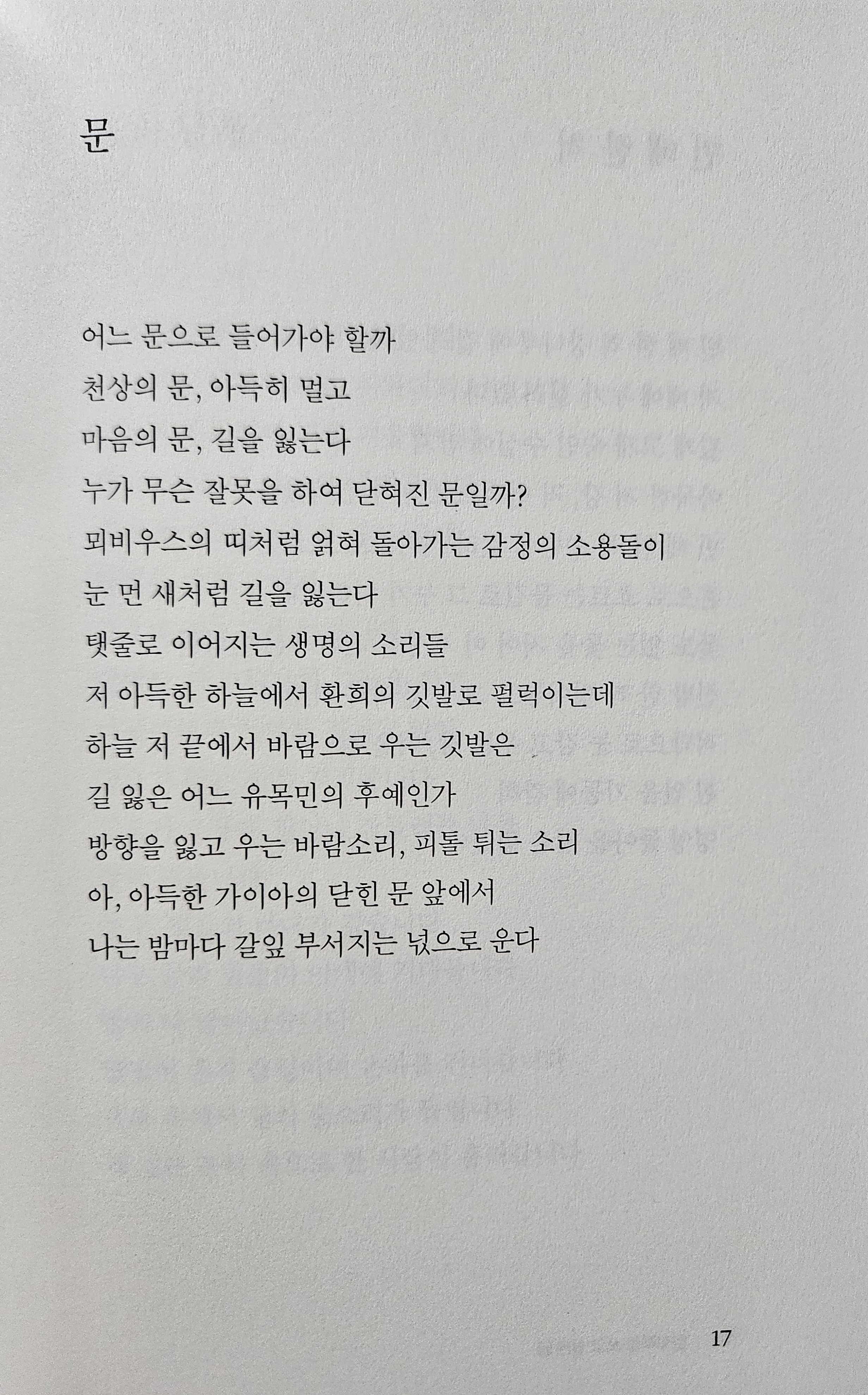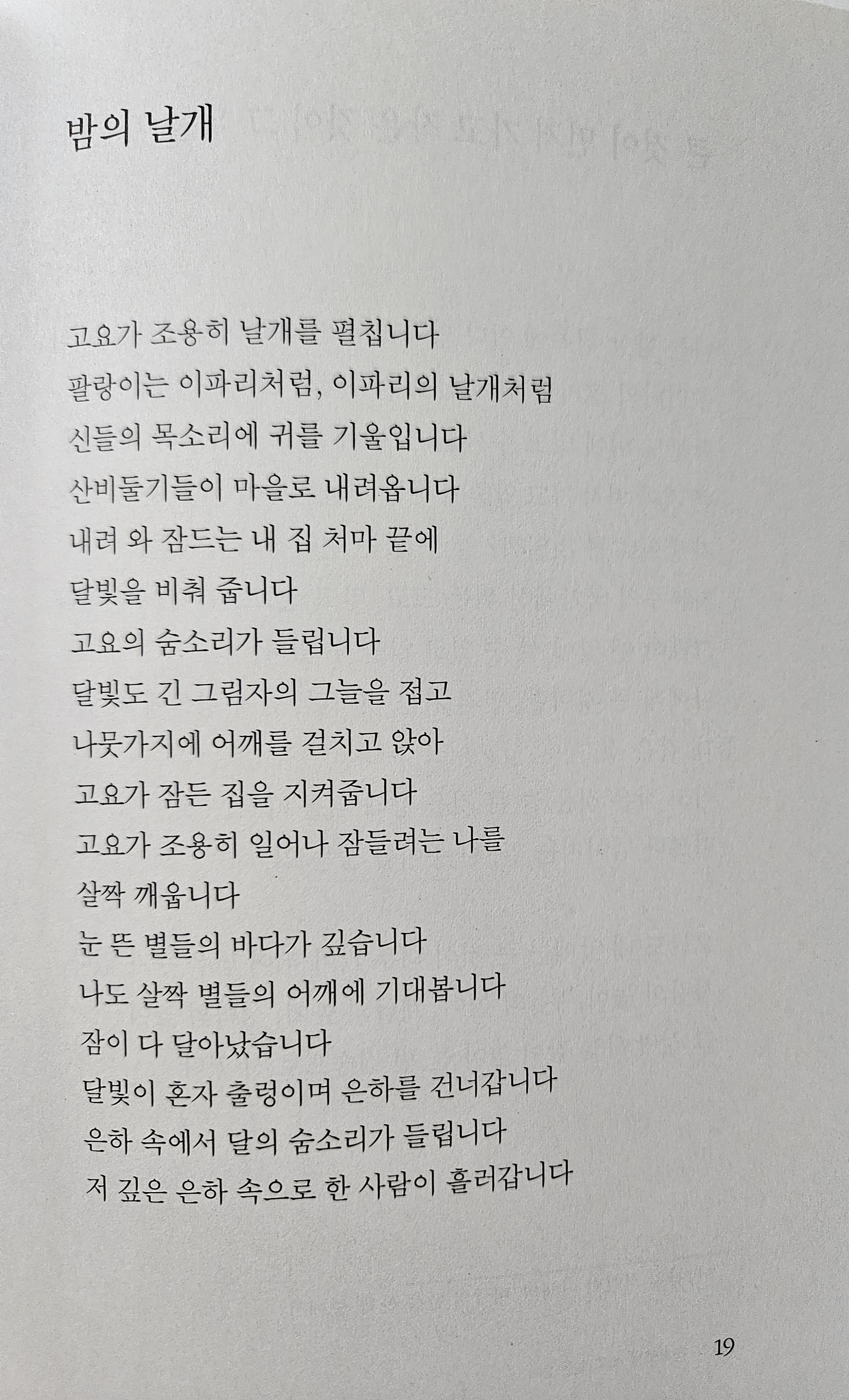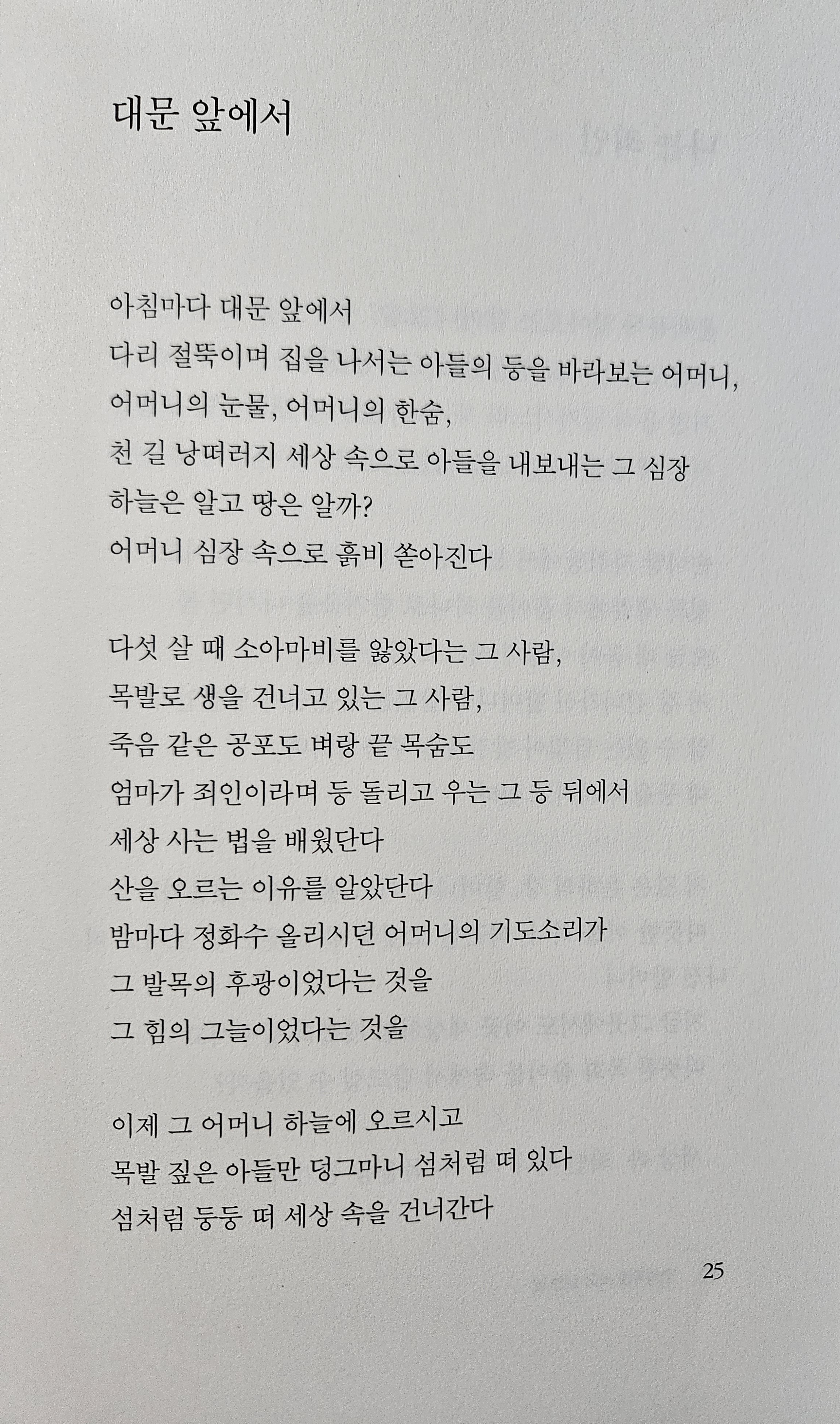참회록을 쓰고 싶은 날-이영춘 시집
모래의 시간
이영춘
이 세상 끝에 와 있다는 느낌
그 사이로 강물이 흘러가고
발자국들이 지나가고
슬픔 같은 이끼가 툭툭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나는 건너가야 할 세상을 돌아본다
어둠 저 끝에서 몰려오는 바람소리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마음 한 끝을
비수로 꽂고 달아난다
이 세상은 황량한 이중성의 간판들
점멸등처럼 깜빡이는데
어제는 바람이 되었다가
오늘은 사과가 되고 오렌지가 되고 박제가 되어
몸의 꼬리를 감추는 사람들
탓하지 마라, 눈동자의 크기만큼 보이는
세상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홀로 남은 자들의 뒷모습
사막의 신기루처럼 서서
내 가는 길 묻지 않으리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무 한 그루
신이 가장 잘 알아듣는 말은
'침묵'이라고 했던가!
아파트 창 틈새로 소나무 한 그루
미동도 없이 서 있다
저 거룩한 침묵,
하늘도 숨죽여 발을 멈추고
구름도 그의 어깨에 걸려
가만가만 발걸음 놓는다
지상의 모든 울음 몸으로 받아 안고
고요, 고요로만 서 있는 저 깊은 성불 한 채,
성불의 불꽃,
원圓, 원圓, 원圓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낯선 거리에서의 사막
내 발길 닿는 곳 모랫길
여기는 분명 내가 자주 와 마음 나누던 길인데
길이 없다
북극성 같은 사막에 모래바람 불고
나는 눈뜬 장님처럼 갈 길을 잃는다
먼 산은 아득히 혼자 저물고
먼 길 함께 가던 달빛도 길을 잃고
눈 덮인 사막이 된다
어디로 갔을까
함께 길을 가던 사람,
발자국소리도 가고 그림자도 가고
기침소리마저 멀어져 간 노을빛 저녁
텅 빈 거리, 분화구 같은 모래언덕을
혼자 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단 50년을 눈앞에 둔 이영춘 시인의 신작시집 '참회록을 쓰고 싶은 날'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우리 시단의 대표 중진이 품은 심원한 언어와 사유가 충일하게 번져온다. 그동안 서정시의 품과 격을 최전선에서 구축해온 시인의 새로운 적공이 눈부시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이영춘의 이번 시집은 사물이 거느린 시간의 깊이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삶의 비애를 형상화하지만, 그 슬픔의 무게로 하여금 비판주의나 냉소주의로 흐르지 않고 삶의 불가피한 진정성에 대한 옹호로 나아가게끔 하는 기막힌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영춘 시인은 우리 시대 서정시의 거장으로 우뚝하기만 하다.
-유성호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