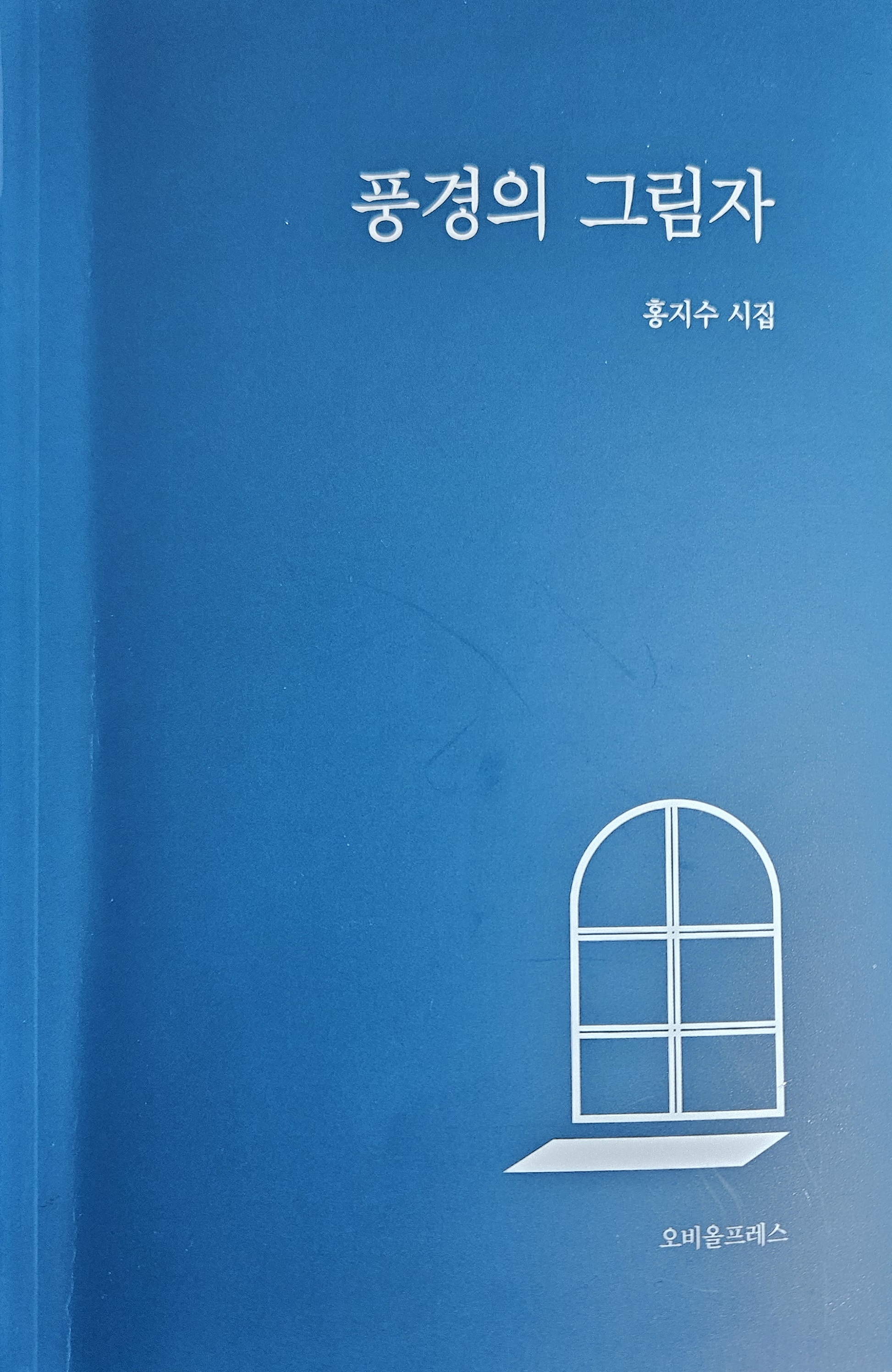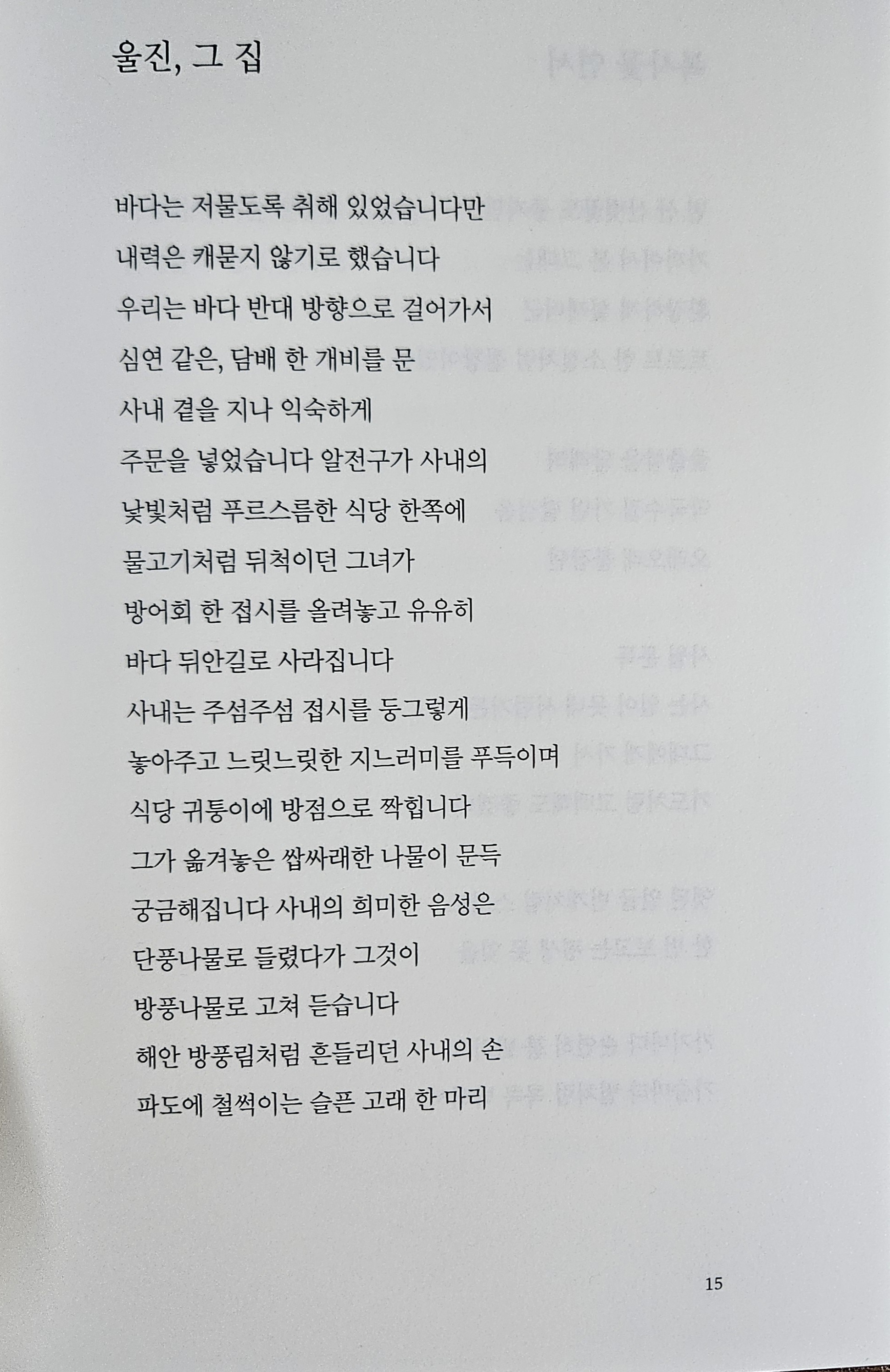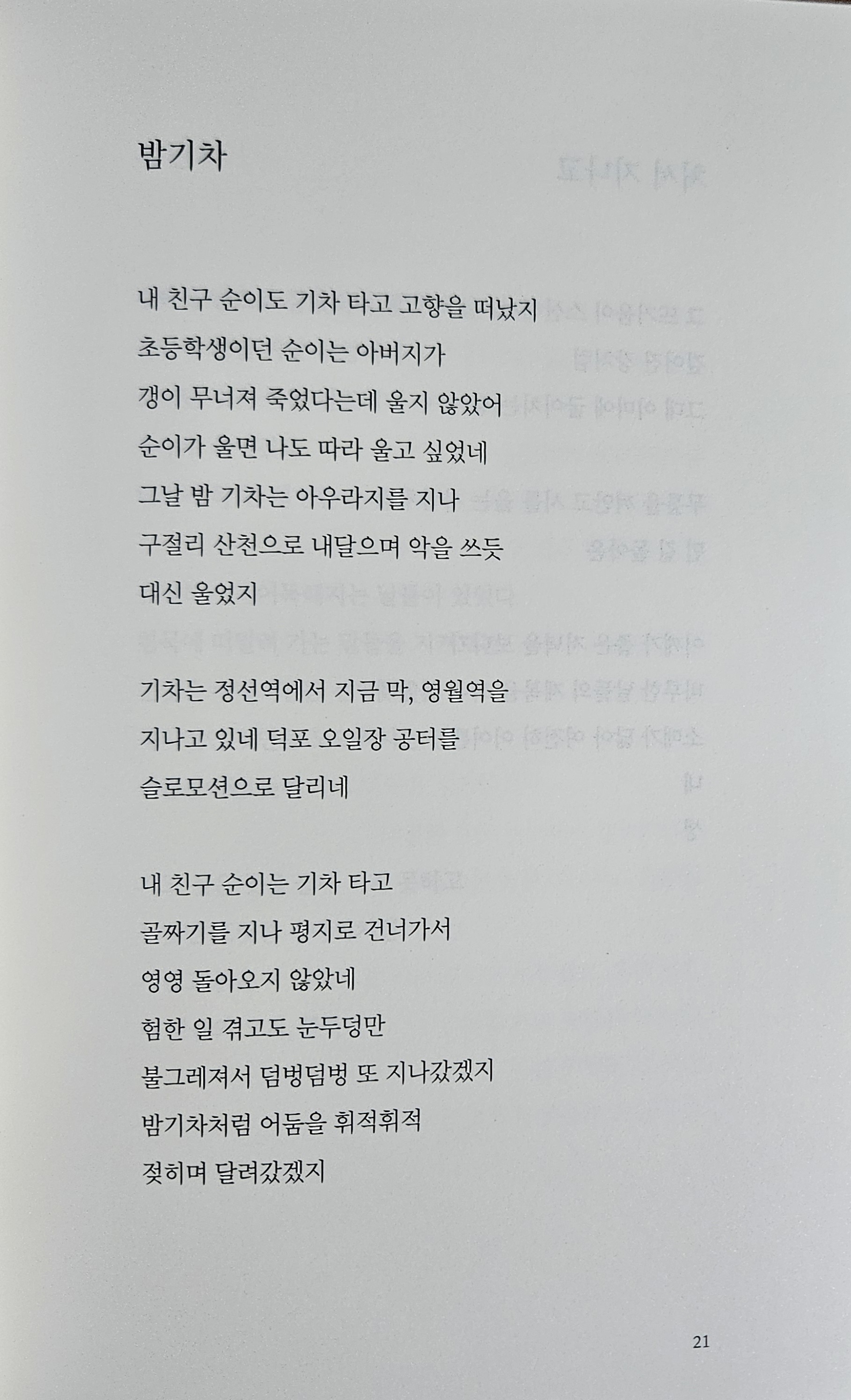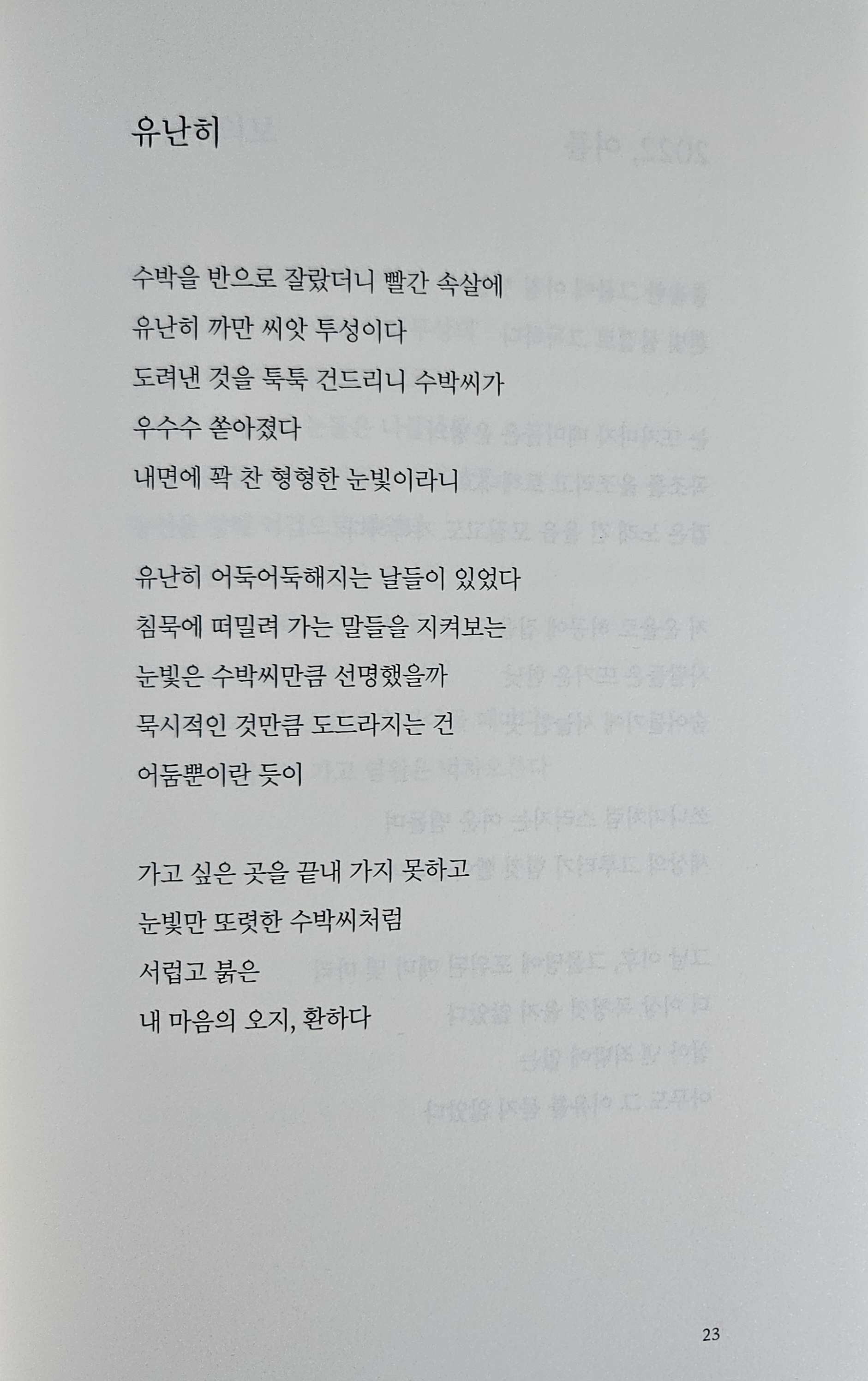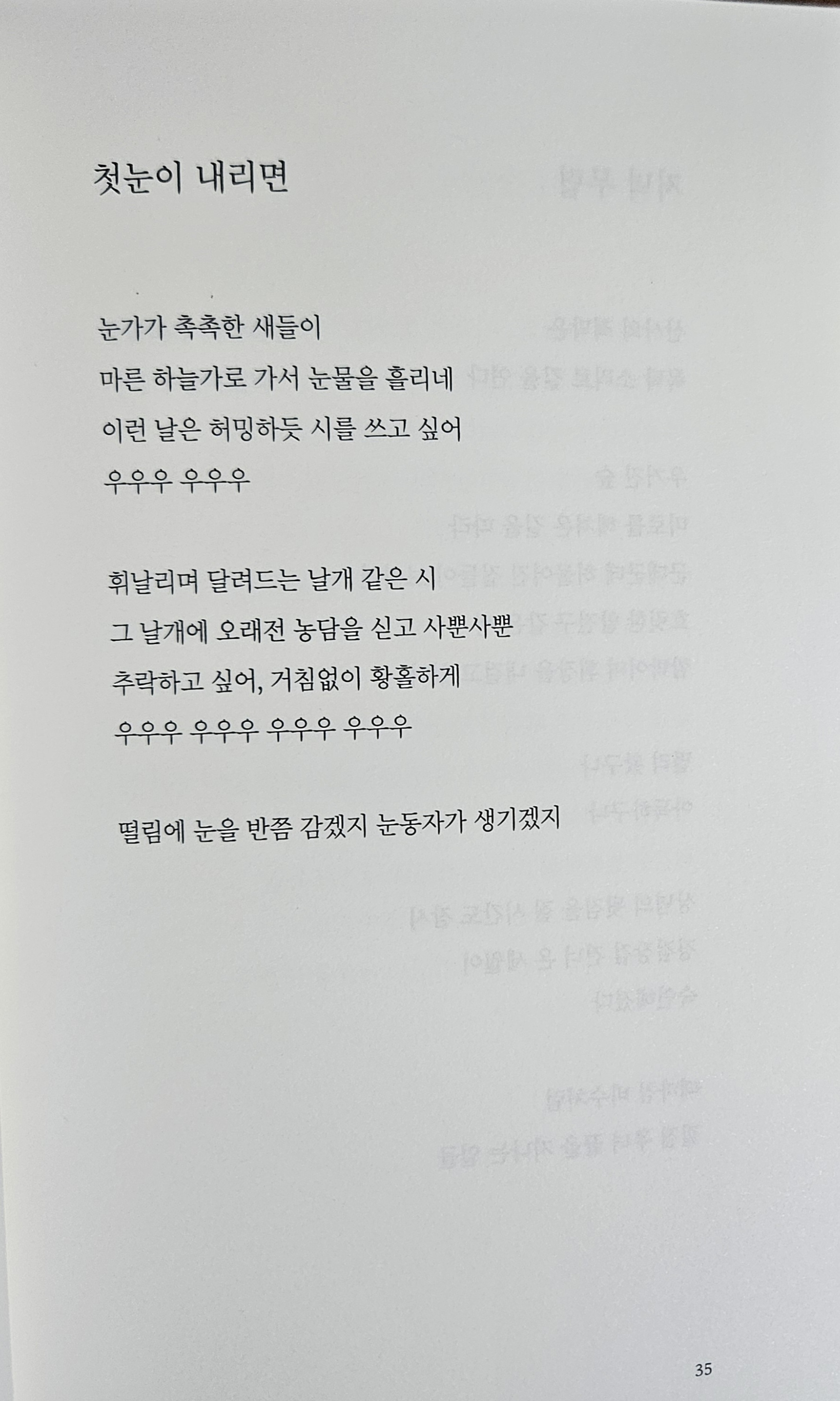풍경의 그림자-홍지수 시집
비 지나는 저녁
홍지수
지붕 위로 떨어지는 한 옥타브는
먼 산을 더 짙푸르게
당겨놓고
보일 듯 감길 듯
깊어지는 소란들은 다정도 한데
멀리 더 멀리 흘러가는
세찬 선율들은 가다가 멈추다
돌아보기도 한다는데
슬픔이야 어느 것이든 건드리면
하염없이 수위가 차오르기도 한다는데
한때의 서늘함이 지나쳐가도
눈물 마른 적 없던 꽃송이
무엇에 빗대어 저 소란騷亂들은 또
움푹 패이는 걸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꽃의 소묘
화병의 꽃들은 표정을 바꾸고
차츰 도달할 지점을 향해 가는지
코도 눈썹도 북향으로 놓여있어
수많은 날을 지나온 당신도 지금
황량한 겨울이야
시든 꽃처럼 무성의하네
그림자는 환한 얼굴을 추억해
노랑이었고 분홍이었던
몰락은 피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던 너
향기를 모으기 위해 견뎠던 일
살기 위해 눈 감았던 날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범이었던
너는 기습적으로 말하지,
저 무표정들을
언제 치워 버릴래?
피도 눈물도 없이 번쩍이던 말
몹시 추운 날
태생을 버린 아이처럼
하지만 기억해, 너의 쓸쓸한 말이
동그랗게 씨앗으로 부푼다고
심장은 달아났다가 문득
뜨거워지는 법이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겨울 바다에 갔었지
한쪽 날개를 잃고
사라진 어깻죽지의 슬픔을 만져 보았다
이제부터 머나먼 나라의 말을 배워야겠다
파도의 수위를 가늠하는 대신
차오르는 수압을 낮춰야겠다
주술 같은 언어를 삼키면 화석이 된 날들이
쏴아 파도에 실려 이국의 낯선 거리에
노래가 되고, 붉은 노을로 남겠네
눈에 가득 담은 바다가 출렁출렁 심해를 건너
가슴 한 가운데로 쓰러져 흰 소금이 되는
절여진 바다의 역사
해풍도 돌아누워 바다의 지문을 새기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시린 말들이 펄떡거리며
은빛 상어 지느러미 되어 파도의 비문을 가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신
시 쓰는 아내한테 기념일에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
시 한편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며
지나가는 말을 하던 당신
아, 그 말에 마음이 쓰윽 베였네
끝내 시가 되지 못하고 산문이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일상의 잔주름들이
혈관을 가로질러 잔물결 이는 것을
가까이 있어 그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밖에서 마주쳤을 때
웬 낯선 사내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로
휘적휘적 다가오던
지극히 산문적인 당신 거기 계시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봄밤
장릉 가는 길
청사초롱
줄줄이 엮어놓은 꽈리 같다
콱, 깨물고 싶은 밤이다
가로등 곁에 물오를 대로 오른
치자나무
사방이 어둠으로 차올라도
연신 웃고 있다
밤모가지 비틀어도 웃음소리
걷잡을 수 없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홍지수의 도전은 나름의 일정한 자기 성취에 도달한 것으로 읽힌다. 그가 인식하는 시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생이 궁금해서 쓸쓸한/저녁"이다. 지금 나는 무엇인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경계는 무엇인가. 이런 궁극의 질문들이 시인을 싸고 든다. 이런 화두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살이는 바로 그런 질문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도장이다. 웃으면서 울면서 열받으면서 성공하면서 패배하먼서 그 벌어진 균열의 증상이 문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하다. 숙성한 인간에게 문학은 군더더기가 된다. 문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온 자들의 적극적인 헷갈림의 산물일 뿐이다.
-박세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