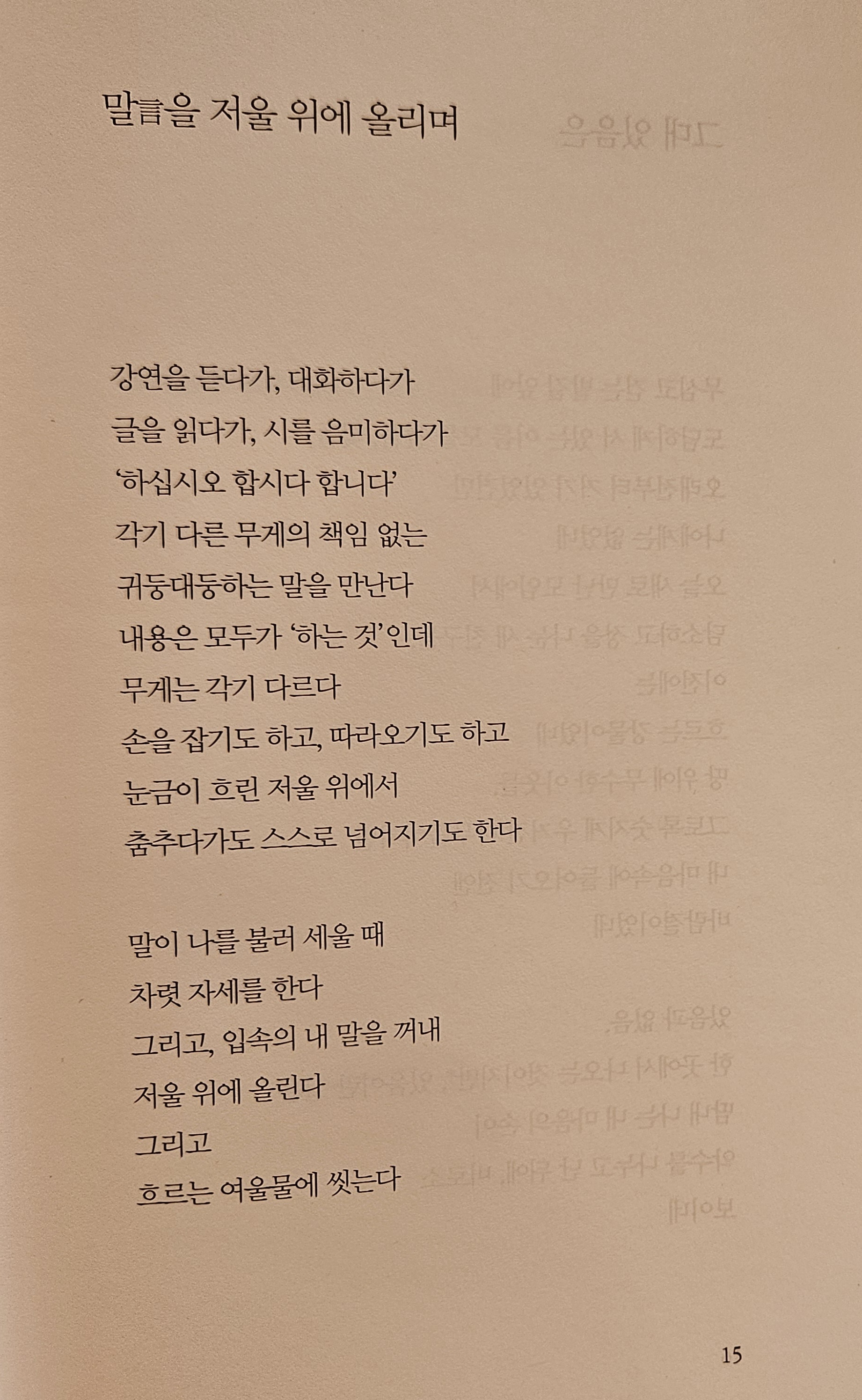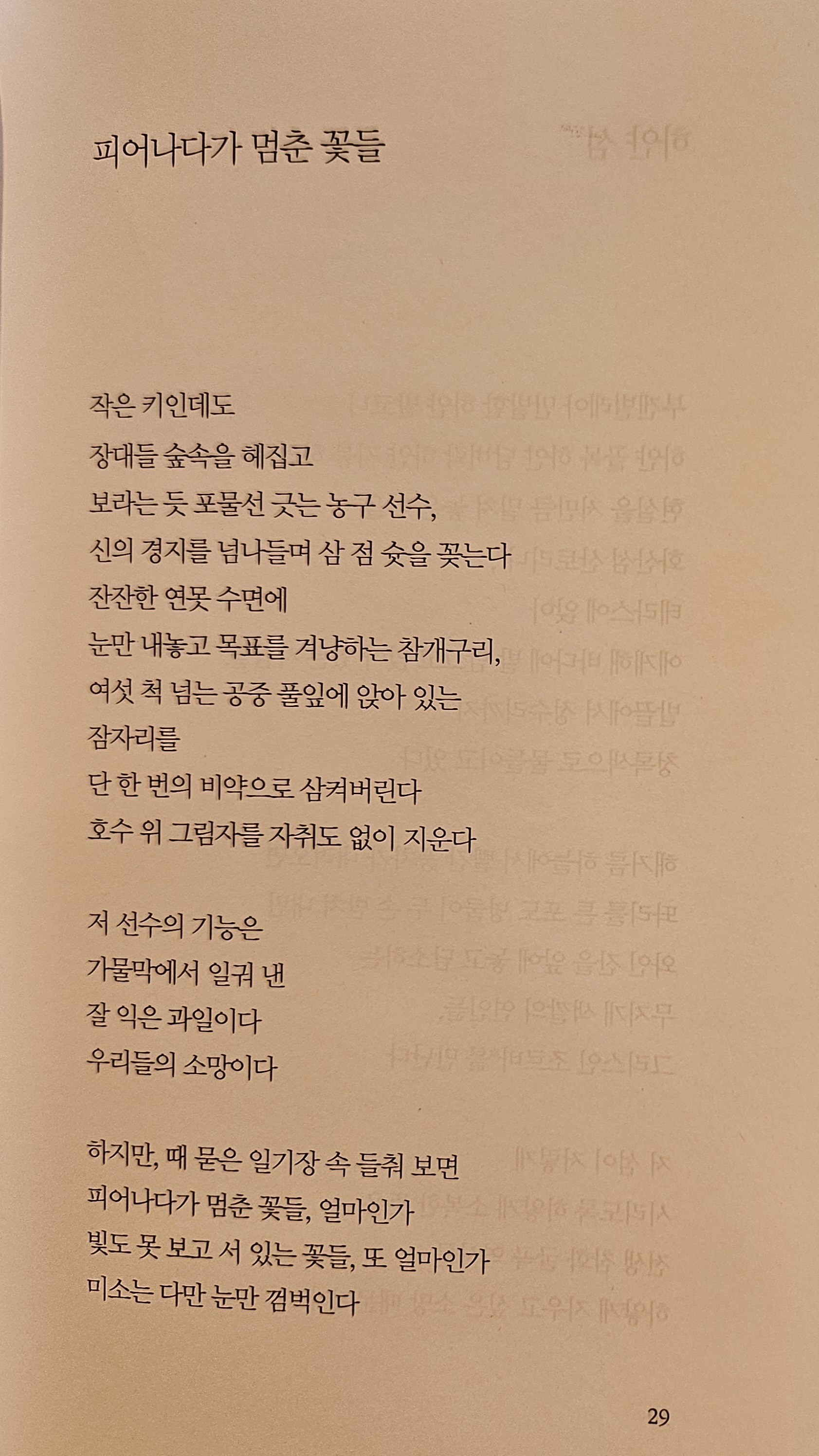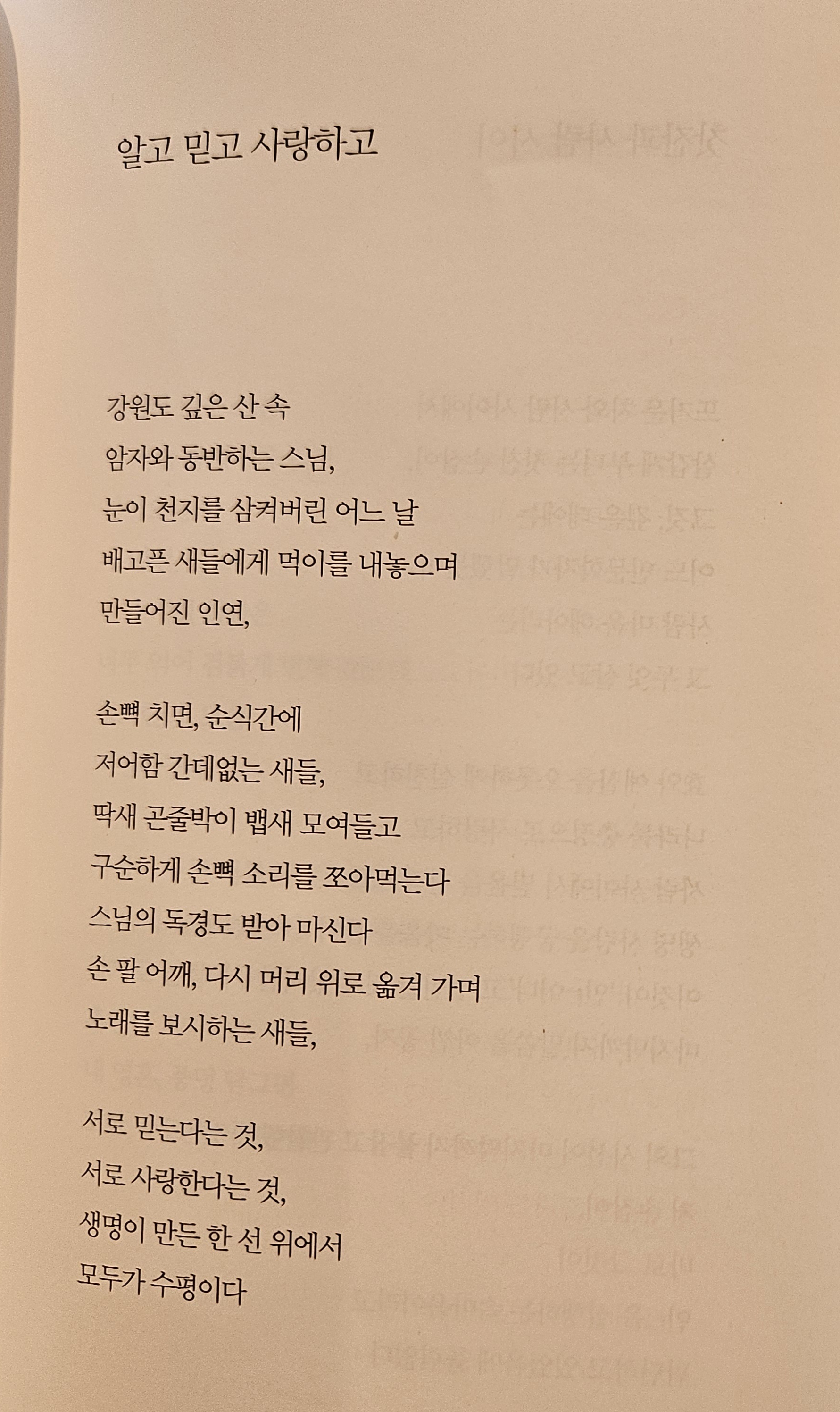걷고 있는 나무들-지창구 시집
걷고 있는 나무들
지창구
삼월의 숲속
세상은 아직 까맣고 차가운데
적막을 밀치고 들리는 왁자함,
나무들의 발소리다
질기게 버티고 있는 어둠을 허물고
결기 있게 발소리 맞춰 걷고 있다
침묵으로 엎드려 있는 일은
죽음의 연습일 뿐,
걷고 있는 발소리는
생명 창조의 기호이다
서로 간격을 유지하지만
치밀하게 가누고 있는 저들 사이에서
너와 나, 또한
함께 걷고 있는 나무다
그림자만 사는 숲속에서
새싹 일렁이는 계절을 마중하기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청사과
해마다 입추 즈음
내 가슴 뭉게구름 일고
찾아오는 이
내 연인,
지난 계절 청산은
너무 익어 검붉게 변해 갔는데
청초한 네 모습
여전하구나
사상이 푸른 너를 한 번 깨물면
내 속에 살고 있는 아득한 네 호수,
향기로 일렁이는구나
혼연히 거기
내 영혼, 풍덩 담그면
또한, 푸르게 이르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섞인다는 것
시월,
통통하게 살 올랐던 햇발이 여위어질 무렵
바람은 숲으로 모여든다
하늘이 가까이 내려온 어느 날
화살나무가 분주히 우듬지 끝에 바람을 초청하고서
진홍빛 폭죽을 쏘아 올린다
숲속의 이웃들이 일제히 손뼉치며
몸속에 가꿔 온 속살을
바람의 날개 위에 올려놓는다
땀 흘리며 단장해 온 내면의 무늬가
만자천홍이다
바람이 훨훨 날개 치며
숲을 데리고 하늘로 오를 때
숲과 바람은 이미 한 몸이다
애면글면 세상 살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섞인다는 것,
명징함이다
충만함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늘이 준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땅,
이스라엘,
맛나는 것도 달콩한 꿀도 없다
아귀찬 열정만을 부르고 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라는 말씀이 살고 있다
황량한 모랫벌 위에
마음도 사막으로 변해 간 가나안의 신의 자손들,
기웃기웃
시대의 구석구석 수소문하고 곰파더니
기어이, 사막 위에 저수지를 만든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꾼 불굴의 사업이다
사막의 발바닥 실핏줄을
촉촉하게 젖게 하더니
마침내는 개울물이 핏줄 되어 흐른다
온 땅 위에 대추야자 무화과 포도 딸기,
나는 입속 가득 저들을 넣고, 깨문다
탄탄하게 살아 있는 것,
그건 땅의 말씀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불씨
엄마, 아빠, 이젠 싸우지 않을 거지?
우리, 함께 밥 먹고 싸우지 말자, 응!
가족이 외출 나서는 휴일 골목길
부니는 아기 목소리가 관심을 불러 세운다
한 손엔 엄마, 다른 손엔 아빠,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 꼭 붙잡고
시선은 양쪽 깊은 바다를
번갈아 갈마들고 있다
언뜻, 아기가 그린 그림 한 폭이
내 중심 깊은 곳에
쫙, 펼처진다
그렇다
아기는 오늘
꺼져 있던 가족의 모닥불에
다시 불씨를 붙이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창구 시인은 시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 지금 우리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 모든 생명을 이익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익이 있으면 살 가치가 있지만 이익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누가 생명의 가치를 따지는 것일까? 당연히 자본을 쥔 권력이다. 권력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쟁도 불사한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죄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지창구 시인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의 반대편에서 생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곳에서 나무들은 왁자한 발소리를 내며 봄을 끌어당기고 , 아이들은 보물 창고에 쌓인 무수한 사물들과 신나게 논다.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우리가 발 디딘 세계를 성찰하는 시 쓰기를 지향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오홍진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