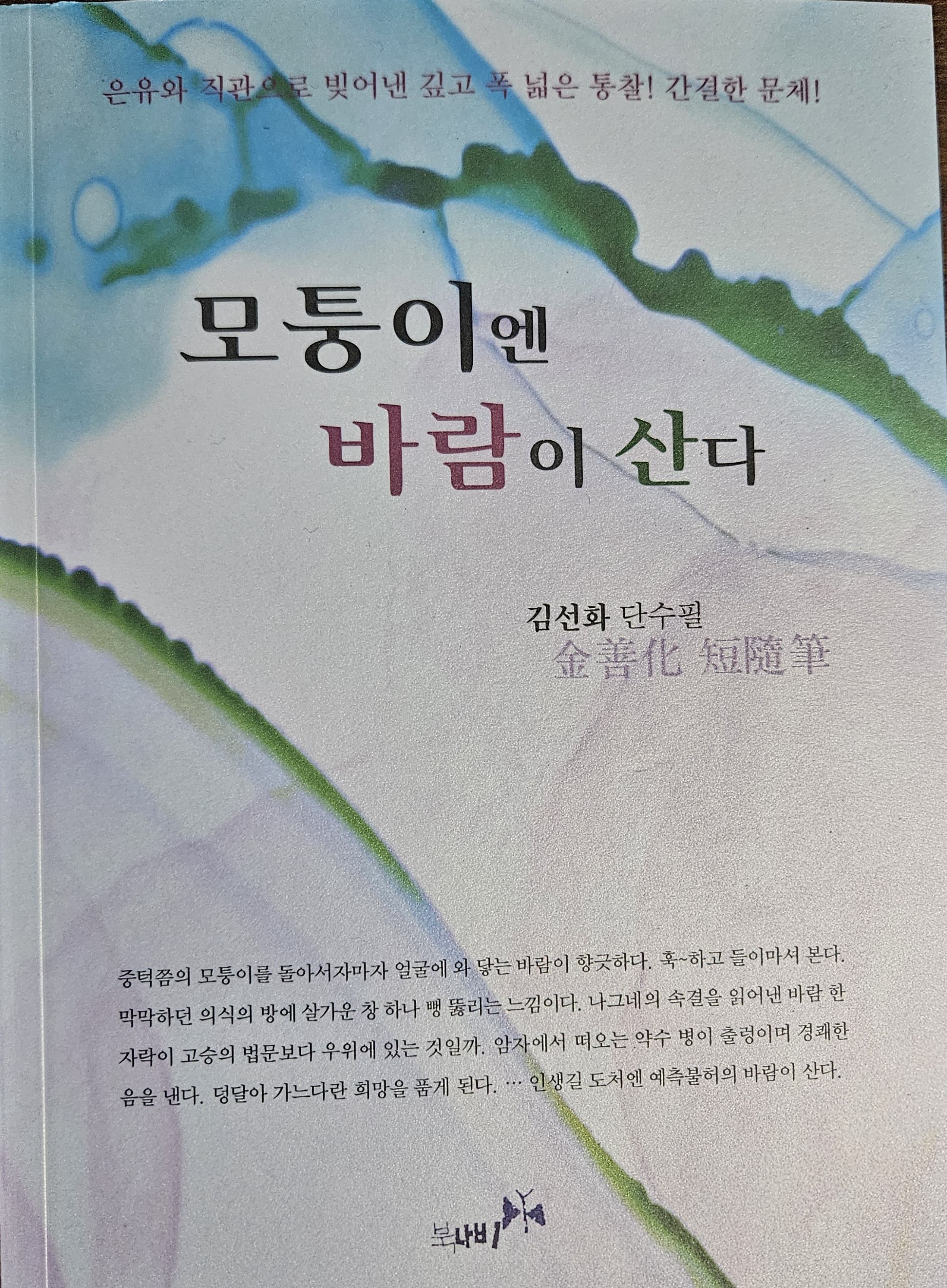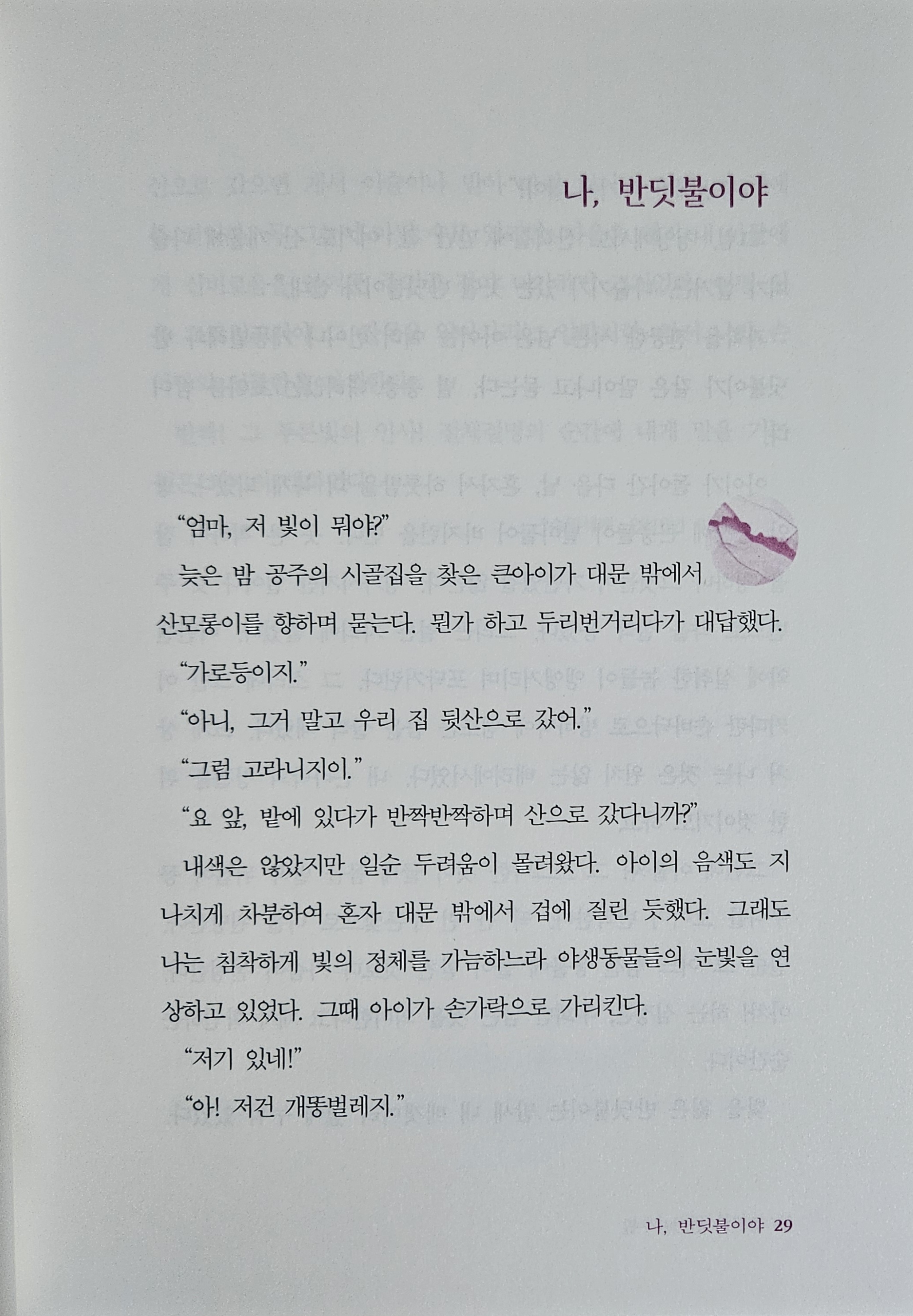모퉁이엔 바람이 산다-김선화 단수필집
천 원짜리 지폐 석 장
김선화
또, 또, 또...
일가족 사망이란 뉴스를 접한다. 생계형 어려움을 극복 못해 스스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 얘기가 안타깝게 들려온다. 몸이 아프거나 하여 도저히 딛고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소식을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진다. 허나 성인이 된 자녀들마저 같이 행동에 옮긴 일에는 마냥 연민의 정을 얹을 수만은 없다.
최근엔 사십 대 엄마와 이십 대 남매, 그리고 함께 살던 딸의 친구까지 각자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소식이 어처구니없게 다가왔다. 그중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볼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야멸차게 나무라고 싶어진다.
43년 전, 열일곱 살 서울 초년생의 경제적 밑천은 3천 원이었다. 3천 원! 큰돈이다. 그 무렵 나는 그 돈만 있으면 마음이 부자였다. 객지를 향해 처음 사립문을 나설 때 수중에 3천 원이 있었다. "아플 때 약 사 먹어라"하며 엄마가 옷 보퉁이에 꼭 꼭 찔러 넣어준 그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다. 어쩌다 버스를 잘못타서 낯선 곳에 내리는 날이면 지갑부터 열어보곤 했다. 돌아올 차비가 충분한지를 헤아려 보고 안도했던 것이다.
돈이란 성실히 일하면 벌리는 것이니, 봉제공장 바닥을 비질하고 숙식을 해결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머리맡엔 책 몇 권과 잉크와 노트 한 권이 고작이어도, 이 누나를 딛고 학업을 이어갈 동생들 생각에 솟구치는 내면을 다독일 수 있었다. 첫 월급 5천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 일에 두려움이 없고. 발전하는 스스로의 능력과 성장하는 동생들을 믿었다.
화려하게 꿈을 키워가는 또래들과 비교하며 자괴감인들 왜 들지 않았으랴. 하지만 나를 지탱하는 방법은 본분을 아는 것이었다. 그런 허허로움이 젊은 시절의 든든한 자산이었다. 첩첩산중 시골뜨기치고는 특이한 배짱이었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김장하러 오라는 부름을 받고 시댁엘 들어갔을 때였다. 서툰 솜씨로 일을 거들며 뒤란에서 우물을 길어 올려 살언음 진 고무대야 등을 설거지하는데, 임신 초기이던 나는 온몸이 오들오들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중풍 앓던 시아버님의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어렵사리 건너오며 조끼주머니에서 뭔가를 더듬으셨다. 부스럭 소리에 내심 당신 주전부리인 사탕이라도 꺼내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어 이 며느리 손에 쥐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 석 장이었다.
"암말 말고 맛난 거 사 먹어라"
순간 나는 목젖이 뜨거워졌다. 모든 것이 설어 절절매던 시댁에서 처음 맛본 온기였다. 그 힘으로 35년을 거뜬히 버티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과 정서가 달라진 지금 옛일을 들먹이는 일이 괴리감은 들겠지만, 설사 몇백 년이 흐른다 해도 자신을 잘 다잡고 생의 결을 바로 다독이는 사람들을 나는 응원한다.
-천 원짜리 지폐 석장 [전문]
수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문장의 밀도 면에서 고심해왔다. 시창작을 병행하던 30여 년 전부터 단수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다. 결과, 글속에 골격을 세우고 함축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원고지 5~7매 분량의 수필에 끌리게 되었다.
윤오영 선생의 수필에서 다감하며 짙은 여운을, 김소운 선생의 문체에서 거리낌 없는 시원시원함을, 이태준 선생의 강론에서 적확한 문장을, 김동석 선생의 함축된 표현에서 은유적 서정을, 윤모촌 선생의 수필에서 시대적 우수와 문장의 격을 흡수했다.
이어 다수의 수필전문지나 일간지에서 짧은 수필 연재의뢰가 들어와, 필자는 정신적 촉을 세우고 붓끝을 가다듬으며 호응해나갔다.
-작가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