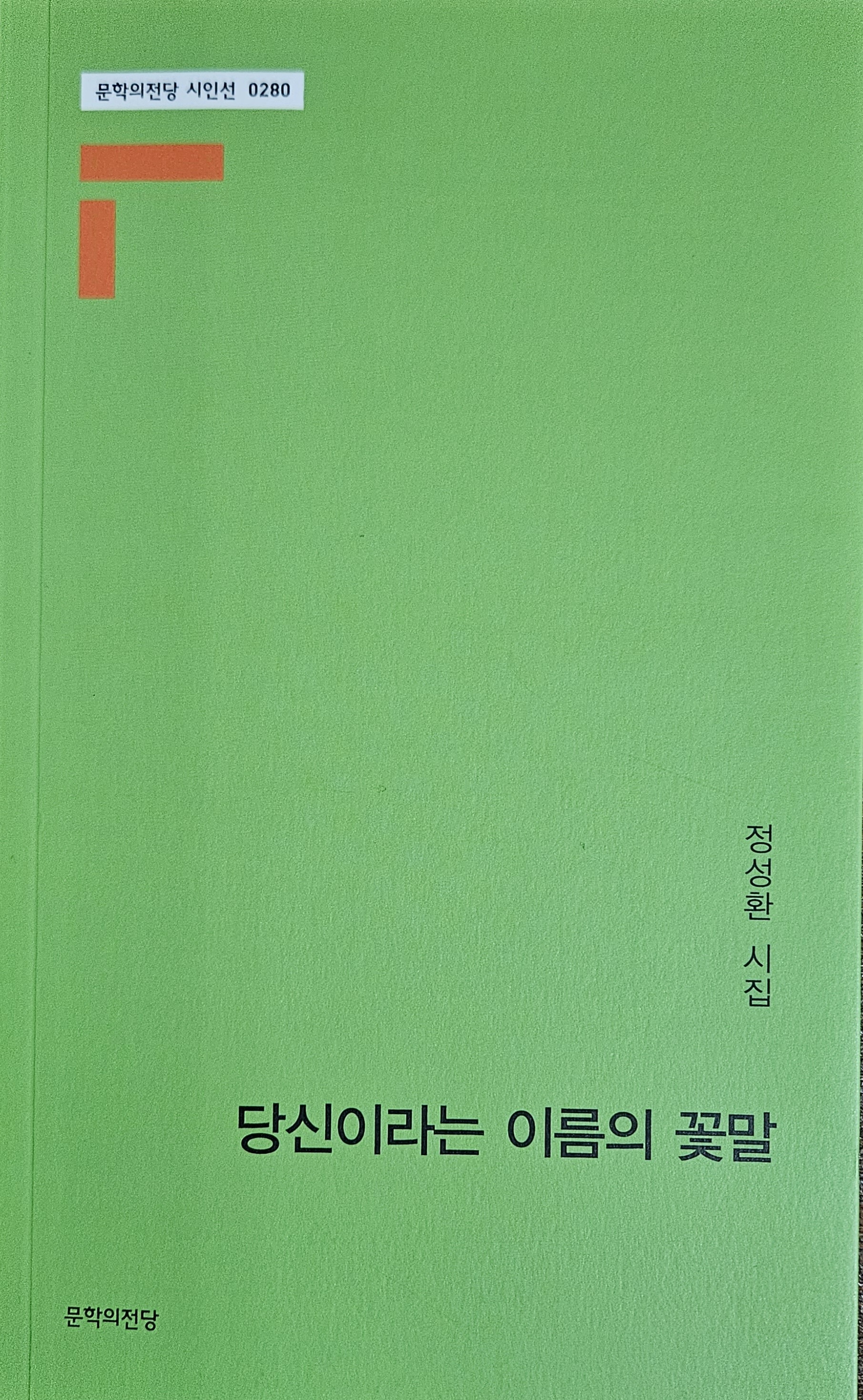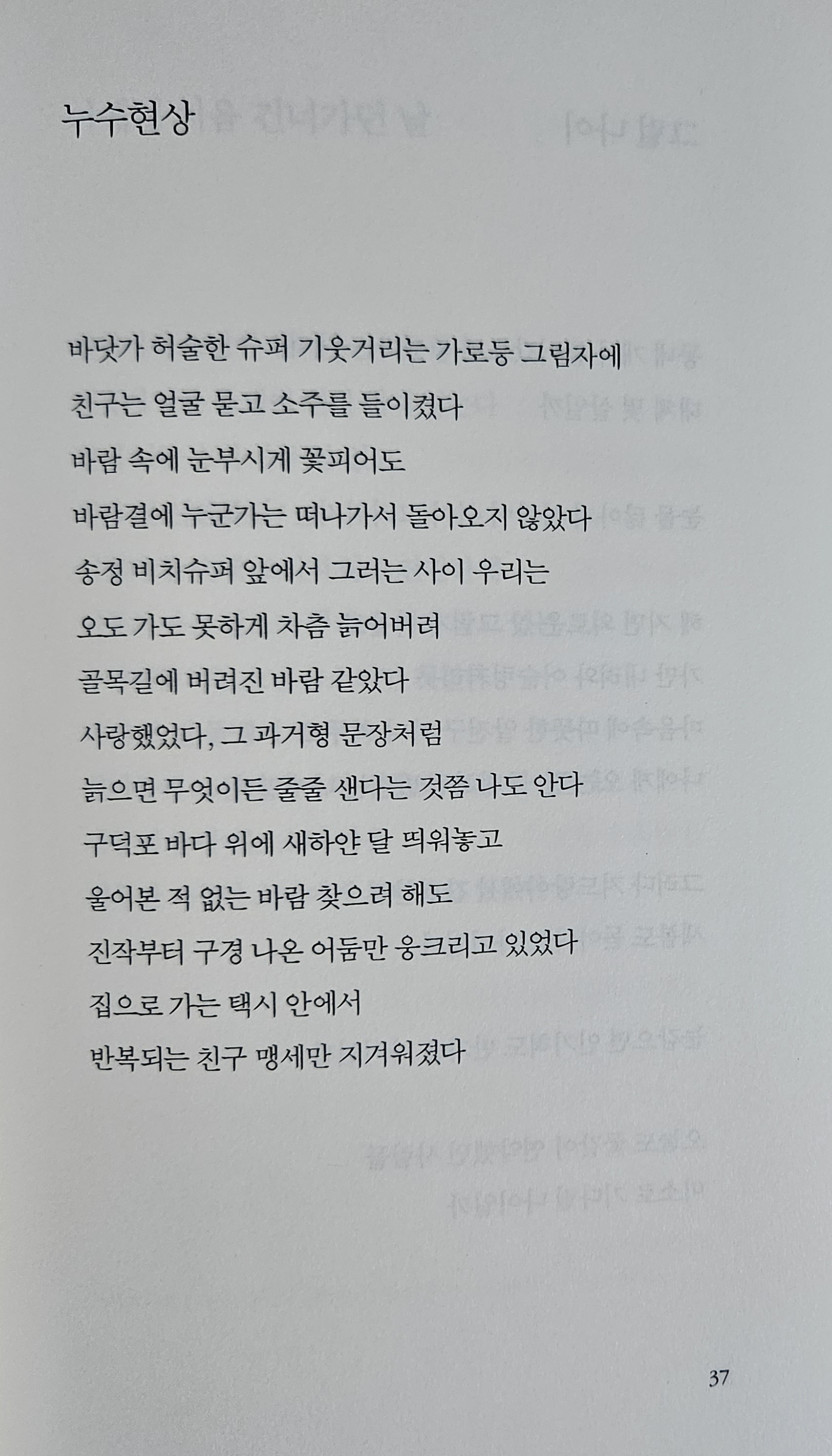당신이라는 이름의 꽃말-정성환 시집
뜨거운 눈이 내린다
정성환
차창에 악착같이 들러붙는 눈발 보며
차마, 브러시로 그 지난한 흔적
지울 수 없었다
차가운 몸 뜨겁게 던지는 눈발들을 보다가
악착같은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무얼까,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이 눈이
그칠 것을 안다, 우리 삶처럼
그럼에도 거룩한 생활의 세상에
한 몸 으깨어 쓰러지더라도
내리고 내려서 남모를 순정의 알갱이로 매달려 살다가
꾸벅꾸벅 졸린 듯 사라진다
진정으로 산 채로 쏟아지는 저들에게
한 번쯤은 붙잡혀. 철저히 고립되어
찬미하듯
새하얀 도화지 덮어쓰고 있다가
봄 되면 눈물자국 없이
태어나고 싶다
36하고도 영점5가 더해지는 나는
저들보다 더 뜨거워야 낫지 않는가
두려움 없이
저절로 살아지는 세상은 없다
그것 또한
절절한 힘임을 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룡地龍의 꿈 제조법
씨앗은 아니지만
세상 낮은 땅속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며
매일 꿈 만든다
사는 일이 쉽지도 않지만 단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빛 잃은 그믐달도 절망하지 않고
어떨 때는 눈물로
혹은 그리움으로 빈속 채우며
보름달 되어가듯
나는 한평생 한일자로 외길만 굳건히,
알알이 햇살 버무린
거친 흙도 씹어가며 오물오물 걷다 보면
푸른 꿈 매달고 있는
정이 많은 나무 될 수 있을까
용의 잔해 떠돌다
나무로 환생하다는 메아리 화석이 되기 전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허수아비
출근하자마자 인사발령이 사내 게시판에 떴다
네모난 칸 속에 갇혀 있는 내 이름이 고개 숙이고 있다
가시 울타리에 버려진 죄인이었다
박차고 나가려는데 허수아비처럼 주먹이 풀린다
고등학생인 막내가 떠올라
조용히 다시 앉는데 손끝이 떨렸다
사람이 사람에게 돈 때문에 고개 숙인다는 것이
가끔 먹먹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도 바람 불면 넘어지기 일쑤였는데
그저 새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깡통 달고
큰소리로 웃으며 왔는데
또다시 아무도 없는 벌판에
말없이 서 있어야 곡식 같은 아이가 산다고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불꽃처럼 사는데도
팽팽한 겨울바람 영글어가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는 괜스레 죄 짓는 기분이 든다
내 불알친구 진수는 용접공
봄날 약수 뜨러 산 오르듯 아무렇지 않게
맨몸으로 난간을 탄다
세상 모든 불 끌어다가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한 것들
사이좋게 이어 붙인다
마스크에 겁 없이 쏟아지는 용접 불똥만큼
사는 게 가볍지도 짧지도 않아서
친구는 창문 없는 여관 달방에 산다
오십 년 넘도록 혼자 사는 친구는 그래서
불꽃같은 여자보다 전구가 약해 흐릿한 불빛마냥
따뜻한 여자가 그립다고 한다
술 취하면 엄마도 보고 싶다고 운다
불꽃 닿은 자리마다 희망이 순식간에 식어가는겨울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럴 나이
동네 개나 물어갔으면 좋겠다는 나이
대제 몇 살일까
눈물 많아져 사람이 쉬이 그리워지는 나이일까
해 지면 외로운 산 그림자 마을로
가만 내려와 어슬렁거리듯
마음 속에 따뜻한 알전구 하나 켜두고
나에게 오는 길, 등대처럼 밝히는 나이일까
그러다 겨드랑이에서 간질간질
새봄도 돋아나는 나이일까
눈감으면 인기척도 반가운 나이일까
오늘도 꽃같이 연약했던 사람들
미소로 기다릴 나이일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꽃에만 꽃말이 있는가? 그리움에도 꽃말이 있고 노을에도 꽃말이 있다. 피고 지는 세상사가 모두 꽃과 다르지 않으니 시인은 그 꽃들에게 다정하고 쓸쓸한 귀엣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눈 감으면 온 세상이 되는 당신"들의 말을 받아 꿰었으니 "내 것인지 혹은 당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시편들, 곧 정성환의 꽃말들이 다 거기서 났다. 시인은 생의 공터에서 어머니라는 꽃말을 돌보고 있다.
어쩌면 꽃의 승천이 가까워 왔음이리라. 정성환의 시에서 정황 이전의 그리움에 이후의 그리움이 겹쳐지는 연유일지도 모른다. 시인에게 있어 그리움은 세상을 읽는 꽃눈이자 곡진한 통신 수단이니 꿈을 잃은 것들의 외로운 가장, 떠남과 배웅에 상주常主하는 그리움의 상주喪主로서 정성환은 씨앗으로 다시 돌아올 당신들을 늦도록 어루만진다. 이 모두 찬 돌을 문질러 꽃 한 송이 틔우는 뜬눈의 일이다.
-박지웅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