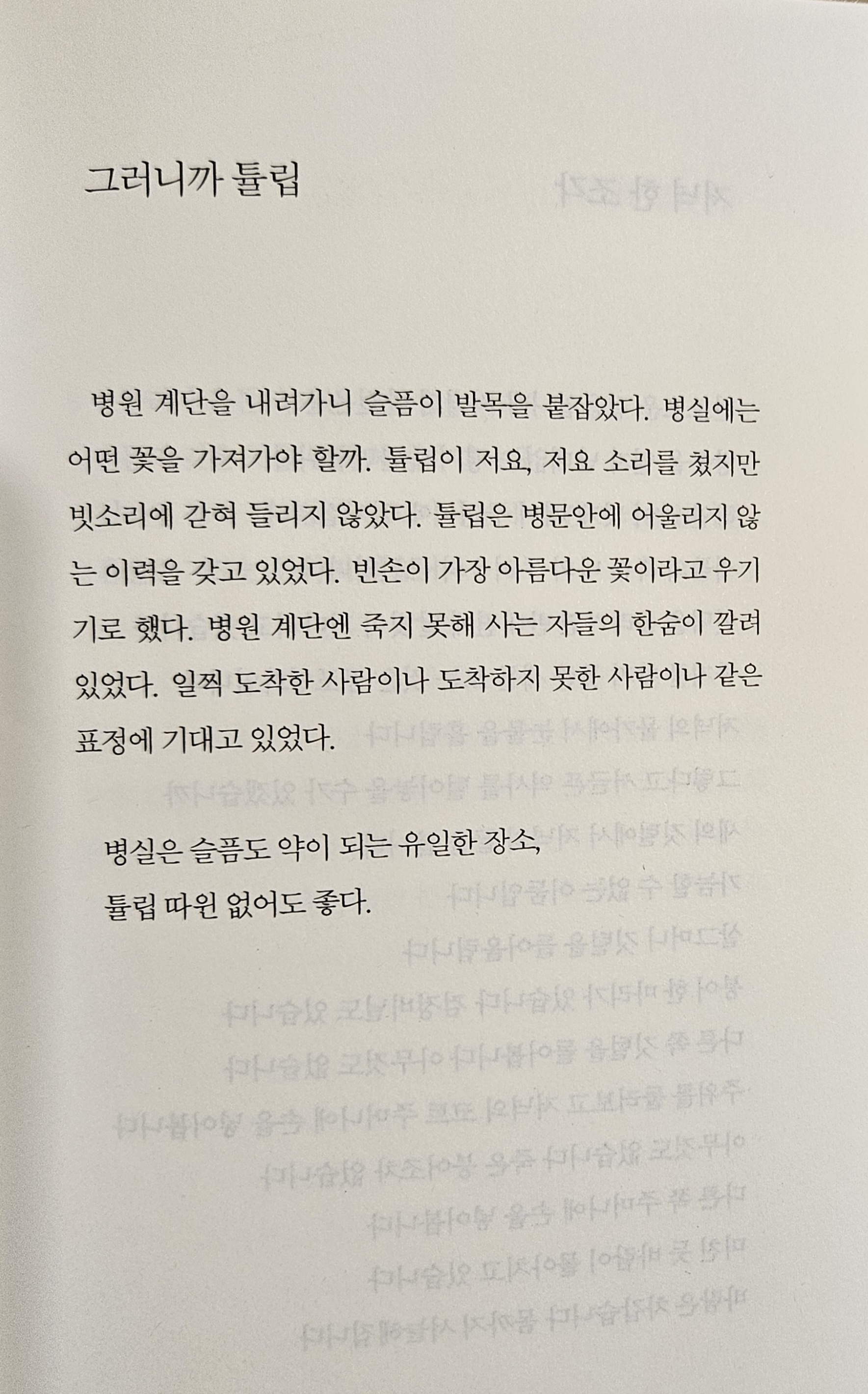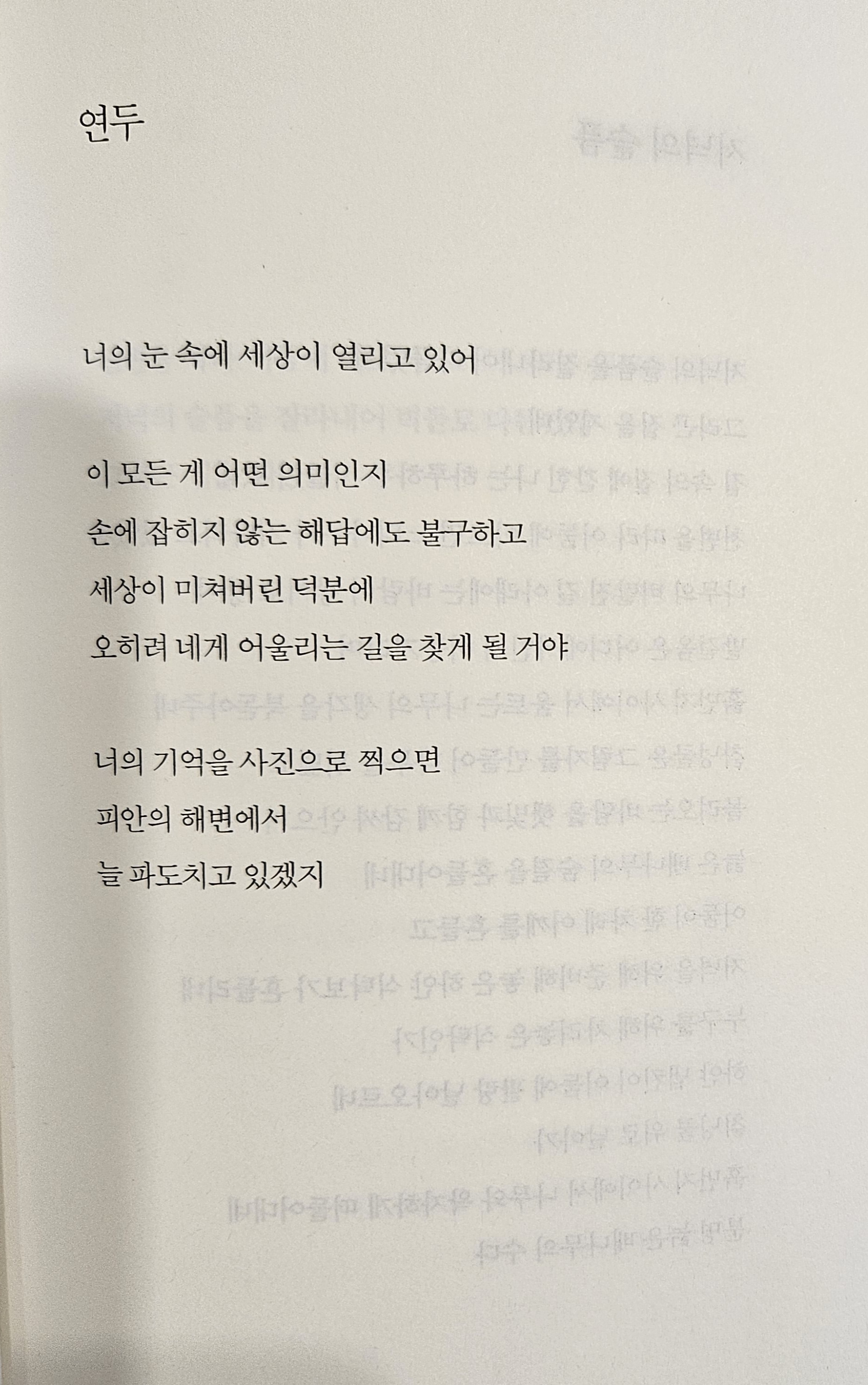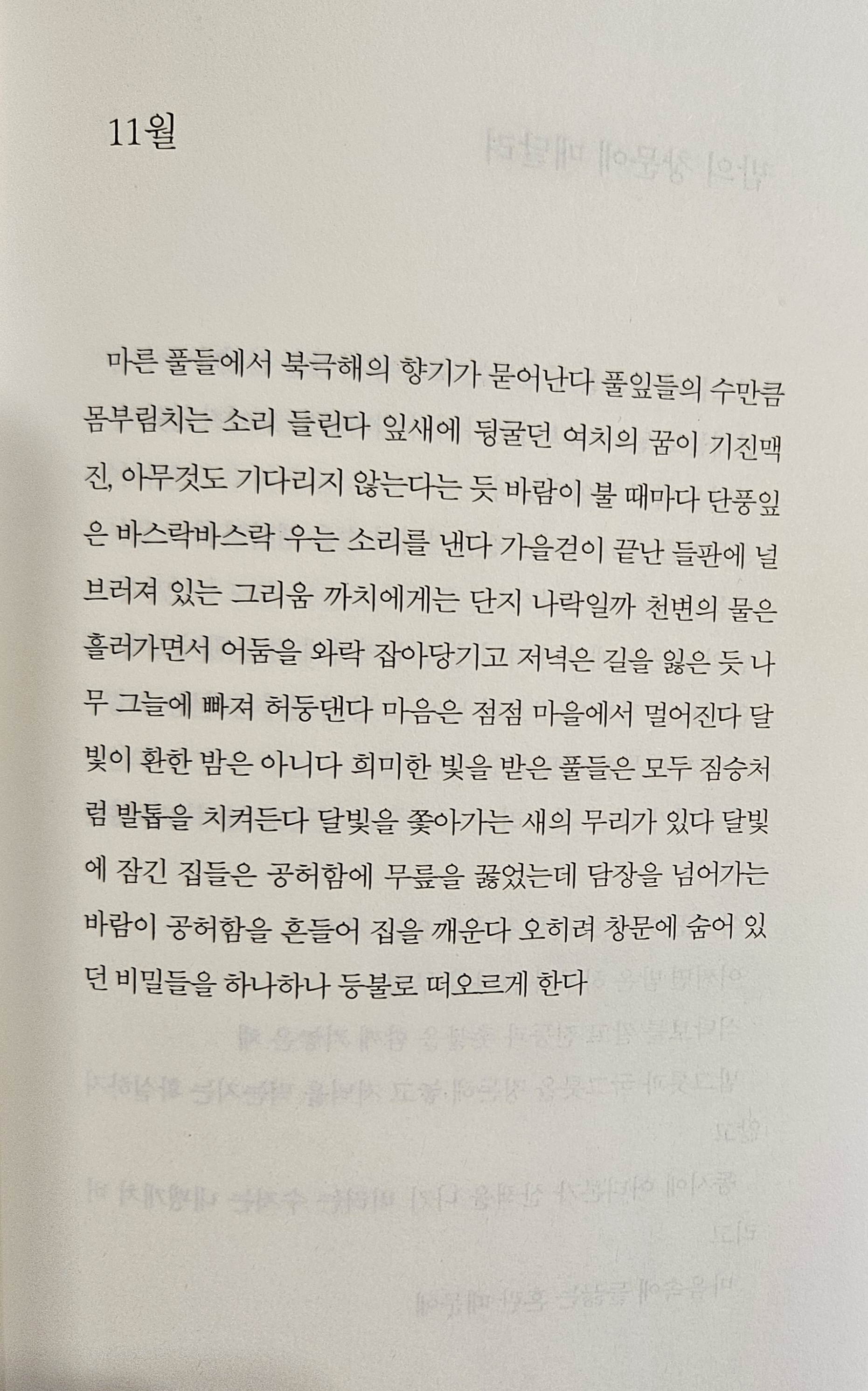왼편에 대한 탐구-안혜경 시집
왜가리
안혜경
방문을 열었을 때 책상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왜가리였다 왜가리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벽만 보고 있었다 분명 저녁에 수변 길을 산책할 때 마주친 왜가리였다 나는 전혀 아는척하지 않았고 노란 눈동자에 어른거리던 물그림자도 눈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왜가리는 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이제는 나를 빤히 노려보며 영리하게 보이는 눈을 반짝이고 있다 물풀의 가벼운 흔들림이 손등을 간지럽혔다 일없이 창문 너머 저녁 하늘만 바라보았다 나는 왜가리가 나갈 수 있도록 문간에서 비켜났다 날개를 펼쳐 들었을 때에는 온 방 안이 날개로 뒤덮인 양 나는 몸을 움츠렸다 왜가리는 책상을 부리로 톡톡 두 번 두드린 후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날개를 접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히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땅거미 내려앉는 하늘에 바람 소리였나 뭔가 등을 두들겼다 나는 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제의 산책자
어제의 발걸음은 간명하여 경쾌하였다 순전히 아카시아 향내 탓이었다 흰 꽃들이 저녁 내내 비명을 질러댄 탓도 있었다 얼굴을 마주 보며 한없이 끌어당기는 흰 비밀이 있었다 창문을 넘어온 손가락은 길고 힘이 있었다 손바닥에 얼굴을 묻으니 온통 검은 얼룩뿐이었다 사용할 수 없는 왼손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어제의 발걸음을 정리하고 목록을 내밀었다 맨발로 걷고 있었으니 약간의 흉터는 무시하기로 했다
참고로 어제의 미소는 나의 것이 아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왼편에 대한 탐구
왼편에 있던 슬픔을 오른편으로 옮겨놓았다
모든 게 더 슬퍼 보였다
얼굴빛은 밝은 회색인데 눈빛은 파르스름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입김을 뿜어낸다
오른편 책장 뒤에 장난감 병정들은 일렬로 걸어가지 않고
총을 어깨에 멘 채 일제히 슬픈 표정이다
책장 뒤의 공터에서 병정들은 제자리걸음을 한다
네 번째 선반에서 슬픔은 몸을 돌려 언덕길을 올라간다
슬픔의 뒷모습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속삭임은 치즈케이크 모양으로 선반에 앉아 있고
그 아래 선반에는 어둠의 가방이 있다
물거품으로 변하는 날들이 칭얼대긴 하지만
현관문에서 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 소리는 슬픔과 어둠의 전쟁이었을까
가방을 흘깃 열어보니 비둘기의 날갯죽지
가방 옆 주머니를 열어보니 왜가리 한 마리
다시 오른편의 슬픔을 왼편으로 옮겨놓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녁의 발자국
저녁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지도에는 없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곤 하지 구름은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아 우뚝우뚝 암초들이 수평선에서 솟아나곤 하지 그러면 거짓말처럼 거꾸로 바다에서 별들이 솟아나곤 하지 바다는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고립된 곳이야 마을도 마찬가지야 집도 역시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고립된 곳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모두 골칫덩이야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명확한 국경을 금 그어놓고 만족하며 살지 그렇게 저녁의 난간에 걸터앉아 빗방울을 맞으면 이비자 섬에 툭 떨어지곤 해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찬란하게 빛나기도 해 서글서글한 눈매의 선장이 파이프를 물고 배 위에서 나를 지켜봐 나는 온힘을 다해 파도와 싸우지 기나긴 회랑의 복도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마치 그곳이 왕국의 중심부인 양 앞뒤로 몸을 흔들어 즐거운 웃음소리가 날아올라 기나긴 일에 만족하며 내일의 영토를 향해 발을 뻗어 그런데 섬이 어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일은 다시
하루하루 고통을 모았더니 커다란 실뭉치가 되었다
한 올 한 올 엮었더니 깃발이 되었다
밤하늘에 매달았더니 밤새도록 펄럭거렸다
새벽이 되자 별들과 함께 서쪽으로 날아갔다
내가 오히려 아쉬워 발을 동동 굴렀다
다시 주섬주섬 잎들을 긁어모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람도 없는데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까마귀보다 더 캄캄해져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의 없는 산책이었고 낭만 없는 마일이었다 머릿속까지 캄캄한 밤이었다 밤이 숨겨 놓은 문장을 읽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서 살아있는 문장이었다 이기의 문장이었다 긴 밤을 건너가야 하는데 멀리서 개가 짖었다 개의 문장을 따라 산책은 이어졌다 성의 없는 산책이었고 낭만 없는 산책이었다 이기의 산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끔찍한 산책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안혜경